목차
Ⅰ 서 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종교와 문화
Ⅲ Tillich의 상징론
1.일반적 상징의 의미
2.
3.성령과 상징
1)성령의 현존
2)성령과 삶의 모호성
3)성령과 새로운 존재
4.하나님 나라와 상징
1)역사와 하나님 나라
Ⅴ 결 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종교와 문화
Ⅲ Tillich의 상징론
1.일반적 상징의 의미
2.
3.성령과 상징
1)성령의 현존
2)성령과 삶의 모호성
3)성령과 새로운 존재
4.하나님 나라와 상징
1)역사와 하나님 나라
Ⅴ 결 론
본문내용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개인적 요소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구원에 대한 집약적인 상징이 된다.
카이로스는 희랍어에서 유래한 두가지 시간 용어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Kronos)이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계속적인 흐름을 표시하는 반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어떤 중요한 계기를 지적한다.
)폴틸리히, 카이로스 ,기독교 사상 1959년 11월호,p.74.
카이로스는 계측 가능한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달리 질적 시간, 알맞은 때,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 알맞는 순간, 신이 선택한 순간, 시간과 역사가 성취되는 때 신의 timming을 말한다.
)폴틸리히,「궁극적 관심」,이계준역,(서울:대한 기독교서회,1970),p.158.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십적인 나타남의 돌입을 수용 할 수 있는 순간, 곧 시간의 성숙(Fulfillment of time)이 곧 카이로스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 현현을 신약에서는 시간의 성숙(Fulfillment of time) 곧 카이로스라고 부른다.
)폴틸리히,「조직신학Ⅲ하」,p.141.
틸리히에 의하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위대한 카이로스의 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셔서 모호한 성격에 의미를 찾게 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리고 카이로스인 것이다.
틸리히에 의하면 카이로스란 세속화 되고 공허한 자율 문화라는 토양에서 나타난 새 신율의 도래를 뜻한다. 카이로스는 역사상 영원한 것이 현실적인 것을 심판하고 변혁시키는 모든 전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 상징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존한다. 계시적 경험상태, 곧 언제나 역사 속으로 햇살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신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의 실재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실재이며 시간의 끝이요 만물의 성취에서 이루어진다.
)김경재,op.cit.,p.306.
틸리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란 실존의 모호성이 극복된 새로운삶이다.
)Ibid.,p.307.
영원한 생명이던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력에 참여 하면서 합일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본질화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틸리히는 해석한다.
)Ibid.
역사란 질적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폴틸리히,「조직신학Ⅲ하」,p.194.
역사란 언제나 현재라는 관점에서 혹은 영원으로 향해 영원한 고양을 뜻할 때 궁극적 심판의 상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배해 패배하며 긍정적 존재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원한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현시적 실존안에서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존재의 본질성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존재는 옛것이 깨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한다.
)폴틸리히,「새로운 존재」강원용역,(서울:대한 기독교서회,1970),p.37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 복음이 이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심판 아래서 부정적인 것이 제외되면서 모든 삶의 모호성이 극복되어진다. 즉, 하나님 나라의 내적 역사적 승리 안에서 전적으로 극복되어진다. 상징적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핀 후 틸리히의 상징 이해와 그 이해속에서 신학적인 주제들인 상징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고찰하여 보았다.
틸리히는 상징을 기호(sign)와 구분하여 상징의 의미를 정리하며 이 상징을 통한 종교 언어의 깊은 차원을 열어보이고자 하였다. 틸리히에 의하면 일반 상징과 구별하여 종교 상징만의 특성을 중시한다. 종교적인 상징은 그것이 개념적인 영역 저편의 무제약적으로 있는 것의 표상으로서 궁극적 관심을 표현 할 수 있다. 종교적 상징은 종교가 그 자체를 직접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틸리히의 종교적 상징은 실재와 초월성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자기 초월의 실재이다. 그러나 상징이 스스로 자기가 지시하는 실재가 되고자 할 대 우상화가 일어나게 된다. 종교적 상징의 표현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성을 유지하는 데서만 상징의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틸리히는 신학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 첫째로 인간의 유한성과 일반성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그 해답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자체,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 궁극적인 실재로 보았다. 둘째는 인간의 실존적 자기 소외와 이 상황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해답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소외가 극복된 통일의 상태이고 대답이며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과 실존적 소외를 극복한 사람의 십자가이며 부활은 죽음과 실존적 소외에 복족시킨 사람의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실존적 소외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나타낸다. 세째는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분석롸 생명이라는 모호성속에 포함된 물음을 분석하면서 성령을 그 해답으로 보았다. 성령의 현존을 분열된 실존과 본질의 갈등을 통일시키고 모호하지 않은 생명의 통일로 고양시키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생명으로 본 것이다. 넷째는 역사의 모호성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해답으로 보았다.
하나님 나라는 카이로스의 나라이며 역사의 목표로서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었다.
틸리히의 상징해석에 따른 상관 방법의 신학은 전통적인 메시지를 보존하면서 상황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으로 말씀하게 하는 해석학적 공헌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상징론은 내세와 초월이 함께 수반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는 상징의 의미와 힘을 상실한 상징을 재해석하며 종교적 상징을 경험의 의미깊은 표현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상징에 부착된 미신적이고 환상적인 의미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틸리히의 상징론은 종교 언어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카이로스는 희랍어에서 유래한 두가지 시간 용어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Kronos)이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계속적인 흐름을 표시하는 반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어떤 중요한 계기를 지적한다.
)폴틸리히, 카이로스 ,기독교 사상 1959년 11월호,p.74.
카이로스는 계측 가능한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달리 질적 시간, 알맞은 때,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 알맞는 순간, 신이 선택한 순간, 시간과 역사가 성취되는 때 신의 timming을 말한다.
)폴틸리히,「궁극적 관심」,이계준역,(서울:대한 기독교서회,1970),p.158.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십적인 나타남의 돌입을 수용 할 수 있는 순간, 곧 시간의 성숙(Fulfillment of time)이 곧 카이로스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 현현을 신약에서는 시간의 성숙(Fulfillment of time) 곧 카이로스라고 부른다.
)폴틸리히,「조직신학Ⅲ하」,p.141.
틸리히에 의하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위대한 카이로스의 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셔서 모호한 성격에 의미를 찾게 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리고 카이로스인 것이다.
틸리히에 의하면 카이로스란 세속화 되고 공허한 자율 문화라는 토양에서 나타난 새 신율의 도래를 뜻한다. 카이로스는 역사상 영원한 것이 현실적인 것을 심판하고 변혁시키는 모든 전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 상징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존한다. 계시적 경험상태, 곧 언제나 역사 속으로 햇살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신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의 실재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실재이며 시간의 끝이요 만물의 성취에서 이루어진다.
)김경재,op.cit.,p.306.
틸리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란 실존의 모호성이 극복된 새로운삶이다.
)Ibid.,p.307.
영원한 생명이던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력에 참여 하면서 합일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본질화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틸리히는 해석한다.
)Ibid.
역사란 질적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폴틸리히,「조직신학Ⅲ하」,p.194.
역사란 언제나 현재라는 관점에서 혹은 영원으로 향해 영원한 고양을 뜻할 때 궁극적 심판의 상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배해 패배하며 긍정적 존재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원한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현시적 실존안에서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존재의 본질성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존재는 옛것이 깨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한다.
)폴틸리히,「새로운 존재」강원용역,(서울:대한 기독교서회,1970),p.37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 복음이 이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심판 아래서 부정적인 것이 제외되면서 모든 삶의 모호성이 극복되어진다. 즉, 하나님 나라의 내적 역사적 승리 안에서 전적으로 극복되어진다. 상징적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핀 후 틸리히의 상징 이해와 그 이해속에서 신학적인 주제들인 상징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고찰하여 보았다.
틸리히는 상징을 기호(sign)와 구분하여 상징의 의미를 정리하며 이 상징을 통한 종교 언어의 깊은 차원을 열어보이고자 하였다. 틸리히에 의하면 일반 상징과 구별하여 종교 상징만의 특성을 중시한다. 종교적인 상징은 그것이 개념적인 영역 저편의 무제약적으로 있는 것의 표상으로서 궁극적 관심을 표현 할 수 있다. 종교적 상징은 종교가 그 자체를 직접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틸리히의 종교적 상징은 실재와 초월성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자기 초월의 실재이다. 그러나 상징이 스스로 자기가 지시하는 실재가 되고자 할 대 우상화가 일어나게 된다. 종교적 상징의 표현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성을 유지하는 데서만 상징의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틸리히는 신학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 첫째로 인간의 유한성과 일반성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그 해답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자체,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 궁극적인 실재로 보았다. 둘째는 인간의 실존적 자기 소외와 이 상황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해답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소외가 극복된 통일의 상태이고 대답이며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과 실존적 소외를 극복한 사람의 십자가이며 부활은 죽음과 실존적 소외에 복족시킨 사람의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실존적 소외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나타낸다. 세째는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분석롸 생명이라는 모호성속에 포함된 물음을 분석하면서 성령을 그 해답으로 보았다. 성령의 현존을 분열된 실존과 본질의 갈등을 통일시키고 모호하지 않은 생명의 통일로 고양시키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생명으로 본 것이다. 넷째는 역사의 모호성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해답으로 보았다.
하나님 나라는 카이로스의 나라이며 역사의 목표로서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었다.
틸리히의 상징해석에 따른 상관 방법의 신학은 전통적인 메시지를 보존하면서 상황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으로 말씀하게 하는 해석학적 공헌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상징론은 내세와 초월이 함께 수반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는 상징의 의미와 힘을 상실한 상징을 재해석하며 종교적 상징을 경험의 의미깊은 표현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상징에 부착된 미신적이고 환상적인 의미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틸리히의 상징론은 종교 언어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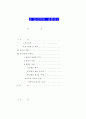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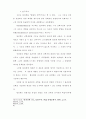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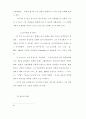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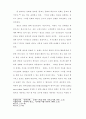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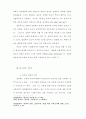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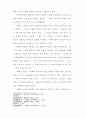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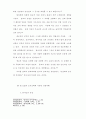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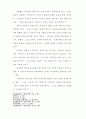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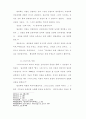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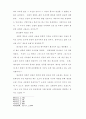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