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궁궐조경
2.별서조경
3.주택조경
4.사찰조경
2.별서조경
3.주택조경
4.사찰조경
본문내용
단의 축대를 쌓아 조성하였는데, 밑의 한 단은 원로이고 위의 두 단은 화계이다.
\'소쇄원도\'를 보면 매대라고 쓰여 있고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화계의 가장 윗 단인 담 밑에는 큰 측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화계 밑 단에는
\'난(蘭)\'이라 쓰고 한 무더기의 난초가 그려져 있으며, 북쪽에는 \'오암(鼇巖)\'이라 쓴 큰
바위와 \'괴석(塊石)\' 이라 쓴 바위가 배치되어 있다. 괴석 위에는 큰 느티나무가 그려져 있다.
계류
계류는 북쪽 장원봉 골짜기에서부터 오곡문 옆담 아래에 뚫려 있는 수구(水口)를 통해 소쇄원 내원 계곡으로 흘러 들어온다. 담장 밑을 통하여 흘러든 물이 흐르는 곳은 경사가 급한 거대한 암반으로 이 암반에는 푹 파인 조담이 있는데 조담에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를 이루며 뛰어난 경관을 조성한다. 이 물은 홈통을 통하여 상하 두 개의 작은 방지로 흘러 들게 하였다.
수목
소쇄원에 주로 식재된 식물로는 대나무와, 치자나무등의 살올성 수목과 팽나무, 느티나무,
벽오동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매화, 단풍나무, 버드나무,
감나무, 철쭉, 등의 다양한 활엽수 그리고 창포, 난, 순채, 국화, 파초, 연, 상사화 등의
초본류가 있다.
-사찰 조경
-대둔사(大芚寺)
소재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규모 : 2,643,990여 평
조영자 : 아동화상
조성연대 : 백제 무녕왕 8년 (508년) 신라 진흥왕 5년(544년)
문화재 지정 : 사적 및 명승 제 9 호
대둔사의 창건에 대하여는 백제 무녕왕 8년 창건설과 신라 진흥왕 5년 창건설 등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대둔사는 주산인 두륜산에는 가련봉과 도솔송, 향로봉등 여러 봉우리가 장관을 이루고,
기화이초가 항상 아름다우며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다.
두륜봉 주위의 아홉 봉우리에서 발원한 계류는 대웅전 앞과 표충사 앞으로 흘러 피안교
위에서 합류하며, \'너부내\'라는 이름을 얻은 넓은 자리에 대둔사가 입지하고 있다.
대둔사의 공간구성은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듬당천 건너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북원과 천불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 서산대사의 사당인 표충사공간, 초의 선사가 입주상량한
대광명전공간이 그것이다.
대둔사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사찰이다.
개울에 무지개다리를 걸어 건너게 하는 것, 누각을 마련하여 통과의례를 거쳐 중심으로 선당과 승당을 좌우로 배열하는 수법, 가운데 마당을 시각적으로 깊게 하여 주불전을 돋보이도록 하는 기법등이 바로 조선시대 사찰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서원 조경
-도산서원(陶山書院)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규모 : 17동
조영자 : 이황 (1501~1570)
조성연대 : 건립/선조 7년 (1574), 사액/선조 8년(1575)
문화재 지정 : 사적 제 170호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근본을 완성한 대학자 퇴계이황이 그의 나이 50세 때인 명종
12년(1557년)에 낙향하여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퇴계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것은 순전히 산수가 수려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도산서원은 영지산을 조산으로 하고 도산을 주산으로 하여 왼쪽은 청량산에서 흘러나온
동취병이 오른쪽에는 영지산에서 흘러나온 서취병이 감싸고, 남으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조그마한 골짜기에 입지하고 있다.
퇴계는 그 심경을 \"도산 아래 자리잡고 쉴 곳을 얻은 것은 만년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고 있다.
주변환경
도산서원은 뒤쪽으로 아담한 산등성이가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굽이돌아 흐르며
저 멀리에는 푸른 평원이 펼쳐지는 절경에 자리를 정하고 있다.
조성신의 도산별곡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 도산서원의 주변 경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광영대올라 안쟈 원근산천을 일안의 구버 보니 동취병 서취병은 봉만도 긔이하고
탁염담 반타석은 수석도 명려 하다.
금사옥력은 면면이 버렷스니 용문팔절은 보든 하였시나 무이구곡인들 예서야 더할손가\"
도산서당
퇴계가 낙향하여 도산 아래 터를 정하고 홀로 조용히 책을 보고 손님을 맞으며, 후학을 양성하면서 거주하던 곳으로 3칸으로 된 작은 집이다.
도산서당의 풍류공간
도산잡영에서 퇴계는 도산의 경관에서 얻어지는 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조식 한 뒤 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며 책을 덮고 지팡이
를 짚고 뜰 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를 찾기도 하며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지며 꽃을 따기도 한다. 혹은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치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시사단
도산서원에서 바주 보이는 곳에 위치한 시사단은 정조가 퇴계의 학문을 기려 정조
16년(1792) 3월 낙동강변 도산서원에서 별과를 보게 하였는바, 이 과거본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채제공이 지은 글을 비에 새겨 건립한 장소이다.
천광운영대와 천연대
도산서원 전면 골짜기 양변에 암반으로 된 높은 곳을 대로 축조하여, 오른쪽은 천광운영대
라 하고, 왼쪽은 천연대라 명명하였다. 천연대 아래의 물이 깊은 곳을 탁영담이라 아였으며
그 속에 반타석이 있다. 이처럼 퇴계는 자연경물에 여러 가지 의미의 이름을 붙여 자연을
자기소유화 하였다.
수목
도산서원에는 많은 수목이 심어져 있다. 그 중에서 \'도산잡영\'에 기록된 것은 연,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약초 등이고 \'도산별곡\'에 나온은 것은 벽도, 홍화, 단풍등이다.
경역 내의 과정적 공간에는 화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퇴계가 완상하며 즐겼던 수백년된 매화나무와 목단이 식재되어 있다.
매화나무는 인재, 절개, 고고함을 의미했던 것으로 선비정신의 함양을 위해 서원에 많이
식재하였던 것이다.
그 외 경역 밖 서원 입구에는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왕버드나무, 회화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등의 노거수가 자라고 있다.
\'소쇄원도\'를 보면 매대라고 쓰여 있고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화계의 가장 윗 단인 담 밑에는 큰 측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화계 밑 단에는
\'난(蘭)\'이라 쓰고 한 무더기의 난초가 그려져 있으며, 북쪽에는 \'오암(鼇巖)\'이라 쓴 큰
바위와 \'괴석(塊石)\' 이라 쓴 바위가 배치되어 있다. 괴석 위에는 큰 느티나무가 그려져 있다.
계류
계류는 북쪽 장원봉 골짜기에서부터 오곡문 옆담 아래에 뚫려 있는 수구(水口)를 통해 소쇄원 내원 계곡으로 흘러 들어온다. 담장 밑을 통하여 흘러든 물이 흐르는 곳은 경사가 급한 거대한 암반으로 이 암반에는 푹 파인 조담이 있는데 조담에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를 이루며 뛰어난 경관을 조성한다. 이 물은 홈통을 통하여 상하 두 개의 작은 방지로 흘러 들게 하였다.
수목
소쇄원에 주로 식재된 식물로는 대나무와, 치자나무등의 살올성 수목과 팽나무, 느티나무,
벽오동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매화, 단풍나무, 버드나무,
감나무, 철쭉, 등의 다양한 활엽수 그리고 창포, 난, 순채, 국화, 파초, 연, 상사화 등의
초본류가 있다.
-사찰 조경
-대둔사(大芚寺)
소재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규모 : 2,643,990여 평
조영자 : 아동화상
조성연대 : 백제 무녕왕 8년 (508년) 신라 진흥왕 5년(544년)
문화재 지정 : 사적 및 명승 제 9 호
대둔사의 창건에 대하여는 백제 무녕왕 8년 창건설과 신라 진흥왕 5년 창건설 등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대둔사는 주산인 두륜산에는 가련봉과 도솔송, 향로봉등 여러 봉우리가 장관을 이루고,
기화이초가 항상 아름다우며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다.
두륜봉 주위의 아홉 봉우리에서 발원한 계류는 대웅전 앞과 표충사 앞으로 흘러 피안교
위에서 합류하며, \'너부내\'라는 이름을 얻은 넓은 자리에 대둔사가 입지하고 있다.
대둔사의 공간구성은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듬당천 건너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북원과 천불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 서산대사의 사당인 표충사공간, 초의 선사가 입주상량한
대광명전공간이 그것이다.
대둔사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사찰이다.
개울에 무지개다리를 걸어 건너게 하는 것, 누각을 마련하여 통과의례를 거쳐 중심으로 선당과 승당을 좌우로 배열하는 수법, 가운데 마당을 시각적으로 깊게 하여 주불전을 돋보이도록 하는 기법등이 바로 조선시대 사찰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서원 조경
-도산서원(陶山書院)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규모 : 17동
조영자 : 이황 (1501~1570)
조성연대 : 건립/선조 7년 (1574), 사액/선조 8년(1575)
문화재 지정 : 사적 제 170호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근본을 완성한 대학자 퇴계이황이 그의 나이 50세 때인 명종
12년(1557년)에 낙향하여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퇴계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것은 순전히 산수가 수려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도산서원은 영지산을 조산으로 하고 도산을 주산으로 하여 왼쪽은 청량산에서 흘러나온
동취병이 오른쪽에는 영지산에서 흘러나온 서취병이 감싸고, 남으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조그마한 골짜기에 입지하고 있다.
퇴계는 그 심경을 \"도산 아래 자리잡고 쉴 곳을 얻은 것은 만년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고 있다.
주변환경
도산서원은 뒤쪽으로 아담한 산등성이가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굽이돌아 흐르며
저 멀리에는 푸른 평원이 펼쳐지는 절경에 자리를 정하고 있다.
조성신의 도산별곡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 도산서원의 주변 경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광영대올라 안쟈 원근산천을 일안의 구버 보니 동취병 서취병은 봉만도 긔이하고
탁염담 반타석은 수석도 명려 하다.
금사옥력은 면면이 버렷스니 용문팔절은 보든 하였시나 무이구곡인들 예서야 더할손가\"
도산서당
퇴계가 낙향하여 도산 아래 터를 정하고 홀로 조용히 책을 보고 손님을 맞으며, 후학을 양성하면서 거주하던 곳으로 3칸으로 된 작은 집이다.
도산서당의 풍류공간
도산잡영에서 퇴계는 도산의 경관에서 얻어지는 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조식 한 뒤 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며 책을 덮고 지팡이
를 짚고 뜰 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를 찾기도 하며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지며 꽃을 따기도 한다. 혹은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치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시사단
도산서원에서 바주 보이는 곳에 위치한 시사단은 정조가 퇴계의 학문을 기려 정조
16년(1792) 3월 낙동강변 도산서원에서 별과를 보게 하였는바, 이 과거본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채제공이 지은 글을 비에 새겨 건립한 장소이다.
천광운영대와 천연대
도산서원 전면 골짜기 양변에 암반으로 된 높은 곳을 대로 축조하여, 오른쪽은 천광운영대
라 하고, 왼쪽은 천연대라 명명하였다. 천연대 아래의 물이 깊은 곳을 탁영담이라 아였으며
그 속에 반타석이 있다. 이처럼 퇴계는 자연경물에 여러 가지 의미의 이름을 붙여 자연을
자기소유화 하였다.
수목
도산서원에는 많은 수목이 심어져 있다. 그 중에서 \'도산잡영\'에 기록된 것은 연,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약초 등이고 \'도산별곡\'에 나온은 것은 벽도, 홍화, 단풍등이다.
경역 내의 과정적 공간에는 화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퇴계가 완상하며 즐겼던 수백년된 매화나무와 목단이 식재되어 있다.
매화나무는 인재, 절개, 고고함을 의미했던 것으로 선비정신의 함양을 위해 서원에 많이
식재하였던 것이다.
그 외 경역 밖 서원 입구에는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왕버드나무, 회화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등의 노거수가 자라고 있다.
추천자료
 창덕궁 소개 및 사진수록
창덕궁 소개 및 사진수록 북촌한옥마을을 다녀와서
북촌한옥마을을 다녀와서 [사회과학] 창덕궁 답사 보고서
[사회과학] 창덕궁 답사 보고서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 대한민국 세계 문화유산
대한민국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 유산 창덕궁
세계 문화 유산 창덕궁 가회동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가회동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한국건축사 조선시대 건축역사
한국건축사 조선시대 건축역사 조선시대 정원 소쇄원(瀟灑園)
조선시대 정원 소쇄원(瀟灑園) 4)국어-5. 알아보고 떠나요 -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읽기
4)국어-5. 알아보고 떠나요 -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읽기 신문기사 스크랩 발표 - 스타마케팅의 사례와 문제점, 느낀점.ppt
신문기사 스크랩 발표 - 스타마케팅의 사례와 문제점, 느낀점.ppt 세계건축문화유산 과제 2개(울산대학교)
세계건축문화유산 과제 2개(울산대학교) 창덕궁의 역사와 근대 창덕궁의 변화를 정전인 인정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창덕궁의 역사와 근대 창덕궁의 변화를 정전인 인정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독후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 서울편 1 : 만천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유홍준 저자 (서평,...
[독후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 서울편 1 : 만천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유홍준 저자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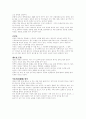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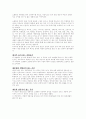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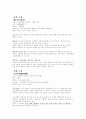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