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저작동기)
Ⅱ. 본론(주요내용)
1. 내재과거아란 누구인가?
2. 왜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는가?
3. 어린 시절은 성인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4. 어린 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5. 어린 시절이 몸에 배면
6. 당신에게 내분이 일어나 있는가?
...
Ⅲ. 결론(견해)
Ⅱ. 본론(주요내용)
1. 내재과거아란 누구인가?
2. 왜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는가?
3. 어린 시절은 성인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4. 어린 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5. 어린 시절이 몸에 배면
6. 당신에게 내분이 일어나 있는가?
...
Ⅲ. 결론(견해)
본문내용
고 특히 자신감의 상실과 열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너는 잘 못 생겼다", 혹은 너는 나쁜 애다", "너는 너무 멍청하다", "네 형을 봐라", "옆집의 아이를 봐라" 등의 비판적인 말이나, 비교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거절당하고 있다는 아픔과 더 큰 아픔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하겠다는 무의식 속에서 삶의 기초가 생성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며, 따라서 이제부터 자기혼자 자신을 위로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6. 버릇과 예절
여러 번 거듭하여 저절로 굳고 몸에 밴 행동을 버릇이라고 한다. 아이가 처음으로 껌을 씹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씹었다. 이런 행동이 두 번 세 번 거듭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대로 버릇이 되어 버린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 번 버릇이 되면 고치기 힘들다.
아이가 혼자 산다면 이빨을 드러내고 껌을 씹거나, 딱딱 소리를 내면 껌을 씹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도 많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한사람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는 사회는 질서가 있다. 한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의 규범이 바로 예절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버릇을 지니게 된다. 기초가 되는 생활습관을 기본생활습관이라고 한다.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른 습관을 말한다. 이 습관이 바르게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나쁜 버릇이 되어 집밖에 나갈 때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규범이란 거울에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바른 버릇, 바른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염소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가느다란 다리를 딛고 일어선다. 사람은 돌 가까이 가야 일어선다. 동물의 새끼는 어미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짧다. 그러나 사람은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장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힘이 든다. 이 긴 성장기간에 아이는 여러 가지 버릇과 예절을 배운다.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는 동물사회 같이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사회, 복잡한 제도, 복잡한 규범을 적응하려면 배우는 것이 많다. 설익은 버릇이나 예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길들여진 버릇과 예절로 살아가야 한다. 성장기간이 길다는 것은 교육기간이 길다는 것이 된다.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버릇과 예절은 반복훈련으로 길들여진다. 바른 버릇이나 바른 예절은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동안 몸에 익혀지고 실천되어 진다.
학교에서 욕을 잘 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욕을 잘한다. 욕 잘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이도 바깥에 나가 욕을 잘한다. 그러나 좋은 가정에서 고운 말 쓰기에 길들여진 아이는 <이자식>, <이새끼>,<개새끼>등의 욕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한다. 고운 말과 거친 말은 버릇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언어 습관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그때그때 지적하여 버릇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는 반드시 자극적이고 철저한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니가 있었다. 어린 시절 좋은 부모에게 길들여져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
부모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모든 동물은 어미의 행동을 보며 학습한다. 모든 동물은 어미의 행동을 보며 학습한다. 호랑이나 사자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먹이 잡는 방법을 배운다. 새들도 어미 새를 보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것과 같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 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보세요>를 흉내낸다. 부모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아이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닮는다. 이는 부모의 바른 버릇을 보고 바른 버릇을 배워간다. 바른 버릇과 바른 예절은 부모부터 지녀야 한다.<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 는 말은 진리인 것이다.
기본 습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교육이다.
7. 자연주의와 실용주의 교육에 힘쓴 독일의 경우
아껴쓰는 교육 - 그들의 생활의 간소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들은 물 한 방울도 아낀다. 아이들도 검소함이 몸에 배어, 학교나 동네의 벼룩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고, 세차, 집 안 청소 등의 일을 돕고 용돈을 받는다.
독서의 생활화 - 독일의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자는 것이 습관이다.
독일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으로 아이들을 독서를 즐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가정독서 지도자가 되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는 것이다.
자연 속의 유치원 - 독일은 유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치원을 설립할 때 산림이 있거나 녹음이 형성된 곳에 설립한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상상력, 창조성, 자연의 소중함, 심리적 안정감 등 어린 시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한 생활경험 - 독일 유치원의 놀이시간 모습은 매우 자유롭다. 유치원에 온 아이들은 정해진 반에 들어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놀이장소에서 놀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체험은 장래의 직업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의 경험들을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
식생활과 환경교육 - 독일 유치원에서는 식사예절과 관련된 수업을 중요시한다. 보통 1주일에 한번씩 요리 시간이 있는데 요리시간을 통해 식사예절과 편식습관이 있는 아이에게 편식습관을 없애주는 좋은 기회이다. 스스로 만든 음식은 맛있게 먹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어울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이 엄격한 환경 정책을 잘 준수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덕분일 것이다.
예를 들면,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너는 잘 못 생겼다", 혹은 너는 나쁜 애다", "너는 너무 멍청하다", "네 형을 봐라", "옆집의 아이를 봐라" 등의 비판적인 말이나, 비교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거절당하고 있다는 아픔과 더 큰 아픔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하겠다는 무의식 속에서 삶의 기초가 생성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며, 따라서 이제부터 자기혼자 자신을 위로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6. 버릇과 예절
여러 번 거듭하여 저절로 굳고 몸에 밴 행동을 버릇이라고 한다. 아이가 처음으로 껌을 씹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씹었다. 이런 행동이 두 번 세 번 거듭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대로 버릇이 되어 버린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 번 버릇이 되면 고치기 힘들다.
아이가 혼자 산다면 이빨을 드러내고 껌을 씹거나, 딱딱 소리를 내면 껌을 씹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도 많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한사람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는 사회는 질서가 있다. 한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의 규범이 바로 예절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버릇을 지니게 된다. 기초가 되는 생활습관을 기본생활습관이라고 한다.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른 습관을 말한다. 이 습관이 바르게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나쁜 버릇이 되어 집밖에 나갈 때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규범이란 거울에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바른 버릇, 바른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염소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가느다란 다리를 딛고 일어선다. 사람은 돌 가까이 가야 일어선다. 동물의 새끼는 어미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짧다. 그러나 사람은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장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힘이 든다. 이 긴 성장기간에 아이는 여러 가지 버릇과 예절을 배운다.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는 동물사회 같이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사회, 복잡한 제도, 복잡한 규범을 적응하려면 배우는 것이 많다. 설익은 버릇이나 예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길들여진 버릇과 예절로 살아가야 한다. 성장기간이 길다는 것은 교육기간이 길다는 것이 된다.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버릇과 예절은 반복훈련으로 길들여진다. 바른 버릇이나 바른 예절은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동안 몸에 익혀지고 실천되어 진다.
학교에서 욕을 잘 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욕을 잘한다. 욕 잘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이도 바깥에 나가 욕을 잘한다. 그러나 좋은 가정에서 고운 말 쓰기에 길들여진 아이는 <이자식>, <이새끼>,<개새끼>등의 욕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한다. 고운 말과 거친 말은 버릇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언어 습관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그때그때 지적하여 버릇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는 반드시 자극적이고 철저한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니가 있었다. 어린 시절 좋은 부모에게 길들여져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
부모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모든 동물은 어미의 행동을 보며 학습한다. 모든 동물은 어미의 행동을 보며 학습한다. 호랑이나 사자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먹이 잡는 방법을 배운다. 새들도 어미 새를 보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것과 같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 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보세요>를 흉내낸다. 부모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아이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닮는다. 이는 부모의 바른 버릇을 보고 바른 버릇을 배워간다. 바른 버릇과 바른 예절은 부모부터 지녀야 한다.<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 는 말은 진리인 것이다.
기본 습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교육이다.
7. 자연주의와 실용주의 교육에 힘쓴 독일의 경우
아껴쓰는 교육 - 그들의 생활의 간소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들은 물 한 방울도 아낀다. 아이들도 검소함이 몸에 배어, 학교나 동네의 벼룩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고, 세차, 집 안 청소 등의 일을 돕고 용돈을 받는다.
독서의 생활화 - 독일의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자는 것이 습관이다.
독일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으로 아이들을 독서를 즐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가정독서 지도자가 되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는 것이다.
자연 속의 유치원 - 독일은 유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치원을 설립할 때 산림이 있거나 녹음이 형성된 곳에 설립한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상상력, 창조성, 자연의 소중함, 심리적 안정감 등 어린 시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한 생활경험 - 독일 유치원의 놀이시간 모습은 매우 자유롭다. 유치원에 온 아이들은 정해진 반에 들어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놀이장소에서 놀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체험은 장래의 직업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의 경험들을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
식생활과 환경교육 - 독일 유치원에서는 식사예절과 관련된 수업을 중요시한다. 보통 1주일에 한번씩 요리 시간이 있는데 요리시간을 통해 식사예절과 편식습관이 있는 아이에게 편식습관을 없애주는 좋은 기회이다. 스스로 만든 음식은 맛있게 먹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어울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이 엄격한 환경 정책을 잘 준수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덕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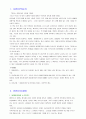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