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Ⅳ. 땅의 과학2-땅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풍수
1. 풍수의 구조와 원리
(1) 등장시기
(2) 이론적 체계의 완성: 청오자의 {청오경}과 곽박의 {장서}
(3) 풍수의 논리체계
(4) 풍수의 종류
2. 자생풍수
(1) 대표적인 자생풍수
(2) 자생풍수의 내용-대지모 사상과 연관
(3) 자생풍수의 한계
(4) 자생풍수와 중국 풍수의 결합
3. 도선풍수=비보풍수 : 신라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것
(1) 생애와 업적
(2) 도선의 풍수원리 : 비보(사탑)설
4. 풍수의 역사적 변천
(1) 삼국시대
(2)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오늘날의 풍수
1. 풍수의 구조와 원리
(1) 등장시기
(2) 이론적 체계의 완성: 청오자의 {청오경}과 곽박의 {장서}
(3) 풍수의 논리체계
(4) 풍수의 종류
2. 자생풍수
(1) 대표적인 자생풍수
(2) 자생풍수의 내용-대지모 사상과 연관
(3) 자생풍수의 한계
(4) 자생풍수와 중국 풍수의 결합
3. 도선풍수=비보풍수 : 신라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것
(1) 생애와 업적
(2) 도선의 풍수원리 : 비보(사탑)설
4. 풍수의 역사적 변천
(1) 삼국시대
(2)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오늘날의 풍수
본문내용
부정하고, 호족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을 꿈꾸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세력기반인 지방의 우월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받아들인 것은 풍수였다.
뿐만 아니라 각지 호족들이 웅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족들은 이웃하는 다른 호족을 흡수하여 팽창해 가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호족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들 호족에게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풍수를 도입하게 한 것이다.
현재 왕건과 연결된 풍수만이 남아서 전해오고 다른 경우는 모두 희미해지거나 원모습이 변형되었다. 그 원인은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점차 그 세력을 잃고 중앙귀족으로 변신하거나 혹은 지방의 향리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들의 세력기반이 되던 지방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여 갔다. 이에 따라 그들의 독자성을 뒷받침하던 그 지역의 풍수도 결국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 이후 풍수는 새시대의 역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세력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ㄴ. 구체적인 예
왕건의 탄생설화
\"왕건의 아버지 世祖는 도선이 이른 대로 집을 고쳐 지은 결과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왕건을 낳았다\" 실제로 도선의 제자인 경보기 처음에는 견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 스승인 도선이 왕건과 연결되었을 까닭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경보가 왕건과 연결된 이후에 생겨난 이야기일 것이다.
궁예의 철원 천도설
\"산수를 두루 살폈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풍수를 일정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기타 각 호족들의 풍수설
(2)고려시대
1) 특징
① 통치에 봉사하는 풍수
풍수사상은 왕실 및 지배층의 안정을 위한 발복사상으로 변질하여 산소잡기 위주의 음택풍수로 경사해 감. 풍수이론에서 동기감응설, 친자감응설(돌아가신 조상의 유해가 땅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자식 후손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나쁜 기에 접하면 흉사가 있다는 설)이 주조를 이룸
-고려 태조가 도선 875년에 \"2년 뒤 반드시 고귀한 인물이 출생할 것\"이라고 한 예언으로 태어났다하여 고려 왕들은 그를 존경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태조는 그가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1, 2, 5, 8조의 내용을 풍수적 설명으로 삼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다. 한편, 1127년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외치며 난을 일으킨 것도 그 뿌리는 훈요10조에 있었다.
훈요 10조
1. 우리 나라의 대업은 부처님 덕분이니, 도선의 사원을 창건하도록 하라.
2.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도선이 지정하지 않은 땅에 함부로 절을 짓지 말라고 경계함.
5.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100일간 그 곳에서 머물라.
태조는 서경은 水德이 순조롭고 지맥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도 서경은 지맥이 백두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와 명당을 이루는 터였다. 태조가 풍수지리설로써 서경의 중요성을 훈계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다. 북쪽지방은 항상 여진족을 비롯하여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다. 즉 국방상의 요지로서 서경은 중요하였다.
8. 차현 이남의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차형 이남의 지세는 반역형이므로 후백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고 당부. 이것은 태조가 통일전쟁 과정 속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후백제지역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백제지역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수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계진출을 막았던 것이다.
지역갈등의 원조.
-고려조에서는 서경뿐 아니라 남경(서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개국 160년이 지나면 도읍을 남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도선의 「비기」에 따라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 하였으며 우왕과 공민왕 때는 잠시나마 국도를 옮긴 적도 있다.
-고려조에서는 초기부터 묏자리 풍수도 널리 퍼져 있었다. 『고려사』 열전에는 태조의 아들인 동시에 현종의 아버지였던 안종 욱이 자기가 죽은 뒤에 쓸 묏자리를 미리 정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현종이 뒤에 임금 자리에 오른 것도 무덤을 잘 쓴 결과라는 것을 말한다.
-고려 왕조에서는 풍수 전문가라고 할 \'지리박사\', \'地理生\' 따위의 관직을 두었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풍수가의 대부분은 승려 출신들이었다.
(3) 조선시대
-조선 왕조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는데 풍수는 유교의 기본 전제인 효(孝) 사상과 결합하여 큰 발전을 보게 된다. 이 풍수설(음택풍수)은 조선조에 들어와 더욱 굳게 신봉되었으며 이의 폐단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태조 이성계가 처음 송도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작정하였다가 계룡산으로 바꾸고, 이미 시작하였던 궁궐 공사까지 중도 파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무학대사의 의견을 좇아 한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관악산의 火氣를 꺽으려고 남대문의 현판을 세워 걸었고 대궐정문인 光化門앞에 해태상을 놓았고 허술한 동쪽을 도우려고 동대문의 현판을 \'興人之門\'의 넉 자로 하고 앞에는 오성을 쌓기도 하였다.
-조선조에서는 특히 무덤 풍수가 왕가나 상류 계층은 물론 일반에게까지 유행하였다. 그것은 한 가족이나 가문을 단위로 하는 유교적 생활 관습이 무덤 풍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 그리고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이른바 名局을 찾아내려고 가산을 탕진하고 세도를 이용하여 남의 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이미 죽은 이의 묘를 파내어 자기 조상의 유해를 이장하는 따위의 작폐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한 뿌리에서 비롯한 두 문중이 대를 물려가며 다툼을 계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조선조에서는 풍수지리를 전문으로 하는 陰陽科를 직제에 두고 이의 시험 과목으로 『청오경』 『금낭경』 『호순신』 『명산론』 따위를 부과하였다.
(4) 일제시대
(5) 오늘날의 풍수
1) 대권과 풍수
① 暗葬으로 대권쟁취한 윤보선 전두환,
② 移葬으로 출세한 노태우 김대중
2) 생활풍수
뿐만 아니라 각지 호족들이 웅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족들은 이웃하는 다른 호족을 흡수하여 팽창해 가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호족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들 호족에게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풍수를 도입하게 한 것이다.
현재 왕건과 연결된 풍수만이 남아서 전해오고 다른 경우는 모두 희미해지거나 원모습이 변형되었다. 그 원인은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점차 그 세력을 잃고 중앙귀족으로 변신하거나 혹은 지방의 향리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들의 세력기반이 되던 지방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여 갔다. 이에 따라 그들의 독자성을 뒷받침하던 그 지역의 풍수도 결국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 이후 풍수는 새시대의 역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세력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ㄴ. 구체적인 예
왕건의 탄생설화
\"왕건의 아버지 世祖는 도선이 이른 대로 집을 고쳐 지은 결과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왕건을 낳았다\" 실제로 도선의 제자인 경보기 처음에는 견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 스승인 도선이 왕건과 연결되었을 까닭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경보가 왕건과 연결된 이후에 생겨난 이야기일 것이다.
궁예의 철원 천도설
\"산수를 두루 살폈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풍수를 일정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기타 각 호족들의 풍수설
(2)고려시대
1) 특징
① 통치에 봉사하는 풍수
풍수사상은 왕실 및 지배층의 안정을 위한 발복사상으로 변질하여 산소잡기 위주의 음택풍수로 경사해 감. 풍수이론에서 동기감응설, 친자감응설(돌아가신 조상의 유해가 땅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자식 후손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나쁜 기에 접하면 흉사가 있다는 설)이 주조를 이룸
-고려 태조가 도선 875년에 \"2년 뒤 반드시 고귀한 인물이 출생할 것\"이라고 한 예언으로 태어났다하여 고려 왕들은 그를 존경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태조는 그가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1, 2, 5, 8조의 내용을 풍수적 설명으로 삼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다. 한편, 1127년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외치며 난을 일으킨 것도 그 뿌리는 훈요10조에 있었다.
훈요 10조
1. 우리 나라의 대업은 부처님 덕분이니, 도선의 사원을 창건하도록 하라.
2.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도선이 지정하지 않은 땅에 함부로 절을 짓지 말라고 경계함.
5.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100일간 그 곳에서 머물라.
태조는 서경은 水德이 순조롭고 지맥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도 서경은 지맥이 백두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와 명당을 이루는 터였다. 태조가 풍수지리설로써 서경의 중요성을 훈계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다. 북쪽지방은 항상 여진족을 비롯하여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다. 즉 국방상의 요지로서 서경은 중요하였다.
8. 차현 이남의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차형 이남의 지세는 반역형이므로 후백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고 당부. 이것은 태조가 통일전쟁 과정 속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후백제지역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백제지역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수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계진출을 막았던 것이다.
지역갈등의 원조.
-고려조에서는 서경뿐 아니라 남경(서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개국 160년이 지나면 도읍을 남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도선의 「비기」에 따라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 하였으며 우왕과 공민왕 때는 잠시나마 국도를 옮긴 적도 있다.
-고려조에서는 초기부터 묏자리 풍수도 널리 퍼져 있었다. 『고려사』 열전에는 태조의 아들인 동시에 현종의 아버지였던 안종 욱이 자기가 죽은 뒤에 쓸 묏자리를 미리 정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현종이 뒤에 임금 자리에 오른 것도 무덤을 잘 쓴 결과라는 것을 말한다.
-고려 왕조에서는 풍수 전문가라고 할 \'지리박사\', \'地理生\' 따위의 관직을 두었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풍수가의 대부분은 승려 출신들이었다.
(3) 조선시대
-조선 왕조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는데 풍수는 유교의 기본 전제인 효(孝) 사상과 결합하여 큰 발전을 보게 된다. 이 풍수설(음택풍수)은 조선조에 들어와 더욱 굳게 신봉되었으며 이의 폐단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태조 이성계가 처음 송도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작정하였다가 계룡산으로 바꾸고, 이미 시작하였던 궁궐 공사까지 중도 파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무학대사의 의견을 좇아 한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관악산의 火氣를 꺽으려고 남대문의 현판을 세워 걸었고 대궐정문인 光化門앞에 해태상을 놓았고 허술한 동쪽을 도우려고 동대문의 현판을 \'興人之門\'의 넉 자로 하고 앞에는 오성을 쌓기도 하였다.
-조선조에서는 특히 무덤 풍수가 왕가나 상류 계층은 물론 일반에게까지 유행하였다. 그것은 한 가족이나 가문을 단위로 하는 유교적 생활 관습이 무덤 풍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 그리고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이른바 名局을 찾아내려고 가산을 탕진하고 세도를 이용하여 남의 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이미 죽은 이의 묘를 파내어 자기 조상의 유해를 이장하는 따위의 작폐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한 뿌리에서 비롯한 두 문중이 대를 물려가며 다툼을 계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조선조에서는 풍수지리를 전문으로 하는 陰陽科를 직제에 두고 이의 시험 과목으로 『청오경』 『금낭경』 『호순신』 『명산론』 따위를 부과하였다.
(4) 일제시대
(5) 오늘날의 풍수
1) 대권과 풍수
① 暗葬으로 대권쟁취한 윤보선 전두환,
② 移葬으로 출세한 노태우 김대중
2) 생활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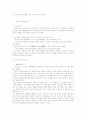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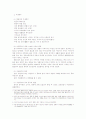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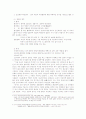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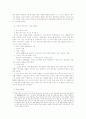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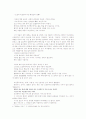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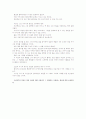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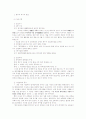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