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이었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어영역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 깊이나 내용에 있어서 변별력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행처럼 단지 시간을 조금 준 다음 그것을 빠르게 읽으면서 풀고 그 것에 대해 사고할 여유를 주지 않는 시험은 속독력 테스트일뿐 언어능력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언어영역을 풀어보면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참 많은 모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언어영역을 없애고 그 능력에 대한 재량을 대학 측에 맡긴다면 그것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언어영역을 없앤다면 현재 가장 많은 시간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어과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국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험을 주관식으로 고친다면 그 수많은 수험생의 시험은 누가 다 채점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언어영역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체재를 바꿀 수 없다면 그 범위 안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단순한 속독력 테스트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좀더 깊은 사고력을 요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든지 문제 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어영역을 개혁하고 고쳐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나은 평가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언어영역을 풀어보면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참 많은 모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언어영역을 없애고 그 능력에 대한 재량을 대학 측에 맡긴다면 그것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언어영역을 없앤다면 현재 가장 많은 시간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어과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국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험을 주관식으로 고친다면 그 수많은 수험생의 시험은 누가 다 채점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언어영역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체재를 바꿀 수 없다면 그 범위 안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단순한 속독력 테스트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좀더 깊은 사고력을 요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든지 문제 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어영역을 개혁하고 고쳐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나은 평가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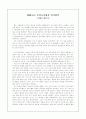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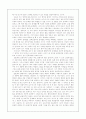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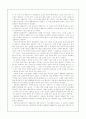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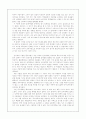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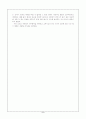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