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년기 (순회 연주하는 신동)
-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 스무살의 볼프강(행복한 시기)
- 성숙기의 볼프강 (1779년 ∼1782년)
-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 스무살의 볼프강(행복한 시기)
- 성숙기의 볼프강 (1779년 ∼1782년)
본문내용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볼프강은 처음에 독일로 갔지만, 약간 좌절하며 파리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알로이지아를 사랑하게 되어 만하임에서 약간 지체하게 되는데,
레오폴트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 편지로 자주 괴롭히곤 했다.
볼프강은 뮌헨, 만하임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다른 음악가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갑자기 짤츠부르크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파리에서 힘겨운 생활로 1778년 7월 3일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절망 속에 말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볼프강은 파리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하나의 위안인 알로이지아를 찾아가게
되는데 억세게 재수없는 우리의 볼프강...
크리스마스라고 찾아간 알로지아는 볼프강을 비웃으면 따돌리고 맙니다.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안식- 고향, 그는 짤츠부르크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파리에 묻은 체...그가 여행을 마쳤을 때는 23세 청년이었다.
성숙기의 볼프강 (1779년 1782년)
여행에서 돌아온 볼프강은 그때마다 여행이 자신에게 안겨준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바야흐로 음악에 있어서도 성숙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1779년 청년 모차르트는 자신이 무척이나 좋아하던 여인 알로이지아로
부터 퇴짜를 맞는다. 그래서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을 테지만 그의 음악적
인 면에서는 전혀 그런 구석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에서 보면 정서적인 면이 잘 나타난
명랑한 곡조이다.
그러다가 1779년 10월 초부터는 모차르트의 음조는 다소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약혼을 하고 여유를 갖게 된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두가지 양식 - 만하임의 대규모, 파리 간결함을 신중하게
융합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1780년 작곡된 C장조 교향곡 K.388에서는 그가 중점을 두었던 두양식
과 만하임 악파의 업적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음악에서도 고뇌와 편안함이 교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볼프강은
다시금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한 강렬한
공허함은 죽음으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 무렵 모차르트는 바로
프리메이슨 사상과 가까워지게 된다.
파이에서 돌아온 1780년 초 볼프강은 보다 수준이 낮은 무대음악에
열중하게 된다. 1781년 『이도메네오』는 뮌헨 궁정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대규모 행사인 사육제를 위해 작곡한 오페라 세리아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볼프강이 했던 무대작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것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의 작품은 행사용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대가적인 예술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사건은 지겨울 정도로 어려웠다. 무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과정에 시달려야만 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무식한 XX들이 항상 말썽이다. ^^;;;
그 속에서도 그는 간결함을 잘살려 이도메네오를 훌륭하게 성공시킨다.
보라~~장하지 아니한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1981년 3월부터는 일이 갑자기
긴박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정된 5주의 휴가기간을 볼프강이
넘겼던 것이다. 계율가(누군지 아시져?? 에이~~ㅇ... 다 암시롱~~)
바로 콜로라도 대주교는 그런 볼프강이 또다시 맘에 걸렸지만,
그가 다시 일할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빈으로 합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콜로레도와의 결별은 부득이 한 것이었으면 뭐그리 갑작
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치욕적인 상황이 확대되면서.................
아무튼 그러한 결렬은 단순하게 낭만적인 한 예술가가 고용주인
귀족에서게 독립한 것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아직 모차르트
시대에는 모차르트를 위해 전적으로 지원할 계급은 귀족이었고,
다만 문제가 되었다면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귀족들의 무지였다.
(예나 지금이나 무식한 것이 죄여~~~)
사실..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모차르트의 다음 세대인 베토벤은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모차르트와 비교해 볼 때) 작곡을 했다
할 수 있다. 왜냐면 모차르트 시대에는 예술가가 귀족들의 하수인
과 독립적인 예술인으로서의 중간자적인 역할이었다면
베토벤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 후 많은 부유한 신흥계급이 등장함
에 따라 예술가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술인
들은 그 전세대 예술인보다 훨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다시 볼프강으로..흠흠..^^;;;
음 아무튼 좌절되는 시기의 우리의 볼프강 물론 우리의 기대를 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작품 할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이야~~~~~\" ^^;;;
빈에 체류하는 동안 모차르트는 1784년 8월 4일 여러분은
기억하시리라...알로지아 우리 청년 볼프강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바로 그 여자...에잉 그런데 8월 4일은 바로 그녀의 동생인
콘스탄체 베버와 결혼하게 된다. 물론 레오폴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지금까지 경솔하고 허영심 많은 여자의 전형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즘들어서는 그녀는 재정문제에 능했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꾸준히 성원해준 내조자라는 평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으로 그 당시 볼프강은
새로운 오페라 『후궁에서의 탈출』(옛날 책들을 보면 이작품을
\"후궁으로의 유괴\" 라고 번역했는데, 오페라 내용상 유괴라기
보다는 도주가 훨씬 합당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본
놈들의 엉터리 해석이 아닐까 한다.
(개네는 스테이크 발음도 안돼서 스테키라 하잖수..)
모차르트가 이 후궁에서의 탈출이라는 오페라에 착수한 것이
1781년 7월이었는데 완성이 늦어져 황제가 상연의 보증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이 오페라는 1782년 1년동안 60회난 상연
될 정도의 대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오페라의 마지막 - 익살스러운 장면의
주인공들(프랑스 풍자극 양식과 일치하는)이 자취를 감추고
갑작스럽게 대사가 나온다 \" 복수만큼이나 가증스러운 일은 없다....\"
볼프강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의 마지막에서 장중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박애정신에 대한 찬미를 강조했다..
볼프강은 처음에 독일로 갔지만, 약간 좌절하며 파리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알로이지아를 사랑하게 되어 만하임에서 약간 지체하게 되는데,
레오폴트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 편지로 자주 괴롭히곤 했다.
볼프강은 뮌헨, 만하임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다른 음악가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갑자기 짤츠부르크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파리에서 힘겨운 생활로 1778년 7월 3일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절망 속에 말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볼프강은 파리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하나의 위안인 알로이지아를 찾아가게
되는데 억세게 재수없는 우리의 볼프강...
크리스마스라고 찾아간 알로지아는 볼프강을 비웃으면 따돌리고 맙니다.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안식- 고향, 그는 짤츠부르크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파리에 묻은 체...그가 여행을 마쳤을 때는 23세 청년이었다.
성숙기의 볼프강 (1779년 1782년)
여행에서 돌아온 볼프강은 그때마다 여행이 자신에게 안겨준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바야흐로 음악에 있어서도 성숙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1779년 청년 모차르트는 자신이 무척이나 좋아하던 여인 알로이지아로
부터 퇴짜를 맞는다. 그래서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을 테지만 그의 음악적
인 면에서는 전혀 그런 구석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에서 보면 정서적인 면이 잘 나타난
명랑한 곡조이다.
그러다가 1779년 10월 초부터는 모차르트의 음조는 다소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약혼을 하고 여유를 갖게 된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두가지 양식 - 만하임의 대규모, 파리 간결함을 신중하게
융합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1780년 작곡된 C장조 교향곡 K.388에서는 그가 중점을 두었던 두양식
과 만하임 악파의 업적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음악에서도 고뇌와 편안함이 교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볼프강은
다시금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한 강렬한
공허함은 죽음으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 무렵 모차르트는 바로
프리메이슨 사상과 가까워지게 된다.
파이에서 돌아온 1780년 초 볼프강은 보다 수준이 낮은 무대음악에
열중하게 된다. 1781년 『이도메네오』는 뮌헨 궁정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대규모 행사인 사육제를 위해 작곡한 오페라 세리아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볼프강이 했던 무대작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것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의 작품은 행사용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대가적인 예술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사건은 지겨울 정도로 어려웠다. 무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과정에 시달려야만 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무식한 XX들이 항상 말썽이다. ^^;;;
그 속에서도 그는 간결함을 잘살려 이도메네오를 훌륭하게 성공시킨다.
보라~~장하지 아니한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1981년 3월부터는 일이 갑자기
긴박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정된 5주의 휴가기간을 볼프강이
넘겼던 것이다. 계율가(누군지 아시져?? 에이~~ㅇ... 다 암시롱~~)
바로 콜로라도 대주교는 그런 볼프강이 또다시 맘에 걸렸지만,
그가 다시 일할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빈으로 합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콜로레도와의 결별은 부득이 한 것이었으면 뭐그리 갑작
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치욕적인 상황이 확대되면서.................
아무튼 그러한 결렬은 단순하게 낭만적인 한 예술가가 고용주인
귀족에서게 독립한 것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아직 모차르트
시대에는 모차르트를 위해 전적으로 지원할 계급은 귀족이었고,
다만 문제가 되었다면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귀족들의 무지였다.
(예나 지금이나 무식한 것이 죄여~~~)
사실..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모차르트의 다음 세대인 베토벤은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모차르트와 비교해 볼 때) 작곡을 했다
할 수 있다. 왜냐면 모차르트 시대에는 예술가가 귀족들의 하수인
과 독립적인 예술인으로서의 중간자적인 역할이었다면
베토벤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 후 많은 부유한 신흥계급이 등장함
에 따라 예술가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술인
들은 그 전세대 예술인보다 훨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다시 볼프강으로..흠흠..^^;;;
음 아무튼 좌절되는 시기의 우리의 볼프강 물론 우리의 기대를 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작품 할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이야~~~~~\" ^^;;;
빈에 체류하는 동안 모차르트는 1784년 8월 4일 여러분은
기억하시리라...알로지아 우리 청년 볼프강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바로 그 여자...에잉 그런데 8월 4일은 바로 그녀의 동생인
콘스탄체 베버와 결혼하게 된다. 물론 레오폴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지금까지 경솔하고 허영심 많은 여자의 전형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즘들어서는 그녀는 재정문제에 능했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꾸준히 성원해준 내조자라는 평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으로 그 당시 볼프강은
새로운 오페라 『후궁에서의 탈출』(옛날 책들을 보면 이작품을
\"후궁으로의 유괴\" 라고 번역했는데, 오페라 내용상 유괴라기
보다는 도주가 훨씬 합당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본
놈들의 엉터리 해석이 아닐까 한다.
(개네는 스테이크 발음도 안돼서 스테키라 하잖수..)
모차르트가 이 후궁에서의 탈출이라는 오페라에 착수한 것이
1781년 7월이었는데 완성이 늦어져 황제가 상연의 보증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이 오페라는 1782년 1년동안 60회난 상연
될 정도의 대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오페라의 마지막 - 익살스러운 장면의
주인공들(프랑스 풍자극 양식과 일치하는)이 자취를 감추고
갑작스럽게 대사가 나온다 \" 복수만큼이나 가증스러운 일은 없다....\"
볼프강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의 마지막에서 장중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박애정신에 대한 찬미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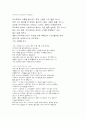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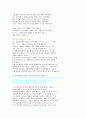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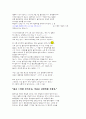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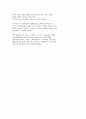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