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 인간이 자연의 파괴를 당연시 생각한 이유-창세기 내용
= 기독교 전반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인식
= 창세기 자연관의 의미를 좀더 깊게 짚어보자
근대 서구의 자연관
3. 결론
2. 본론
= 인간이 자연의 파괴를 당연시 생각한 이유-창세기 내용
= 기독교 전반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인식
= 창세기 자연관의 의미를 좀더 깊게 짚어보자
근대 서구의 자연관
3. 결론
본문내용
진다. 더욱 효율 좋은 과학수단을 생각하고 또 그 일만이 인간의 번영이며 진보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신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믿어버린 인간은 \"정복, 정복\"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씨 없는 수박이나 포도를 만들고 닭을 좁은 상자 속에 집어넣고 모이만을 먹여 알만 낳게 한다. 그 일이 품질개량이자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종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우수한 아리안족을 보존하기 위해 영악한 수레야인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서 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성서의 내용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찰스 다윈은 이 점을 피하기 위해 적자생존이라는 도피 구멍을 생각해냈다. 낡은 것을 멸종시키고 새로운 좋은 것이 나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금의 인류 호모사피엔스(지적 인간)는 못난 원숭이와 사람 중간쯤의 위치에 있는 족속을 없애고 이 세상을 지배했다 하여 간신히 기독교인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그 밑에 차례로 동물이 줄을 잇고 있다. 생물에 계급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나가서는 인간도 계급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맨 위에는 백인이 있고 다음에 한국인과 같은 황색인종, 그리고 흑인이 자리잡은 것으로 여긴다. 서구인이 노예제를 만들고 인디언 절멸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유대인의 신이 그들에게 너는 최고의 존재라 하던 것이 오히려 유대인을 못난 존재이기에 죽여도 좋다는 생각에 이르게 하고 유대인에게 큰 시련을 준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自然)이란 서구에서 사용하는 nature의 번역어이다. 오늘의 자연관은 17세기 \"과학혁명\"에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자연관에 입각하고 그것이 과학의 방향과 전통을 결정했다. 자연을 natura (nature의 라틴어)로서 파악한 것은 중세부터의 일이다. 중세기독교에서는 앞서 언급한 성서의 자연관, 즉 \"자연이란 정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인간-자연\"이라는 엄연한 계층적인 질서를 생각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신은 그들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또 인간은 자연과 동격이 아니라 자연 위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이 사상은 로저 베이컨(Rodger Bacon)을 걸쳐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에 이르러 자연 지배의 개념에 확실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근대 서구의 자연관은 본질적으로는 중세기독교세계의 자연관을 계승하고 그것을 방법적으로 자각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과 완전히 떨어져 하나의 객관적(客觀的) 대상이 되어 인간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고 이용을 받게 된다. 과학자는 인간적 요소로 생각되는 색채, 냄새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주로 \"크기\" \"모양\" \"운동\" 등 소위 제일성질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요소로 분해하고 인과적 수학적으로 해석해나가게 되고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성립된다.
이 작업을 체계화한 데카르트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는 물체에서 \"실체형상\"(實體形相)이라 불리는 마음이나 영혼과 같은 생명원리를 모두 제거해버린다. 모든 것은 균질적(均質的)인 성격을 갖는 기하학적 \"연장\"(延長)에 환원하게 되고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자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연장\"을 더욱더 작은 원리적인 것으로 생각해간다면 궁극에서는 \"모양\" \"크기\" \"운동\"만을 갖는 미립자가 된다. 분자 원자가 과학 연구의 중심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데카르트는 정신면에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따진다. 저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상징하는 순수 사유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았다. 그것은 기하학적인 이성이며 수학으로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었고 이것 역시 피가 흐르지 않는 냉엄한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사고이다. 자연에 대한 \"연장\"과 정신에 대한 \"순수사유\"의 쌍두마차가 된 데카르트의 세계관에는 생명이 빠져 있다. 여기에서 타율에만 의존하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태어났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상과, 앞서 설명한 베이컨의 자연 지배의 철학이 결합되자 자연은 여지없이 분석되고 말았고, 근대의 과학기술은 가속도를 늘리면서 추진한다. 자연세계는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인간의 물리적 조건은 풍요로웠으며 오늘날의 과학기술문명이 확립된 것이다.
씨 없는 수박이나 포도를 만들고 닭을 좁은 상자 속에 집어넣고 모이만을 먹여 알만 낳게 한다. 그 일이 품질개량이자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종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우수한 아리안족을 보존하기 위해 영악한 수레야인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서 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성서의 내용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찰스 다윈은 이 점을 피하기 위해 적자생존이라는 도피 구멍을 생각해냈다. 낡은 것을 멸종시키고 새로운 좋은 것이 나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금의 인류 호모사피엔스(지적 인간)는 못난 원숭이와 사람 중간쯤의 위치에 있는 족속을 없애고 이 세상을 지배했다 하여 간신히 기독교인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그 밑에 차례로 동물이 줄을 잇고 있다. 생물에 계급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나가서는 인간도 계급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맨 위에는 백인이 있고 다음에 한국인과 같은 황색인종, 그리고 흑인이 자리잡은 것으로 여긴다. 서구인이 노예제를 만들고 인디언 절멸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유대인의 신이 그들에게 너는 최고의 존재라 하던 것이 오히려 유대인을 못난 존재이기에 죽여도 좋다는 생각에 이르게 하고 유대인에게 큰 시련을 준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自然)이란 서구에서 사용하는 nature의 번역어이다. 오늘의 자연관은 17세기 \"과학혁명\"에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자연관에 입각하고 그것이 과학의 방향과 전통을 결정했다. 자연을 natura (nature의 라틴어)로서 파악한 것은 중세부터의 일이다. 중세기독교에서는 앞서 언급한 성서의 자연관, 즉 \"자연이란 정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인간-자연\"이라는 엄연한 계층적인 질서를 생각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신은 그들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또 인간은 자연과 동격이 아니라 자연 위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이 사상은 로저 베이컨(Rodger Bacon)을 걸쳐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에 이르러 자연 지배의 개념에 확실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근대 서구의 자연관은 본질적으로는 중세기독교세계의 자연관을 계승하고 그것을 방법적으로 자각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과 완전히 떨어져 하나의 객관적(客觀的) 대상이 되어 인간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고 이용을 받게 된다. 과학자는 인간적 요소로 생각되는 색채, 냄새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주로 \"크기\" \"모양\" \"운동\" 등 소위 제일성질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요소로 분해하고 인과적 수학적으로 해석해나가게 되고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성립된다.
이 작업을 체계화한 데카르트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는 물체에서 \"실체형상\"(實體形相)이라 불리는 마음이나 영혼과 같은 생명원리를 모두 제거해버린다. 모든 것은 균질적(均質的)인 성격을 갖는 기하학적 \"연장\"(延長)에 환원하게 되고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자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연장\"을 더욱더 작은 원리적인 것으로 생각해간다면 궁극에서는 \"모양\" \"크기\" \"운동\"만을 갖는 미립자가 된다. 분자 원자가 과학 연구의 중심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데카르트는 정신면에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따진다. 저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상징하는 순수 사유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았다. 그것은 기하학적인 이성이며 수학으로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었고 이것 역시 피가 흐르지 않는 냉엄한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사고이다. 자연에 대한 \"연장\"과 정신에 대한 \"순수사유\"의 쌍두마차가 된 데카르트의 세계관에는 생명이 빠져 있다. 여기에서 타율에만 의존하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태어났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상과, 앞서 설명한 베이컨의 자연 지배의 철학이 결합되자 자연은 여지없이 분석되고 말았고, 근대의 과학기술은 가속도를 늘리면서 추진한다. 자연세계는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인간의 물리적 조건은 풍요로웠으며 오늘날의 과학기술문명이 확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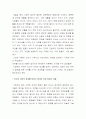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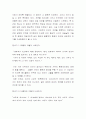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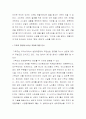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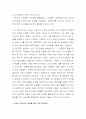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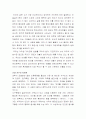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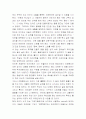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