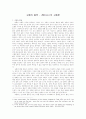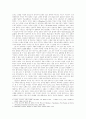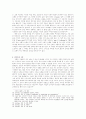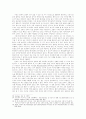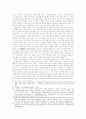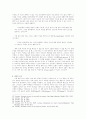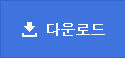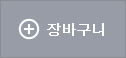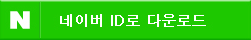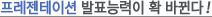목차
1. 고통의 문제
2. 고통은 쓸모 없는 것인가?
3. 고통의 현상학
4. 변신론과 고통
5. 고통, 윤리, 주체성
6. 비판적 논의
2. 고통은 쓸모 없는 것인가?
3. 고통의 현상학
4. 변신론과 고통
5. 고통, 윤리, 주체성
6. 비판적 논의
본문내용
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모험이고 지극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적 예를 통해 제시되거나 건덕적인 담론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일 이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만들어 버릴 경우 대리적 고통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레비나스는 역설한다.
. Levinas, "La souffrance inutile", 116면: "S'accuser en souffrant est sans doute la recurrence meme du moi soi. C'est peut-etre ainsi que le pour-l'autre - rapport le plus droit a autrui - est l'aventure la plus profonde de la subjectivit , son intimit ultime. Mais cette intimit ne se peut que discr te. Elle ne saurait se donner en exemple, se narrer comme discours difiant. Elle ne saurait sans se pervertir se faire pr dication."
이러한 지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타인을 위한 고통이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레비나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 대한 무한 책임 대신 상호성이 시민 사회의 특징이다. 시민사회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 받는 것으로 레비나스의 말처럼, '거래'와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질서('존재의 질서' 또는 '도시[폴리스]')의 삶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법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법과 경제, 정치의 논리로만 정말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의로움, 공정성, 사랑, 신뢰, 희생,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없이 거저 줌, 베풂,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존재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는가? 존재 질서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존재 질서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다른 것'으로 '존재 사건 저 쪽'에 있다는 것을 레비나스는 강하게 주장한다. 존재 질서 자체는 그에 따르면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conatus essendi)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가까움', '대리', '타인의 고통을 짊어짐' 등과 같은 주제는 '도시[폴리스]'의 삶의 가능 조건으로서, 존재유지 노력과는 다른 자유롭고 빈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Levinas, Autrement qu'etre ou au-dela de l'essence, 202-203면 참조.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나의 의로운 고통"은 의미 있을 수 있다. 뒤집어 보면 '나의' 고통 또는 '너의' 고통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괴로워한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한 무의미한 고통이었다. 고통은 언제나 '나의' 고통 또는 '우리의' 고통이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전통을 뒤집어 놓는다. 그의 관심은 내가 받는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받는 고통에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레비나스의 관심은 타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고통의 물음에 관련해서 관심의 축을 '나' 또는 '우리'로부터 '타인'으로 회전시킨 점에서 레비나스의 독창성이 있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러한 관심 축의 전환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통받는 개인이 고통 중에서, 예컨대 아내나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각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발견의 과정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차피 고통 자체가 아무리 집단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고통 자체로서는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감성적'으로 와 닿은 것이 아닌가? 문화적, 상호 주관적 해석의 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지라도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의 경험에 비하면 역시 부차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통은 고통받는 사람의 품성을 매우 냉소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매우 고상하고 개방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욥의 경우를 보라. 그의 고통은 타인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다. 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야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받는 고통이었다. 만일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또는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다면 욥의 고통은 천상에서 내기를 한 하느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느님이 그에게 둔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은 결코 대속적 고통은 아니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한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드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도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기 42:5)라고 욥은 마침내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예는 씨.에스.루이스나 월터스토프 또는 박완서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 월터스토프와 박완서의 앞의 책, 그리고 C.S. Lewis의 A Grief Observed (London: Faber and Faber, 1961) 참조.
이 모든 예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통을 쉽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참다운 신뢰와 믿음 가운데, '영원자'와 끝까지 싸운 사람은 무의미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아무도 고통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손봉호 교수의 주장대로 "고통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210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배우고 타인의 존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Levinas, "La souffrance inutile", 116면: "S'accuser en souffrant est sans doute la recurrence meme du moi soi. C'est peut-etre ainsi que le pour-l'autre - rapport le plus droit a autrui - est l'aventure la plus profonde de la subjectivit , son intimit ultime. Mais cette intimit ne se peut que discr te. Elle ne saurait se donner en exemple, se narrer comme discours difiant. Elle ne saurait sans se pervertir se faire pr dication."
이러한 지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타인을 위한 고통이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레비나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 대한 무한 책임 대신 상호성이 시민 사회의 특징이다. 시민사회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 받는 것으로 레비나스의 말처럼, '거래'와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질서('존재의 질서' 또는 '도시[폴리스]')의 삶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법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법과 경제, 정치의 논리로만 정말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의로움, 공정성, 사랑, 신뢰, 희생,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없이 거저 줌, 베풂,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존재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는가? 존재 질서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존재 질서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다른 것'으로 '존재 사건 저 쪽'에 있다는 것을 레비나스는 강하게 주장한다. 존재 질서 자체는 그에 따르면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conatus essendi)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가까움', '대리', '타인의 고통을 짊어짐' 등과 같은 주제는 '도시[폴리스]'의 삶의 가능 조건으로서, 존재유지 노력과는 다른 자유롭고 빈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Levinas, Autrement qu'etre ou au-dela de l'essence, 202-203면 참조.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나의 의로운 고통"은 의미 있을 수 있다. 뒤집어 보면 '나의' 고통 또는 '너의' 고통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괴로워한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한 무의미한 고통이었다. 고통은 언제나 '나의' 고통 또는 '우리의' 고통이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전통을 뒤집어 놓는다. 그의 관심은 내가 받는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받는 고통에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레비나스의 관심은 타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고통의 물음에 관련해서 관심의 축을 '나' 또는 '우리'로부터 '타인'으로 회전시킨 점에서 레비나스의 독창성이 있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러한 관심 축의 전환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통받는 개인이 고통 중에서, 예컨대 아내나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각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발견의 과정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차피 고통 자체가 아무리 집단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고통 자체로서는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감성적'으로 와 닿은 것이 아닌가? 문화적, 상호 주관적 해석의 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지라도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의 경험에 비하면 역시 부차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통은 고통받는 사람의 품성을 매우 냉소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매우 고상하고 개방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욥의 경우를 보라. 그의 고통은 타인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다. 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야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받는 고통이었다. 만일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또는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다면 욥의 고통은 천상에서 내기를 한 하느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느님이 그에게 둔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은 결코 대속적 고통은 아니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한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드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도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기 42:5)라고 욥은 마침내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예는 씨.에스.루이스나 월터스토프 또는 박완서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 월터스토프와 박완서의 앞의 책, 그리고 C.S. Lewis의 A Grief Observed (London: Faber and Faber, 1961) 참조.
이 모든 예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통을 쉽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참다운 신뢰와 믿음 가운데, '영원자'와 끝까지 싸운 사람은 무의미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아무도 고통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손봉호 교수의 주장대로 "고통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210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배우고 타인의 존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