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법개정의 배경
II. 개정법원안의 내용
III. 개정법원안의 심의
IV. 개정법안대안의 성립과 통과
V. 개정법의 내용
VI. 문제점
II. 개정법원안의 내용
III. 개정법원안의 심의
IV. 개정법안대안의 성립과 통과
V. 개정법의 내용
VI. 문제점
본문내용
係로 전환시키고 있다(773조와 774조의 삭제).
3. 婚姻法의 補充
_ 婚姻法의 분야에서도 비교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혼관계에[86] 있어서 현저하다. 어느 부분이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家父長的要素의 제거 兩性平等의 실현 離婚時 자녀의 보호를 꾀한 것이 사실이다.
_ 중요한 것으로는, 離婚時 子女養育에 관하여 夫에게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던 것을 부부쌍방의 협의로 전환시켰으며(837조), 미성년자녀에 대한 面接交涉權을 신설하고(837조의2), 離婚配偶者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財産分割請求權까지도 도입하게 되었다(839조의2). 그리고 婚姻生活費用에 관해서는 종래의 夫負擔으로부터 夫婦共同負擔으로 전환한 것도 주목된다(833조).
4. 養子法의 補修
_ 養子法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제도의 폐지에 따르는 세부사항의 수정이 주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도의 개혁의 취지에 따라서 壻養子制度(876조의 삭제), 遺言養子制度(880조의 삭제), 死後養子制度(867조, 868조, 879조 등의 삭제) 등을 폐지하는 한편, 家庭法院의 적극적 관여를 새롭게 인정하고(871조 단서), 夫婦共同入養의 實質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고(874조), 罷養原因에 있어서 家父長制 家族制度的인 法文의 표현을 수정한 점(905조 1항) 등은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5. 親子法 등의 改正
_ 親子法에 있어서는 부모의 權利的 側面에 앞서 자녀의 보호 교양이란 義務的側面이 강조되고 있는 親權法理念에 부응한 개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_ 즉 親權의 夫權的要素를 버리고 부모의 의견불일치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고(909조 2항), 婚姻外出生子에 대한 親權子決定에 관해서는 물론(909조 4항) 이혼후의 前婚中出生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해서도(909조 4항)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共同親權者 一方의 共同名義行爲의 효력에 관해서는 他方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행위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었다(920조의2).
_ 後見法에 있어서는 他部分의 改正에 따르는 關聯條文의 정리가 행해졌다. 扶養關係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6. 相續分決定의 合理化
_ 相續法의 분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戶主相續制度[87] 의 폐지로 인하여 條文整理가 있은 것은 당연하다. 그 밖에도 財産相續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相續人의 범위를 被相續人의 4촌 이내의 傍系血族까지로 축소하였고(1000조 1항 4호) 配偶者의 상속순위를 부부평등으로 하였으며(1003조), 자녀의 상속분에 관해서도 균등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1009조 1항).
_ 새로이 채용된 제도로서는 共同相續人 중에 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하여 특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의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한 額이 상속분이 되도록 한 寄與分制度(1008조의2),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는 特別緣故者分與制度(1057조의2)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종래의 호주상속인의 획일적인 祭祀特權을 부정하고 사실상의 祭祀主宰者에게 墳墓와 附屬土地 祭具 등의 승계를 인정한 것(1008조의3)도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問題點
_ 1989년의 家族法의 改正은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은 물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하여 큰 변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社會一般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후 각국의 가족법은 두 갈래의 커다란 조류를 타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 하나는 男性優位로부터 남녀평등에의 指向이고, 다른 하나는 父母中心으로부터 未成年子女의 保護 强化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참작할 때 1989년의 家族法改正은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 대체로 현대적 추세에 걸맞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改正家族法은 立法論으로서나 해석작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필자 나름으로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_ ① 同姓同本禁婚制度에 관해서는 아무런 改正도 하지 않았다(809조).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만한 실질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가를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_ ② 새로 마련된 戶主承繼制度는 戶主制度廢止를 둘러싸는 贊否兩論의 妥協的[88] 所産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980조이하). 그런데 개정법상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유명 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_ ③ 兩性平等의 입장에서 개정한 親族範圍는 결과적으로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게 되었다(777조).
_ ④ 姻戚의 범위에 관한 제769조는 인척 사이의 禁婚範圍에 관한 제809조와 관련시켜 그 구체적인 경우가 論究되어야 한다.
_ ⑤ 繼母 또는 嫡母의 姻戚化를 倫理觀念의 시각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_ ⑥ 戶主承繼制度를 採用하면서 入夫婚姻制度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826조 3항 4항) 타당한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_ ⑦ 離婚後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面接交涉權(837조의2)에 관해서는 그 法理의 정착이 추구되어야 한다.
_ ⑧ 離婚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權(839조의2)에 관해서는 그 客體의 確定과 評價가 문제될 것이고, 아울러 慰藉料請求權(843조 806조)과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_ ⑨ 각 분야를 통해서 母權은 신장되었지만, 離婚時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_ ⑩ 相續에 있어서의 寄與分制度(1008조의2)와 특별연고자의 分與制度(1057조의2)에 관해서는 判例의 蓄積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선 무엇보다도 그 적용에는 신중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_ ⑪ 墳墓 등의 承繼(1008조의3)에 관해서는 祭祀主宰에 관한 관행의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
_ 이상과 같은 문제점 가운데는, 法學者 實務者 女性團體 등에 의하여 이미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家族法의 再改正을 주장하는 견해조차 없지 않다. 어떻든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3. 婚姻法의 補充
_ 婚姻法의 분야에서도 비교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혼관계에[86] 있어서 현저하다. 어느 부분이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家父長的要素의 제거 兩性平等의 실현 離婚時 자녀의 보호를 꾀한 것이 사실이다.
_ 중요한 것으로는, 離婚時 子女養育에 관하여 夫에게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던 것을 부부쌍방의 협의로 전환시켰으며(837조), 미성년자녀에 대한 面接交涉權을 신설하고(837조의2), 離婚配偶者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財産分割請求權까지도 도입하게 되었다(839조의2). 그리고 婚姻生活費用에 관해서는 종래의 夫負擔으로부터 夫婦共同負擔으로 전환한 것도 주목된다(833조).
4. 養子法의 補修
_ 養子法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제도의 폐지에 따르는 세부사항의 수정이 주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도의 개혁의 취지에 따라서 壻養子制度(876조의 삭제), 遺言養子制度(880조의 삭제), 死後養子制度(867조, 868조, 879조 등의 삭제) 등을 폐지하는 한편, 家庭法院의 적극적 관여를 새롭게 인정하고(871조 단서), 夫婦共同入養의 實質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고(874조), 罷養原因에 있어서 家父長制 家族制度的인 法文의 표현을 수정한 점(905조 1항) 등은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5. 親子法 등의 改正
_ 親子法에 있어서는 부모의 權利的 側面에 앞서 자녀의 보호 교양이란 義務的側面이 강조되고 있는 親權法理念에 부응한 개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_ 즉 親權의 夫權的要素를 버리고 부모의 의견불일치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고(909조 2항), 婚姻外出生子에 대한 親權子決定에 관해서는 물론(909조 4항) 이혼후의 前婚中出生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해서도(909조 4항)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共同親權者 一方의 共同名義行爲의 효력에 관해서는 他方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행위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었다(920조의2).
_ 後見法에 있어서는 他部分의 改正에 따르는 關聯條文의 정리가 행해졌다. 扶養關係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6. 相續分決定의 合理化
_ 相續法의 분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戶主相續制度[87] 의 폐지로 인하여 條文整理가 있은 것은 당연하다. 그 밖에도 財産相續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相續人의 범위를 被相續人의 4촌 이내의 傍系血族까지로 축소하였고(1000조 1항 4호) 配偶者의 상속순위를 부부평등으로 하였으며(1003조), 자녀의 상속분에 관해서도 균등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1009조 1항).
_ 새로이 채용된 제도로서는 共同相續人 중에 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하여 특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의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한 額이 상속분이 되도록 한 寄與分制度(1008조의2),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는 特別緣故者分與制度(1057조의2)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종래의 호주상속인의 획일적인 祭祀特權을 부정하고 사실상의 祭祀主宰者에게 墳墓와 附屬土地 祭具 등의 승계를 인정한 것(1008조의3)도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問題點
_ 1989년의 家族法의 改正은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은 물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하여 큰 변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社會一般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후 각국의 가족법은 두 갈래의 커다란 조류를 타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 하나는 男性優位로부터 남녀평등에의 指向이고, 다른 하나는 父母中心으로부터 未成年子女의 保護 强化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참작할 때 1989년의 家族法改正은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 대체로 현대적 추세에 걸맞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改正家族法은 立法論으로서나 해석작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필자 나름으로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_ ① 同姓同本禁婚制度에 관해서는 아무런 改正도 하지 않았다(809조).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만한 실질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가를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_ ② 새로 마련된 戶主承繼制度는 戶主制度廢止를 둘러싸는 贊否兩論의 妥協的[88] 所産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980조이하). 그런데 개정법상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유명 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_ ③ 兩性平等의 입장에서 개정한 親族範圍는 결과적으로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게 되었다(777조).
_ ④ 姻戚의 범위에 관한 제769조는 인척 사이의 禁婚範圍에 관한 제809조와 관련시켜 그 구체적인 경우가 論究되어야 한다.
_ ⑤ 繼母 또는 嫡母의 姻戚化를 倫理觀念의 시각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_ ⑥ 戶主承繼制度를 採用하면서 入夫婚姻制度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826조 3항 4항) 타당한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_ ⑦ 離婚後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面接交涉權(837조의2)에 관해서는 그 法理의 정착이 추구되어야 한다.
_ ⑧ 離婚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權(839조의2)에 관해서는 그 客體의 確定과 評價가 문제될 것이고, 아울러 慰藉料請求權(843조 806조)과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_ ⑨ 각 분야를 통해서 母權은 신장되었지만, 離婚時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_ ⑩ 相續에 있어서의 寄與分制度(1008조의2)와 특별연고자의 分與制度(1057조의2)에 관해서는 判例의 蓄積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선 무엇보다도 그 적용에는 신중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_ ⑪ 墳墓 등의 承繼(1008조의3)에 관해서는 祭祀主宰에 관한 관행의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
_ 이상과 같은 문제점 가운데는, 法學者 實務者 女性團體 등에 의하여 이미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家族法의 再改正을 주장하는 견해조차 없지 않다. 어떻든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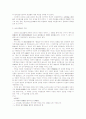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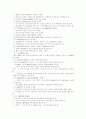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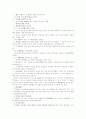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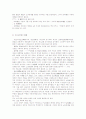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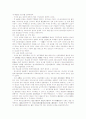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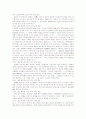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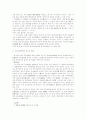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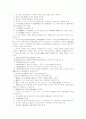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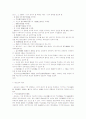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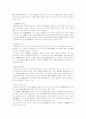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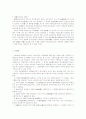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