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의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관계가 종료한 때에 제201조에 의한 과실반환청구권이나 제202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계약의 특수성 및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01조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적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주40) 즉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규정이 소유자와 점[70] 유자에 관한 규정(제201조-제203조)보다 특별규정으로서 우선하게 된다. 예컨대 乙은 甲의 복사기를 3개월간 임차하였고, 계약당시에 甲은 乙에게 轉貸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乙이 丙에게 복사기를 전대한 경우에, 乙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40) Kobl, Das Eigentumer-Besitzer-Verhaltnis im anspruchssystem des BGB, 1971, 145ff.; Wolf, a.a.O., Rdnr. 202; 이영준, 앞의 책, 330면.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에 관하여 소유자는 제201조 이외에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甲은 정신질환으로 의사무능력자인 乙소유의 임대용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甲은 알지 못하였다. 그후 乙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丙이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과 소유권양도행위가 무효이므로, 상속인 丙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제213조에 의하여 甲에게 아파트의 반환(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아파트의 인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丙은 甲에게 제741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수취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생각건대 제201조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여부를 나누어 점유자와 소유자간의 법률관계를 되도록 형평하게 규율하고 있고, 또한 선의의 점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제201조는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주41) 따라서 甲이 수취한 賃貸料는 제101조 제2항의 法定果實이지만, 甲은 乙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善意의 自主占有者이다. 그러므로 甲은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에게 임대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41) Wolf, a.a.O., Rdnr. 205; 이영준, 앞의 책, 331면.
_ 한편 A가 만취된 상태에서 B와 복사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인도하여 주었다. 이와같이 채권행위는 무효이지만 물권행위는 유효한 경우에, 물권행위 有因說에 따르면 A는 B에게 복사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213조)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無因說에 의하면 A는 B에게 복사기의 반환을 제741조에 의하여주42) 청구할[71] 수 있고, 또한 사용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B가 선의인 경우에는 사용이익을 현존한 한도에서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주42) 전술한 바와 같이 제20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無因說에 의하면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아니라 B가 취득하기 때문에, A와 B사이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제201조 제1항 과 제750조
_ 통설과 판례는 제201조 제1항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경합한다고 한다. 즉 판례는 善意의 占有者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주43)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과실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경미한 불법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주44)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제201조 제1항의 선의라 함은 단지 자신에게 本勸 없음을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本權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선의점유자가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하여 경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43) 대판 1966.7.19, 66다994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주44) 양창수, 민법주해(IV), 395면 이하.
(2) 제201조 제2항 과 제750조
_ 전술한 바와 같이 惡意의 占有者는 선의의 점유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72] 그러므로 오신할 만한 근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였다면, 악의의 점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소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소유권침해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유자가 과실수취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는주45) 일반불법행위규정(제75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에게 제201조 제2항에 의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실의 代價補償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자가 경합하게 된다.
주45) 대판 1961.6.29, 4293민상704.
주40) Kobl, Das Eigentumer-Besitzer-Verhaltnis im anspruchssystem des BGB, 1971, 145ff.; Wolf, a.a.O., Rdnr. 202; 이영준, 앞의 책, 330면.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에 관하여 소유자는 제201조 이외에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甲은 정신질환으로 의사무능력자인 乙소유의 임대용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甲은 알지 못하였다. 그후 乙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丙이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과 소유권양도행위가 무효이므로, 상속인 丙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제213조에 의하여 甲에게 아파트의 반환(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아파트의 인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丙은 甲에게 제741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수취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생각건대 제201조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여부를 나누어 점유자와 소유자간의 법률관계를 되도록 형평하게 규율하고 있고, 또한 선의의 점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제201조는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주41) 따라서 甲이 수취한 賃貸料는 제101조 제2항의 法定果實이지만, 甲은 乙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善意의 自主占有者이다. 그러므로 甲은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에게 임대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41) Wolf, a.a.O., Rdnr. 205; 이영준, 앞의 책, 331면.
_ 한편 A가 만취된 상태에서 B와 복사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인도하여 주었다. 이와같이 채권행위는 무효이지만 물권행위는 유효한 경우에, 물권행위 有因說에 따르면 A는 B에게 복사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213조)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無因說에 의하면 A는 B에게 복사기의 반환을 제741조에 의하여주42) 청구할[71] 수 있고, 또한 사용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B가 선의인 경우에는 사용이익을 현존한 한도에서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주42) 전술한 바와 같이 제20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無因說에 의하면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아니라 B가 취득하기 때문에, A와 B사이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제201조 제1항 과 제750조
_ 통설과 판례는 제201조 제1항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경합한다고 한다. 즉 판례는 善意의 占有者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주43)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과실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경미한 불법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주44)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제201조 제1항의 선의라 함은 단지 자신에게 本勸 없음을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本權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선의점유자가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하여 경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43) 대판 1966.7.19, 66다994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주44) 양창수, 민법주해(IV), 395면 이하.
(2) 제201조 제2항 과 제750조
_ 전술한 바와 같이 惡意의 占有者는 선의의 점유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72] 그러므로 오신할 만한 근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였다면, 악의의 점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소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소유권침해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유자가 과실수취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는주45) 일반불법행위규정(제75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에게 제201조 제2항에 의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실의 代價補償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자가 경합하게 된다.
주45) 대판 1961.6.29, 4293민상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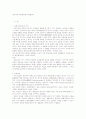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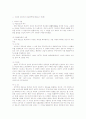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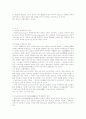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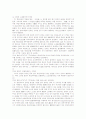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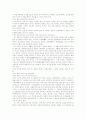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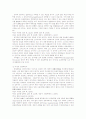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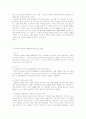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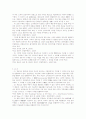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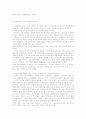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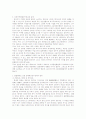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