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문제의 제기
II. 미노베 헌법사상의 배경
III. 方法論
IV. 國家論
V. 君主政體論
VI. 立憲政體論
VII. 맺음말
II. 미노베 헌법사상의 배경
III. 方法論
IV. 國家論
V. 君主政體論
VI. 立憲政體論
VII. 맺음말
본문내용
그 시기의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호즈미 우에스기의 헌법사상에 의해 대표되는 \'君權主義\' 學派의 憲法思想에 대항하여 「大日本帝國憲法」에 대한 \'입헌주의\'적인 헌법해석을 전개하고자 하는 자각적인 사명의식에 입각한 것이었다. 미노베의 그러한 사명의식은, 그로 하여금 때로 원칙적으로 반입헌주의적인 「大日本帝國憲法」의 틀을 부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다. 국가와 법을 \'사회심리\'에 기초지우고, 理法을 제정법 보다 강조한 그의 방법론은 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주163) [270]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보다 \'입헌주의\'적인 해석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일본 부르죠아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다. 혹은 역으로 일본 부르죠아지의 성장이 미노베 헌법 사상의 출현과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시사문제에 대한 평론집들의 제목이 「批判」에서 「評論」으로 그리고 다시 「檢討」로 바뀌어 간 것은, 바로 그러한 일본 부르죠아지의 성장에 따른 권력의 성질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163) 美濃部의 이러한 방법론은, 국권이 단지 국가법에 의해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법에 의해서도 제한된다고 한 美濃部의 학설은, 독일적 법치국 사상의 논리적 발전의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국가라고 해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인권의 우월을 주장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고전적 부르죠아민주주의 헌법 사상의 영향 아래 도출된 것은 아닐까(家永三郞, 『美濃部達吉の思想史的硏究』, 岩波書店, 1964, 199면.)라고 하는 무리한 평가를 끌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_ 그러나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단순히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이라고 평가될 수만은 없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존의 평가는 그러한 요소들을 미노베 憲法思想의 \'限界\'로서 설명해 왔다. 미노베 헌법사상의 憲法解釋學的 한계에 대한 지적주164) 과 미노베의 사회적 신분적 한계에 대한 지적주165) 이 그것이다. 미노베의 방법론이 옐리네크의 \'사실의 규범력\'을 받아 들이고, 법발견을 중시함으로써, 때로 실정법의 틀을 부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는 했지만, 미노베의 憲法思想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大日本帝國憲法」이라고 하는 실정헌법에 대한 \'해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그 \'해석\'의 텍스트, 즉 기본적으로 군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며, 게다가 神話에 그 근거를 가지는 天皇=國體라고 하는 원리를 핵으로 하는 「大日本帝國憲法」에 의해 \'한계\' 지워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미노베는 \"국가의 須要에 응하는 學術技藝를 敎授하고 그 蘊奧를 考究하는 것을 목적으로\"주166) 하는 \'帝國大學\'의 교수였으며, 천[271] 황제 절대주의의 관료를 뽑는 高等文官試驗의 위원이었으며, 정부의 관료와 貴族院의 議員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미노베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또한 그의 헌법사상에 일정한 \'한계\'로서 작용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주164) 奧平康弘, 「美濃部憲法學の方法と視點」, 『法律時報』, 40-11, 1968. 10., 5-6면 또한 제飼信成, (註 98), 179면도 참조.
주165) 鈴木安藏, 『憲法の歷史的硏究』, 大畑書店, 1933, 429면 참조.
주166) 「帝國大學令」(勅令 제3호), 1886. 3. 1.
_ 그러나 미노베의 헌법사상에는 이러한 사상 외재적인 \'한계\' 이외에, 그 헌법사상 전체와, 따라서 동시에 그러한 \'한계\'까지도 규정한 사상 내재적인 \'핵심\'이 있었다. 이 논문의 분석은 미노베 헌법사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에게도 절대가치였던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가치에 의해 근원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라는 점을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신비적인 원리가 미노베에게도 절대가치로서 그의 전 헌법사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의 \'입헌주의\'는 바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점에서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호즈미 우에스기의 헌법사상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國體의 護持\'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_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절대가치에 의한 피규정성은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서도 나타난다.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노베에 의한 수용에서조차도, 그것은 철저하게 \'日本化\'된 것이었다.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은 \'사회심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장으로 변질되었다. 그것은 원래 반입헌주의적인 「大日本帝國憲法」을 입헌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헌법적이자 동시에 초헌법적인 존재인 天皇=國體라고 하는 가치를 설명해 내기 위해 \'사회심리\'라고 하는 정당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도 그대로는 수용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국가의 자기구속 이외에 천황의 자기구속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심리\'라고 하는 자연법에 의해 국가는 그 절대의 위치[272] 에서부터 끌어 내려졌다. 그것 또한 헌법적인 동시에 초헌법적인 존재인 天皇=國體라고 하는 가치를 전제한 때문이었다. 나아가 마찬가지 이유에서 옐리네크의 입헌주의는 그것과 원리적으로 상충되는 天皇=國體라고 하는 일본적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요컨대,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양 헌법사상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용과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절대가치에 의한 근원적인 규정에 의한 \'일본화\'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_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그 입헌주의적인 외견에도 불구하고, 결코 입헌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기껏해야 \'일본적인 입헌주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노베 입헌주의의 실체는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신비적인 반입헌주의적인 절대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동시에 그 절대가치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천황제 절대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다.
주163) 美濃部의 이러한 방법론은, 국권이 단지 국가법에 의해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법에 의해서도 제한된다고 한 美濃部의 학설은, 독일적 법치국 사상의 논리적 발전의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국가라고 해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인권의 우월을 주장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고전적 부르죠아민주주의 헌법 사상의 영향 아래 도출된 것은 아닐까(家永三郞, 『美濃部達吉の思想史的硏究』, 岩波書店, 1964, 199면.)라고 하는 무리한 평가를 끌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_ 그러나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단순히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이라고 평가될 수만은 없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존의 평가는 그러한 요소들을 미노베 憲法思想의 \'限界\'로서 설명해 왔다. 미노베 헌법사상의 憲法解釋學的 한계에 대한 지적주164) 과 미노베의 사회적 신분적 한계에 대한 지적주165) 이 그것이다. 미노베의 방법론이 옐리네크의 \'사실의 규범력\'을 받아 들이고, 법발견을 중시함으로써, 때로 실정법의 틀을 부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는 했지만, 미노베의 憲法思想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大日本帝國憲法」이라고 하는 실정헌법에 대한 \'해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그 \'해석\'의 텍스트, 즉 기본적으로 군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며, 게다가 神話에 그 근거를 가지는 天皇=國體라고 하는 원리를 핵으로 하는 「大日本帝國憲法」에 의해 \'한계\' 지워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미노베는 \"국가의 須要에 응하는 學術技藝를 敎授하고 그 蘊奧를 考究하는 것을 목적으로\"주166) 하는 \'帝國大學\'의 교수였으며, 천[271] 황제 절대주의의 관료를 뽑는 高等文官試驗의 위원이었으며, 정부의 관료와 貴族院의 議員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미노베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또한 그의 헌법사상에 일정한 \'한계\'로서 작용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주164) 奧平康弘, 「美濃部憲法學の方法と視點」, 『法律時報』, 40-11, 1968. 10., 5-6면 또한 제飼信成, (註 98), 179면도 참조.
주165) 鈴木安藏, 『憲法の歷史的硏究』, 大畑書店, 1933, 429면 참조.
주166) 「帝國大學令」(勅令 제3호), 1886. 3. 1.
_ 그러나 미노베의 헌법사상에는 이러한 사상 외재적인 \'한계\' 이외에, 그 헌법사상 전체와, 따라서 동시에 그러한 \'한계\'까지도 규정한 사상 내재적인 \'핵심\'이 있었다. 이 논문의 분석은 미노베 헌법사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에게도 절대가치였던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가치에 의해 근원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라는 점을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신비적인 원리가 미노베에게도 절대가치로서 그의 전 헌법사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의 \'입헌주의\'는 바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점에서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호즈미 우에스기의 헌법사상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國體의 護持\'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_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절대가치에 의한 피규정성은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서도 나타난다.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노베에 의한 수용에서조차도, 그것은 철저하게 \'日本化\'된 것이었다.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은 \'사회심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장으로 변질되었다. 그것은 원래 반입헌주의적인 「大日本帝國憲法」을 입헌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헌법적이자 동시에 초헌법적인 존재인 天皇=國體라고 하는 가치를 설명해 내기 위해 \'사회심리\'라고 하는 정당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도 그대로는 수용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국가의 자기구속 이외에 천황의 자기구속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심리\'라고 하는 자연법에 의해 국가는 그 절대의 위치[272] 에서부터 끌어 내려졌다. 그것 또한 헌법적인 동시에 초헌법적인 존재인 天皇=國體라고 하는 가치를 전제한 때문이었다. 나아가 마찬가지 이유에서 옐리네크의 입헌주의는 그것과 원리적으로 상충되는 天皇=國體라고 하는 일본적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요컨대,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양 헌법사상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용과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절대가치에 의한 근원적인 규정에 의한 \'일본화\'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_ 미노베의 헌법사상은 그 입헌주의적인 외견에도 불구하고, 결코 입헌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기껏해야 \'일본적인 입헌주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노베 입헌주의의 실체는 天皇=國體=國家라고 하는 신비적인 반입헌주의적인 절대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동시에 그 절대가치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천황제 절대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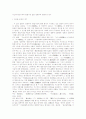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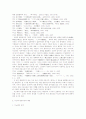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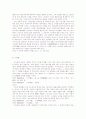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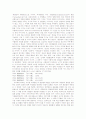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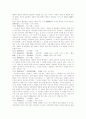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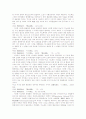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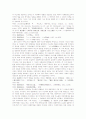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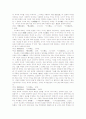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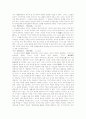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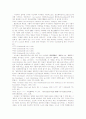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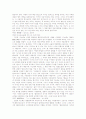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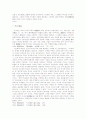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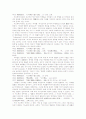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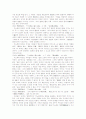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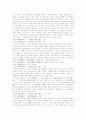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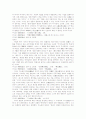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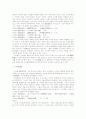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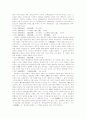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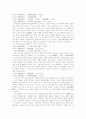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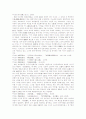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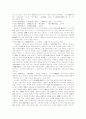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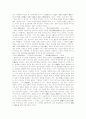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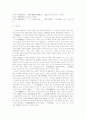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