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지눌의 정혜결사운동
1. 시대적 배경과 정혜결사운동의 전개
2. 정혜결사운동의 이념과 성격
Ⅲ. 소태산의 불교개혁운동
1. 시대적 배경과 불교개혁운동의 전개
2. 불교개혁운동의 이념과 성격
Ⅳ. 정혜결사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의 의의
Ⅱ. 지눌의 정혜결사운동
1. 시대적 배경과 정혜결사운동의 전개
2. 정혜결사운동의 이념과 성격
Ⅲ. 소태산의 불교개혁운동
1. 시대적 배경과 불교개혁운동의 전개
2. 불교개혁운동의 이념과 성격
Ⅳ. 정혜결사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의 의의
본문내용
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물질개벽의 상황이 우리의 정신을 통해 활용하여야 할 문제이지, 우리의 정신이 그에 맞추어 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눌과 소태산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시대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보편의 문제에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修心과 정신개벽이란 동일한 형태로 밝힌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들이 운동에서 보이는 다양한 포용력도 배워야 한다. 현대에 있어서도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체계는 불교 수행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사은·사요·삼학·팔조의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행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왜 보조와 대종사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점은 바로 정혜결사운동과 불교개혁운동으로 나타난 바로 그 결사정신·개혁정신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 두 운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첫째, 구도자적 삶의 태도이다. 지눌과 소태산의 삶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철저한 구도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운동 또한 이런 구도자적 삶의 자연스런 결과물일 뿐이다. 필자는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道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언어에서 「된사람」, 「못된 놈」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평가가 단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실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이 둘이 아닌 세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삶의 가치를 현실지향적인 가치-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개인주의-를 우위로 하는 서구적인 영향으로 인해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과 도덕의 조화를 꾀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지눌과 소태산의 구도자적인 삶의 자세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닦는 길에 있다는 점이다. 지눌에게 있어 定慧를 같이 닦자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닦자는 것이다. 소태산에 있어서 「등상불 숭배를 불성일원상으로」 바꾸자는 의미는 부처는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 마음을 닦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법을 구하는 수행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음을 닦는 일을 근본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근본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해답이 여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 현재 자신의 삶에 요청되는 모순을 철저히 제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다.
지눌은 그의 깨침에 바탕하여 고려시대의 인간과 그가 몸담고 있는 불교계의 문제를 직시하여 당시의 구태와 모순을 제거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결사의 운동을 펼쳤다. 소태산 대종사 또한 그의 깨침에 바탕하여 당시의 구태와 모순을 제거할 불교개혁운동 즉 원불교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는 바로 현재 자신의 삶에 요청되는 제반 모순을 철저하게 고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점이다. 넷째, 깨침과 자비의 통일적 정신이다. 지눌과 소태산의 결사 개혁정신은 바로 깨침에 그치지 않고 동체자비(同體慈悲)의 실천행을 일생을 통하여 구현했다는 점에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 진리와 삶이 하나되는 길의 제시, 그리고 진리의 길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을 펼친 이들의 삶의 태도야 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지눌은 그의 깨침에 바탕하여 고려시대의 인간과 그가 몸담고 있는 불교계의 문제를 직시하여 당시의 구태와 모순을 제거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결사의 운동을 펼쳤다. 소태산 대종사 또한 그의 깨침에 바탕하여 당시의 구태와 모순을 제거할 불교개혁운동 즉 원불교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는 바로 현재 자신의 삶에 요청되는 제반 모순을 철저하게 고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점이다. 넷째, 깨침과 자비의 통일적 정신이다. 지눌과 소태산의 결사 개혁정신은 바로 깨침에 그치지 않고 동체자비(同體慈悲)의 실천행을 일생을 통하여 구현했다는 점에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 진리와 삶이 하나되는 길의 제시, 그리고 진리의 길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을 펼친 이들의 삶의 태도야 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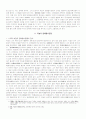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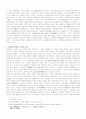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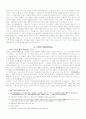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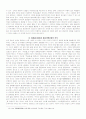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