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창조의 동인
1-1.천재
1-2.영감
2.창작활동
3.예술과 창조성
1-1.천재
1-2.영감
2.창작활동
3.예술과 창조성
본문내용
법칙과 규칙에 종속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술은 \"규칙에 따라 사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두 가지 실례를 보면 예술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태도가 분명해질 것이다. 예컨대 음악에는 자유가 없었다. 멜로디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특히나 의식 및 여흥을 위한 음악은 더했다. 그리고 음악에는 법칙이란 뜻의 nomoi \'νoμοι\'라는 것이 있었다. 또 시각예술에는 폴리클레이토스가 인간적 구조를 위해 확립된 비례에 의해 예술가들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유일하게 적절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의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canon, χαννν\'이라 칭했다. 이 카논이라는 명칭은 척도라는 의미이다. 이론상으로도 마찬가지였는데,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그것 자체로 아름답다\"고 썼다. 그리고 《타마에오스》에서는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모델에 대하여 숙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예술은 때때로 감각적인 미의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진리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예외였다. 시에 해당하는 희랍어인 \'포이에시스\'(ποιησιc)는 포이에인(만들다)에서 파생되었다. 시인(포이에테스)은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시인을 예술가와 연관 짓지도 않았고 시를 예술과 연결 짓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시인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즉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고, 법칙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창조성\' 및 \'창조자\'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없었지만, 사실상 시인은 창조하는 자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17세기의 폴란드 시인이자 시 이론가인 사르비에브스키(K. M. Sarbiewski)는 \"시인은 고안하며 양식을 만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란 표현을 사용하여 시인은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했다. \'창조자\'란 표현은 이 때 나타났으나, 여기에서도 창조성은 시만이 가지는 절대적 특권이었다. 즉, 창조성이란 예술가들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예술들은 단지 모방하고 복사할 뿐, 창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의 출처가 되는 재료와 주제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17세기말에 이르러 펠리비엥(A. Felibien)은 화가를 \"창조자\"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화가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만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는 소위 그것들의 창조자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창조성의 개념은 예술이론에서 한층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며, 이것은 창조성의 개념이 당시 만연하던 상상력의 개념과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세기에 비로소 이 용어는 예술의 언어가 되었다. 19세기의 창조성은 예술만이 가지는 절대적 속성이 되어, 창조자는 예술가와 동의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창조자\'라는 표현이 인간문화 전체에 적용되어 \'학문에서의 창조성\', \'창조적 정치가들\', \'새로운 기술문명의 창조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가지 실례를 보면 예술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태도가 분명해질 것이다. 예컨대 음악에는 자유가 없었다. 멜로디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특히나 의식 및 여흥을 위한 음악은 더했다. 그리고 음악에는 법칙이란 뜻의 nomoi \'νoμοι\'라는 것이 있었다. 또 시각예술에는 폴리클레이토스가 인간적 구조를 위해 확립된 비례에 의해 예술가들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유일하게 적절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의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canon, χαννν\'이라 칭했다. 이 카논이라는 명칭은 척도라는 의미이다. 이론상으로도 마찬가지였는데,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그것 자체로 아름답다\"고 썼다. 그리고 《타마에오스》에서는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모델에 대하여 숙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예술은 때때로 감각적인 미의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진리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예외였다. 시에 해당하는 희랍어인 \'포이에시스\'(ποιησιc)는 포이에인(만들다)에서 파생되었다. 시인(포이에테스)은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시인을 예술가와 연관 짓지도 않았고 시를 예술과 연결 짓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시인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즉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고, 법칙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창조성\' 및 \'창조자\'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없었지만, 사실상 시인은 창조하는 자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17세기의 폴란드 시인이자 시 이론가인 사르비에브스키(K. M. Sarbiewski)는 \"시인은 고안하며 양식을 만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란 표현을 사용하여 시인은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했다. \'창조자\'란 표현은 이 때 나타났으나, 여기에서도 창조성은 시만이 가지는 절대적 특권이었다. 즉, 창조성이란 예술가들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예술들은 단지 모방하고 복사할 뿐, 창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의 출처가 되는 재료와 주제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17세기말에 이르러 펠리비엥(A. Felibien)은 화가를 \"창조자\"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화가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만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는 소위 그것들의 창조자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창조성의 개념은 예술이론에서 한층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며, 이것은 창조성의 개념이 당시 만연하던 상상력의 개념과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세기에 비로소 이 용어는 예술의 언어가 되었다. 19세기의 창조성은 예술만이 가지는 절대적 속성이 되어, 창조자는 예술가와 동의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창조자\'라는 표현이 인간문화 전체에 적용되어 \'학문에서의 창조성\', \'창조적 정치가들\', \'새로운 기술문명의 창조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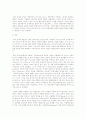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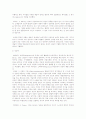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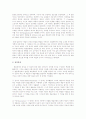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