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2. 고려전기의 사학의 발달
1) 사학의 기원과 12도의 발전
2) 사학 발달의 시대적 배경
3) 9재의 성격문제
3. 고려후기의 사학의 변천
1) 몽고 침략 이전의 사학12도
2) 사학12도와 하과의 부활
3) 사학12도의 관학화
4, 사학 12도의 역사적 의의
4. 結
2. 고려전기의 사학의 발달
1) 사학의 기원과 12도의 발전
2) 사학 발달의 시대적 배경
3) 9재의 성격문제
3. 고려후기의 사학의 변천
1) 몽고 침략 이전의 사학12도
2) 사학12도와 하과의 부활
3) 사학12도의 관학화
4, 사학 12도의 역사적 의의
4. 結
본문내용
의 명맥은 문관의 사숙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문헌공도 등 12도의 출현은 서당 수준의 사학교육을 徒라고 하는 多衆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교육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고려 전기 文運興隆(문운흥륭)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 이는 결국 관학인 국자감의 침체를 가져와 국자감 무용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동아시아 유일의 중세 대학 전통을 세웠다는 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전제 왕권이 성립되어 교육은 관학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서원 등 사학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1~2대를 지나면 본래의 설립 목적인 교학 기능은 쇠퇴하고, 부수적인 선유에 대한 향사 기능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반면에 고려의 사학은 동양적 특수성 하에서도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성립하여(후기에 내려오면서 관학화되었지만) 그 고려가 망할 때까지 340여년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4. 結
사학12도는 고려사회가 귀족화의 성향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성향에 부합하여 나타난 교육제도였다. 고려사회는 나말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성장한 호족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성장 발달하였고 그 배경은 바로 신라적 전통에서 배양된 지식계급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태조때는 전국에 산재한 지식계급들을 선용하였고 광종대에는 과거제를 운용하였다.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관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인재배양의 필요성을 국가적 측면에서 절감하게 되고 이로서 국자감이 설립하게 된다. 성종대의 국자감은 입학자격에 많은 융통성이 있었고 그 문호는 전국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종이후 고려사회는 귀족화의 성향으로 변질되면서 귀족자제들은 국자감이란 보편적 교육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과거와 직결되는 특수교육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누대의 유종이며, 숭앙받던 최충이 사숙을 열었을 때 귀족자제들이 운집하였을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이들 사학의 발달은 결과적으로는 국자감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2도가 정착된 얼마후인 숙종7년에는 국자감 폐지 건의론이 나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예종은 국자감 중흥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한 왕으로 크게 주목된다. 그는 재위중에 국학7재의 실시, 국자감 건물의 준공, 삼사제도의 실시, 양현고의 설립 등의 정책을 취하였지만, 그중 특기할만한 것은 동왕 5년에 발표되고 있는 \'과거판문\'에서. \"製述明經新擧者 屬國子臨三年\"이란 규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직접 응시할 수 있었던 12도유생이나 기타 문벌자제들도 국자감에 예속하여 3년동안 수학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서 사학12도에게 큰 타격을 가져왔다. 이로써 사학12도는 종래의 대학적 위치에서 국자감에 예속되는 하위적 위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고려말에는 그 지위가 더욱 격하되어 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공양왕 2년에 동서학당이 오부학당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에 흡수되어 다음해는 마침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동아시아 유일의 중세 대학 전통을 세웠다는 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전제 왕권이 성립되어 교육은 관학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서원 등 사학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1~2대를 지나면 본래의 설립 목적인 교학 기능은 쇠퇴하고, 부수적인 선유에 대한 향사 기능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반면에 고려의 사학은 동양적 특수성 하에서도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성립하여(후기에 내려오면서 관학화되었지만) 그 고려가 망할 때까지 340여년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4. 結
사학12도는 고려사회가 귀족화의 성향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성향에 부합하여 나타난 교육제도였다. 고려사회는 나말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성장한 호족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성장 발달하였고 그 배경은 바로 신라적 전통에서 배양된 지식계급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태조때는 전국에 산재한 지식계급들을 선용하였고 광종대에는 과거제를 운용하였다.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관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인재배양의 필요성을 국가적 측면에서 절감하게 되고 이로서 국자감이 설립하게 된다. 성종대의 국자감은 입학자격에 많은 융통성이 있었고 그 문호는 전국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종이후 고려사회는 귀족화의 성향으로 변질되면서 귀족자제들은 국자감이란 보편적 교육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과거와 직결되는 특수교육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누대의 유종이며, 숭앙받던 최충이 사숙을 열었을 때 귀족자제들이 운집하였을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이들 사학의 발달은 결과적으로는 국자감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2도가 정착된 얼마후인 숙종7년에는 국자감 폐지 건의론이 나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예종은 국자감 중흥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한 왕으로 크게 주목된다. 그는 재위중에 국학7재의 실시, 국자감 건물의 준공, 삼사제도의 실시, 양현고의 설립 등의 정책을 취하였지만, 그중 특기할만한 것은 동왕 5년에 발표되고 있는 \'과거판문\'에서. \"製述明經新擧者 屬國子臨三年\"이란 규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직접 응시할 수 있었던 12도유생이나 기타 문벌자제들도 국자감에 예속하여 3년동안 수학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서 사학12도에게 큰 타격을 가져왔다. 이로써 사학12도는 종래의 대학적 위치에서 국자감에 예속되는 하위적 위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고려말에는 그 지위가 더욱 격하되어 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공양왕 2년에 동서학당이 오부학당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에 흡수되어 다음해는 마침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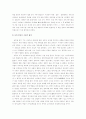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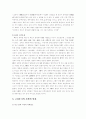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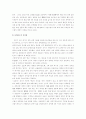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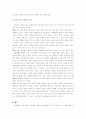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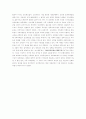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