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으며, 각면 양 우주 사이에 2매의 벽판석을 세워 8매석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판석을 얹고 옥개석을 받고 있다. 우주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배흘림(엔타시스) 수법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얇고 넓으며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옥개받침에서 모를 없애 목조건축물의 두공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상륜부는 5층 옥개석 위에 노반석이 남아 있을 뿐 다른 부재는 없으며 찰주공이 노반을 뚫고 옥개석까지 이르고 있다. 작은 석재를 많이 사용하여 만들어 이 탑이 목조건축을 모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체감률이 알맞고 안정감이 있는 격조높은 탑(높이 약 8.3m)이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트린 후에 새겨놓은 기공문(紀功文).
정림사지 석불좌상
정림사는 백제의 부여천도(扶餘遷都) 즈음인 6세기 중엽(中葉)에 처음 창건되어 백제(百濟) 멸망 때까지 번창하였던 사찰이었고, 그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다시 번창했다. 백제 때의 번창을 알려주는 것이 석탑(石塔)이라면 고려 때의 번성을 보여주는 것이 보물 제 1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불좌상이다. 현재의 머리와 갓은 후대(後代)의 것이며, 신체는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좁아진 어깨와 가슴으로 올라간 두 손의 표현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인 것이 확실하다. 불상에 비해서 대좌(臺座)는 잘 남아 있는데, 상대(上臺)는 앙련(仰蓮)이 조각되었지만 마멸과 파손이 심하고, 중대(中臺)의 8각간석(八角竿石)은 각면에 큼직한 안상(眼象)이 표현되었으며, 하대(下臺)는 3중(三重)으로 복련(覆蓮), 안상(眼象)을 새긴 각면이 중첩되어 복잡하면서도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뛰어난 8각대좌(八角臺座)라 하겠다. 이 불상과 대좌는 강당(講堂)의 주존(主尊)으로 생각되는데, 명문(銘文)기와로 보아 1025년경의 중창 때 조성된 불상으로 11세기 중엽의 만복사(萬福寺) 대좌(臺座)나 불상과 함께 11세기 고려(高麗) 불상양식(佛像樣式)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첫째날 답사를 마친 소감
첫째날에 인상깊었던 유물·유적들은 서산마애삼존불과, 개심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이었다. 국사책으로만 감상하던 서산마애삼존불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되니 돌로된 부처가 살아있는 이웃인 듯 푸근하게 다가왔다. 개심사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요즘 유명한 사찰들 모두 새로 단청을 칠하는 등 인간의 손때가 많이 묻었는데 개심사는 마음이 깨끗해질 것처럼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건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그 웅장한 크기와 안정감에 왠지 모를 중압감 같은게 느껴 졌다. 위로 치솟는 듯한 백제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유홍준,『나의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199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충남』, 돌배게, 1995.
이형권, 『문화유산을 찾아서』, 매일경제 신문사, 1993.
한철희, 『답사여행의 길잡이』, 돌베개, 200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 돌베개, 2001.
최원수, 『명찰순례』, 대원사, 1994.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트린 후에 새겨놓은 기공문(紀功文).
정림사지 석불좌상
정림사는 백제의 부여천도(扶餘遷都) 즈음인 6세기 중엽(中葉)에 처음 창건되어 백제(百濟) 멸망 때까지 번창하였던 사찰이었고, 그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다시 번창했다. 백제 때의 번창을 알려주는 것이 석탑(石塔)이라면 고려 때의 번성을 보여주는 것이 보물 제 1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불좌상이다. 현재의 머리와 갓은 후대(後代)의 것이며, 신체는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좁아진 어깨와 가슴으로 올라간 두 손의 표현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인 것이 확실하다. 불상에 비해서 대좌(臺座)는 잘 남아 있는데, 상대(上臺)는 앙련(仰蓮)이 조각되었지만 마멸과 파손이 심하고, 중대(中臺)의 8각간석(八角竿石)은 각면에 큼직한 안상(眼象)이 표현되었으며, 하대(下臺)는 3중(三重)으로 복련(覆蓮), 안상(眼象)을 새긴 각면이 중첩되어 복잡하면서도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뛰어난 8각대좌(八角臺座)라 하겠다. 이 불상과 대좌는 강당(講堂)의 주존(主尊)으로 생각되는데, 명문(銘文)기와로 보아 1025년경의 중창 때 조성된 불상으로 11세기 중엽의 만복사(萬福寺) 대좌(臺座)나 불상과 함께 11세기 고려(高麗) 불상양식(佛像樣式)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첫째날 답사를 마친 소감
첫째날에 인상깊었던 유물·유적들은 서산마애삼존불과, 개심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이었다. 국사책으로만 감상하던 서산마애삼존불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되니 돌로된 부처가 살아있는 이웃인 듯 푸근하게 다가왔다. 개심사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요즘 유명한 사찰들 모두 새로 단청을 칠하는 등 인간의 손때가 많이 묻었는데 개심사는 마음이 깨끗해질 것처럼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건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그 웅장한 크기와 안정감에 왠지 모를 중압감 같은게 느껴 졌다. 위로 치솟는 듯한 백제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유홍준,『나의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199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충남』, 돌배게, 1995.
이형권, 『문화유산을 찾아서』, 매일경제 신문사, 1993.
한철희, 『답사여행의 길잡이』, 돌베개, 200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 돌베개, 2001.
최원수, 『명찰순례』, 대원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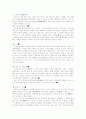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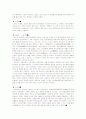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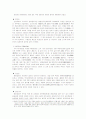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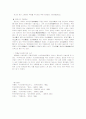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