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글과 생각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서경식, 제4강)를 읽고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 요약
1-2.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
1)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
2) 정치적·사회적 의미
1-3. 시사점
2. 김현의 글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제3강)에 서술된 문학의 변모 양상을 정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1.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김현, 제3강) ? 문학의 변모 양상 정리
2-2. 오늘날 문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12강)에서 언급한 공통 논제들을 비교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1.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공통 논제 정리
3-2.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13강)에 실려 있는 두 편의 글에 나타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4-1. 공통점
4-2. 차이점
4-3. 본인의 생각
5. 참고문헌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서경식, 제4강)
1-1. 요약
서경식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저자의 자전적 성찰과 사회비판이 담긴 에세이로, 일본 사회에서의 주변화된 존재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제목에 등장하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가 남긴 깊은 상처와 그 자리에 고여 있는 비주류 존재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때 "붕어"는 그 고인 물 속에서도 살아남아 고통과 침묵 속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을 상징한다.
작품은 여러 일화를 통해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사회로부터 지워지고 잊히는지를 보여준다. 서경식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일본인처럼 살아가기를 강요받지만 동시에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다. 그는 재일조선인이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 식민 지배의 잔재이며, 일제강점기의 결과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된 ‘역사의 증인’임을 강조한다.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서경식, 제4강)를 읽고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 요약
1-2.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
1) 재일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
2) 정치적·사회적 의미
1-3. 시사점
2. 김현의 글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제3강)에 서술된 문학의 변모 양상을 정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1.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김현, 제3강) ? 문학의 변모 양상 정리
2-2. 오늘날 문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12강)에서 언급한 공통 논제들을 비교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1.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공통 논제 정리
3-2.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13강)에 실려 있는 두 편의 글에 나타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4-1. 공통점
4-2. 차이점
4-3. 본인의 생각
5. 참고문헌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서경식, 제4강)
1-1. 요약
서경식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저자의 자전적 성찰과 사회비판이 담긴 에세이로, 일본 사회에서의 주변화된 존재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제목에 등장하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가 남긴 깊은 상처와 그 자리에 고여 있는 비주류 존재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때 "붕어"는 그 고인 물 속에서도 살아남아 고통과 침묵 속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을 상징한다.
작품은 여러 일화를 통해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사회로부터 지워지고 잊히는지를 보여준다. 서경식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일본인처럼 살아가기를 강요받지만 동시에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다. 그는 재일조선인이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 식민 지배의 잔재이며, 일제강점기의 결과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된 ‘역사의 증인’임을 강조한다.
본문내용
지역적 언어로 보며 표준어 중심의 언어관을 강조한다. 이는 표준어의 우월성 혹은 보편성을 전제한다.
반면 두 번째 글은 이러한 시각에 비판적이다. 표준어 중심주의가 방언 사용자에게 열등감을 유도하고, 언어적 위계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표준어 정책에 대한 입장
첫 번째 글은 국가 차원의 언어 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규범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표준어 교육은 사회 통합과 효율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본다.
두 번째 글은 오히려 이러한 국가 중심의 표준화 정책이 언어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방언 또한 동등한 언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사회적 통합 vs 언어적 다양성의 우선순위
전자는 의사소통 효율성, 교육적 표준화, 행정 일관성 등 국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자는 언어의 민주성, 자율성, 문화적 다양성을 더 중시하며, 표준어 중심의 언어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4-3. 본인의 생각 (확장본)
현대 사회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또한 동질화되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지역의 역사, 집단의 문화가 응축된 삶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표준어와 방언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① 표준어는 공공성의 언어로, 방언은 정체성의 언어로 기능한다
표준어는 교육, 행정, 방송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한 통일된 언어 체계로서 사회적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언은 단지 ‘표준어가 아닌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말맛, 인간관계를 담고 있는 언어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의 억양이나 전라도 방언의 정서적 뉘앙스는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와 인간미를 담고 있다. 이는 표준어로 대체될 수 없는 문화적 유산이다.
② 방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방언은 때로 교육현장이나 공적 담론에서 ‘틀린 말’이나 ‘지양해야 할 말’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방언 사용자에게 위화감과 열등감을 유도하며, 언어적 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언을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정체성 교육과 연계
방언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언의 가치를 조명하는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③ 언어는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언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어떤 언어가 더 우월하고, 어떤 언어가 덜 세련됐다는 판단은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 편견일 뿐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사회적 포용력과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에 실린 두 글은 표준어 중심의 실용성과 방언의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준다. 나는 표준어와 방언이 대립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공존할 수 있는 언어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언은 사라져야 할 옛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이고, 나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다.
5. 참고문헌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관련
서경식. (2005).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돌베개.
서경식. (2004).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학」, 『창작과비평』, 제31권 1호, pp. 64-82.
조정민. (2016). 「경계인 서경식의 문학적 사유와 정치적 글쓰기」, 『한일문화연구』, 제34호, pp. 147-169.
이지선. (2018).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윤리」, 『일본문화연구』, 제67호, pp. 103-128.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4강: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강의자료].
[2] 김현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 관련
김현. (1999). 말과 시간. 문학과지성사.
김현. (1989). 「문학과 시대정신」, 『현대문학』, 10월호.
유성호. (2015). 「김현 비평의 사회성 고찰: 언어와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3호, pp. 33-56.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3강: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 [강의자료].
[3]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 관련
세종대왕. (1446). 훈민정음 해례본. 고문서 번역본(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참조).
최만리 외. (144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 2월.
주시경. (1995). 국문연구의 선구자. 한글학회.
박재민. (2013). 「훈민정음 창제의 정치적 의미와 문화적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제65권, pp. 87-112.
정광. (2019). 「훈민정음과 정체성: 문자 정책의 시대적 함의」, 『한글』, 제286호, pp. 9-38.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12강: 훈민정음의 탄생과 반대 담론 [강의자료].
[4]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 관련
김형주. (2012). 한국어의 표준어와 방언. 한국문화사.
조항범. (2015). 「표준어와 방언: 언어 정책과 문화적 인식」, 『국어교육연구』, 제45호, pp. 25-50.
최명환. (2018). 「표준어 중심주의의 문제와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 『언어와 사회』, 제133호, pp. 17-39.
윤덕환. (2010). 「방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 『사회언어학』, 제27호, pp. 71-92.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13강: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 [강의자료].
[기타 참고]
유네스코(UNESCO). (1997). The World\'s Writing Systems and Cultural Identity.
전광진. (2003). 언어의 사회학. 민음사.
김경일. (2020).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사유의 역할」, 『문학과사회』, 제127호, pp. 92-117.
반면 두 번째 글은 이러한 시각에 비판적이다. 표준어 중심주의가 방언 사용자에게 열등감을 유도하고, 언어적 위계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표준어 정책에 대한 입장
첫 번째 글은 국가 차원의 언어 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규범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표준어 교육은 사회 통합과 효율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본다.
두 번째 글은 오히려 이러한 국가 중심의 표준화 정책이 언어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방언 또한 동등한 언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사회적 통합 vs 언어적 다양성의 우선순위
전자는 의사소통 효율성, 교육적 표준화, 행정 일관성 등 국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자는 언어의 민주성, 자율성, 문화적 다양성을 더 중시하며, 표준어 중심의 언어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4-3. 본인의 생각 (확장본)
현대 사회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또한 동질화되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지역의 역사, 집단의 문화가 응축된 삶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표준어와 방언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① 표준어는 공공성의 언어로, 방언은 정체성의 언어로 기능한다
표준어는 교육, 행정, 방송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한 통일된 언어 체계로서 사회적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언은 단지 ‘표준어가 아닌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말맛, 인간관계를 담고 있는 언어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의 억양이나 전라도 방언의 정서적 뉘앙스는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와 인간미를 담고 있다. 이는 표준어로 대체될 수 없는 문화적 유산이다.
② 방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방언은 때로 교육현장이나 공적 담론에서 ‘틀린 말’이나 ‘지양해야 할 말’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방언 사용자에게 위화감과 열등감을 유도하며, 언어적 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언을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정체성 교육과 연계
방언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언의 가치를 조명하는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③ 언어는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언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어떤 언어가 더 우월하고, 어떤 언어가 덜 세련됐다는 판단은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 편견일 뿐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사회적 포용력과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에 실린 두 글은 표준어 중심의 실용성과 방언의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준다. 나는 표준어와 방언이 대립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공존할 수 있는 언어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언은 사라져야 할 옛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이고, 나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다.
5. 참고문헌
[1]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관련
서경식. (2005).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돌베개.
서경식. (2004).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학」, 『창작과비평』, 제31권 1호, pp. 64-82.
조정민. (2016). 「경계인 서경식의 문학적 사유와 정치적 글쓰기」, 『한일문화연구』, 제34호, pp. 147-169.
이지선. (2018).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윤리」, 『일본문화연구』, 제67호, pp. 103-128.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4강: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강의자료].
[2] 김현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 관련
김현. (1999). 말과 시간. 문학과지성사.
김현. (1989). 「문학과 시대정신」, 『현대문학』, 10월호.
유성호. (2015). 「김현 비평의 사회성 고찰: 언어와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3호, pp. 33-56.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3강: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 [강의자료].
[3]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 관련
세종대왕. (1446). 훈민정음 해례본. 고문서 번역본(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참조).
최만리 외. (144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 2월.
주시경. (1995). 국문연구의 선구자. 한글학회.
박재민. (2013). 「훈민정음 창제의 정치적 의미와 문화적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제65권, pp. 87-112.
정광. (2019). 「훈민정음과 정체성: 문자 정책의 시대적 함의」, 『한글』, 제286호, pp. 9-38.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12강: 훈민정음의 탄생과 반대 담론 [강의자료].
[4]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 관련
김형주. (2012). 한국어의 표준어와 방언. 한국문화사.
조항범. (2015). 「표준어와 방언: 언어 정책과 문화적 인식」, 『국어교육연구』, 제45호, pp. 25-50.
최명환. (2018). 「표준어 중심주의의 문제와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 『언어와 사회』, 제133호, pp. 17-39.
윤덕환. (2010). 「방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 『사회언어학』, 제27호, pp. 71-92.
오픈사이버대학교. (2024). 현대사회와 사유 제13강: 표준어와 방언의 이해 [강의자료].
[기타 참고]
유네스코(UNESCO). (1997). The World\'s Writing Systems and Cultural Identity.
전광진. (2003). 언어의 사회학. 민음사.
김경일. (2020).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사유의 역할」, 『문학과사회』, 제127호, pp. 9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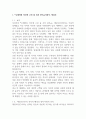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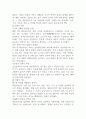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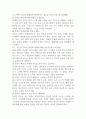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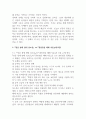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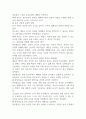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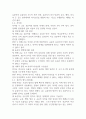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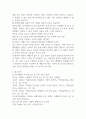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