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언
2. 5세기의 고분벽화
3. 평양시대의 전개와 고구려문화
4. 맺음말
2. 5세기의 고분벽화
3. 평양시대의 전개와 고구려문화
4. 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묵살되었으며, 왕권의 절대화에 반대하던 세력은 중앙권력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새 서울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바다 건너로부터 전해진 중국색 짙은 문화에 익숙했던 평양 일대 문화의 성격도 5세기 중엽을 고비로 바뀌게 되었고, 평양과 안악일대에 자리잡은 고구려 귀족의 관념과 생활에는 불교문화적 빛깔이 깊이 배어들게 되었다. 5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수산리벽화분, 쌍영총, 안악2호분 벽화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불교문화의 영향이 뚜렷이 배어 있다. 생활풍속계 제재가 벽화구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제재 자체가 불교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고구려 귀족 부부의 나들이 장면을 담고 있는 수산리벽화분마저 행렬 위를 가로지르는 창방 위에는 소슬 사이로 활짝 핀 커다란 연꽃이 규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5세기 후반 평양권 고분벽화 구성에서 四神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평양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불교문화가 고분벽화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고분벽화가 5세기 후반 평양시대 문화의 단면을 잘 담아 후세에 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4. 맺 음 말
5세기 고구려 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문자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조각난 자료 사이의 공간을 고분벽화나 고고미술사 분야의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채워 나가는 것도 역사복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실제 고분벽화를 비롯한 고고미술사 자료들은 크던 작던 \'편년\'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더하여 \'고분벽화\'와 같은 관념성 짙은 자료는 보편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래적인 의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작업 역시 그러한 한계를 안고 걸음을 내딛었다. 고분벽화가 관념의 표현이며, 실재와 소망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자료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었다. 특히 벽화고분 편년에 큰 변동이 있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다면 논지의 기본 줄기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역시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고분벽화 자료가 지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평양 천도 뒤, 전성기를 구가하던 5세기 중엽 이후의 고구려사회, 구체적으로는 장수왕 통치 후반기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고구려 문화의 성격은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는 방증자료가 말해 주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새 서울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바다 건너로부터 전해진 중국색 짙은 문화에 익숙했던 평양 일대 문화의 성격도 5세기 중엽을 고비로 바뀌게 되었고, 평양과 안악일대에 자리잡은 고구려 귀족의 관념과 생활에는 불교문화적 빛깔이 깊이 배어들게 되었다. 5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수산리벽화분, 쌍영총, 안악2호분 벽화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불교문화의 영향이 뚜렷이 배어 있다. 생활풍속계 제재가 벽화구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제재 자체가 불교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고구려 귀족 부부의 나들이 장면을 담고 있는 수산리벽화분마저 행렬 위를 가로지르는 창방 위에는 소슬 사이로 활짝 핀 커다란 연꽃이 규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5세기 후반 평양권 고분벽화 구성에서 四神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평양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불교문화가 고분벽화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고분벽화가 5세기 후반 평양시대 문화의 단면을 잘 담아 후세에 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4. 맺 음 말
5세기 고구려 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문자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조각난 자료 사이의 공간을 고분벽화나 고고미술사 분야의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채워 나가는 것도 역사복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실제 고분벽화를 비롯한 고고미술사 자료들은 크던 작던 \'편년\'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더하여 \'고분벽화\'와 같은 관념성 짙은 자료는 보편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래적인 의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작업 역시 그러한 한계를 안고 걸음을 내딛었다. 고분벽화가 관념의 표현이며, 실재와 소망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자료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었다. 특히 벽화고분 편년에 큰 변동이 있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다면 논지의 기본 줄기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역시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고분벽화 자료가 지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평양 천도 뒤, 전성기를 구가하던 5세기 중엽 이후의 고구려사회, 구체적으로는 장수왕 통치 후반기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고구려 문화의 성격은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는 방증자료가 말해 주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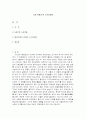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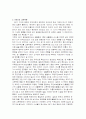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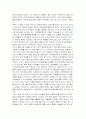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