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작품 형성 배경 - 남성훼절 모티브
2.1 남성훼절소설의 개념과 서사구조
2.2 남성훼절소설의 갈래와 사적 전개
2.3 남성훼절소설의 사적 전개에 따른 의미의 변모
2.4 사회사적 맥락에서 본 남성훼절소설의 의미
3. 작품 분석
3.1 프롤로그 검토
3.2 풍자구조․인물구조․서사구조
3.2.1 ‘이춘풍-활량패’ 와 ‘이춘풍-두 기생’ 의 풍자구조
3.2.1.2 ‘이춘풍-두 기생’ 의 풍자구조
3.2.1.1 ‘이춘풍-활량패’의 풍자구조
3.2.2 ‘훼절 대상자-훼절 음모자-훼절 음모수행자’ 의 인물구조
3.2.3 변증법적 서사구조
3.3 작자의식 및 주제
3.3.1 현실주의적 작자의식
3.3.2 주제
3.4 소설사적 위치
4. 맺음말
2. 작품 형성 배경 - 남성훼절 모티브
2.1 남성훼절소설의 개념과 서사구조
2.2 남성훼절소설의 갈래와 사적 전개
2.3 남성훼절소설의 사적 전개에 따른 의미의 변모
2.4 사회사적 맥락에서 본 남성훼절소설의 의미
3. 작품 분석
3.1 프롤로그 검토
3.2 풍자구조․인물구조․서사구조
3.2.1 ‘이춘풍-활량패’ 와 ‘이춘풍-두 기생’ 의 풍자구조
3.2.1.2 ‘이춘풍-두 기생’ 의 풍자구조
3.2.1.1 ‘이춘풍-활량패’의 풍자구조
3.2.2 ‘훼절 대상자-훼절 음모자-훼절 음모수행자’ 의 인물구조
3.2.3 변증법적 서사구조
3.3 작자의식 및 주제
3.3.1 현실주의적 작자의식
3.3.2 주제
3.4 소설사적 위치
4. 맺음말
본문내용
에서 그러한 가치관의 동요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결국 남성훼절소설은 규범의 무조건적 준행을 주장하는 주인공과, 규범의 신축적 적용을 주장하는 훼절 음모자간의 관점 대립을 통해 조선후기 가치관의 동요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규범을 맹신하는 주인공들은 규범에 어긋나는 사회 관행을 부도덕한 것으로 비판하는 반면, 규범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훼절 음모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비판하는 등 두 관점은 팽팽히 맞서 있다. 이 중 남성훼절소설에서 궁극적으로 긍정되는 것은 후자의 입장이며, 이는 교조화된 규범들이 당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데 차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3. 작품 분석
3.1 프롤로그 검토
「삼선기」는 본격적인 스토리의 전개에 앞서 작중의 사건과는 무관한 오릉 중자의 고사(故事)를 프롤로그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고전소설에서 보기 힘든 구성상의 특이성을 보여 준다. 프롤로그로 제시된 이야기가 비록 작자의 창작이 아닌 고사의 차용이고, 프롤로그로 제시된 이야기는「맹자」에 실려 있는 오릉 중자의 고사와 그대로 일치되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고사전(高士傳)」에 실려 있다고 한다. (孟子, 卷6, 文公章句 下 참조)
분량 역시 얼마 되지 않지만, 「삼선기」는 총 90쪽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데, 이 중 오릉 중자의 고사는 2.5쪽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작품의 작자의식 및 주제를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만큼 「삼선기」를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프롤로그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롤로그를 통해 작자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롤로그로 제시된 오릉 중자의 고사를 실제로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오릉 중자는 명문 집안의 후예로서 형이 만종(萬鍾)의 녹을 받고 있었지만, 세속의 번화하고 화려함이 싫어 오릉땅에 은거하여 곤궁하게 살았다. 자신은 짚신을 삼아 팔고, 아내는 길쌈을 하여 근근이 연명해 갔다. 심한 비바람으로 길이 끊겨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경에 처하게 되어도 도학자의 자세를 흩트리지 않았고, 본가에 돌아와 그 어머니가 주는 고기를 먹다가 형이 남에게 받은 거위 고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불의의 물건이라 하여 모두 토해 버렸다. 맹자가 그를 지렁이[蚓]라고 하였다.
위의 줄거리를 통해 볼 때, 중자(仲子)는 불의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도덕 군자의 삶을 추구했던 인물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중자의 삶에 대한 맹자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자는 중자를 제(齊)나라의 큰 선비로 인정은 하면서도 그가 추구했던 삶은 지렁이나 가능한 것 孟子, 卷6, 文公章句 下.「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爲巨擘焉 雖然 仲子惡能廉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이라고 하여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며, 지렁이처럼 세상과 관계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자의 자세가 비판받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는 그의 결벽증 때문이다. 그는 일상인으로서의 현실적 삶을 무조건 불의시하면서 박제화된 도덕규범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자의 사고가 경직된 것은 그가 도덕규범의 본질적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본말을 혼동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는 ‘청렴’의 참뜻 청렴이란 ‘분별이 있어 구차하게 취하지 않음(廉 有分辨 不苟取也)’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한 ‘빈한(貧寒)’과는 구별된다.(孟子, 卷6, 文公章句 下, 朱子 註 참조).
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청렴과 빈한(貧寒)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한은 청렴한 생활에 수반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인데, 그는 이 둘을 하나로 보아 ‘빈한=청렴’ , ‘부귀=불의’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부형의 부귀를 무조건 불의시하여 그들을 멀리 하면서 스스로 빈궁한 생활을 택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빈천이 무조건 미덕이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부귀 또한 무조건 불의가 될 수 없다 論語, 卷8, 泰伯篇.「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자의 자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일종의 결벽증 내지는 불의에 의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가 부형의 부귀를 무조건 불의시하면서 세속을 피하여 오릉 땅에 은거하는 것이나, 남에게서 받은 것은 거위 한 마리까지도 불의의 물건이라 하여 먹다가 토해 내는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가 부귀는 물론 일상적인 인간의 삶을 부정하면서, 고착된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고 있음이 이를 분명히 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 가치규범의 본질적 뜻을 망각하고, 그 표면적인 자구(字句)의 뜻만을 받아들여 초래된 결과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도덕규범이 오히려 그러한 삶의 실현을 제약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덕규범이 인간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의 삶이 도덕규범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 인간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인간의 현실적 삶을 부정하는 가치규범은 이미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규범이 진정한 존재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토대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도덕규범이 사회의 변화를 외면한 채 자기만의 정당성을 고집하게 되면, 그 규범은 차츰 현실과 괴리된 관념으로 화석화하여 인간의 사고와 감각을 규제하는 도그마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가 오릉 중자의 고사를 프롤로그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극빈한 삶에 자족하며 오직 도덕군자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중자의 삶을 숭고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극히 희화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중자의 삶에 대한 희화적 표현은 두루 발견되는데, 그 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겨오 문밧 움물가에 다 노앗드니 잇 O 요동는 지경에 졍신이 좀 낫든지 엽을 더드머 보니 오얏 열 히 맛참 러
결국 남성훼절소설은 규범의 무조건적 준행을 주장하는 주인공과, 규범의 신축적 적용을 주장하는 훼절 음모자간의 관점 대립을 통해 조선후기 가치관의 동요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규범을 맹신하는 주인공들은 규범에 어긋나는 사회 관행을 부도덕한 것으로 비판하는 반면, 규범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훼절 음모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비판하는 등 두 관점은 팽팽히 맞서 있다. 이 중 남성훼절소설에서 궁극적으로 긍정되는 것은 후자의 입장이며, 이는 교조화된 규범들이 당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데 차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3. 작품 분석
3.1 프롤로그 검토
「삼선기」는 본격적인 스토리의 전개에 앞서 작중의 사건과는 무관한 오릉 중자의 고사(故事)를 프롤로그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고전소설에서 보기 힘든 구성상의 특이성을 보여 준다. 프롤로그로 제시된 이야기가 비록 작자의 창작이 아닌 고사의 차용이고, 프롤로그로 제시된 이야기는「맹자」에 실려 있는 오릉 중자의 고사와 그대로 일치되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고사전(高士傳)」에 실려 있다고 한다. (孟子, 卷6, 文公章句 下 참조)
분량 역시 얼마 되지 않지만, 「삼선기」는 총 90쪽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데, 이 중 오릉 중자의 고사는 2.5쪽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작품의 작자의식 및 주제를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만큼 「삼선기」를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프롤로그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롤로그를 통해 작자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롤로그로 제시된 오릉 중자의 고사를 실제로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오릉 중자는 명문 집안의 후예로서 형이 만종(萬鍾)의 녹을 받고 있었지만, 세속의 번화하고 화려함이 싫어 오릉땅에 은거하여 곤궁하게 살았다. 자신은 짚신을 삼아 팔고, 아내는 길쌈을 하여 근근이 연명해 갔다. 심한 비바람으로 길이 끊겨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경에 처하게 되어도 도학자의 자세를 흩트리지 않았고, 본가에 돌아와 그 어머니가 주는 고기를 먹다가 형이 남에게 받은 거위 고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불의의 물건이라 하여 모두 토해 버렸다. 맹자가 그를 지렁이[蚓]라고 하였다.
위의 줄거리를 통해 볼 때, 중자(仲子)는 불의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도덕 군자의 삶을 추구했던 인물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중자의 삶에 대한 맹자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자는 중자를 제(齊)나라의 큰 선비로 인정은 하면서도 그가 추구했던 삶은 지렁이나 가능한 것 孟子, 卷6, 文公章句 下.「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爲巨擘焉 雖然 仲子惡能廉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이라고 하여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며, 지렁이처럼 세상과 관계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자의 자세가 비판받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는 그의 결벽증 때문이다. 그는 일상인으로서의 현실적 삶을 무조건 불의시하면서 박제화된 도덕규범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자의 사고가 경직된 것은 그가 도덕규범의 본질적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본말을 혼동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는 ‘청렴’의 참뜻 청렴이란 ‘분별이 있어 구차하게 취하지 않음(廉 有分辨 不苟取也)’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한 ‘빈한(貧寒)’과는 구별된다.(孟子, 卷6, 文公章句 下, 朱子 註 참조).
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청렴과 빈한(貧寒)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한은 청렴한 생활에 수반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인데, 그는 이 둘을 하나로 보아 ‘빈한=청렴’ , ‘부귀=불의’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부형의 부귀를 무조건 불의시하여 그들을 멀리 하면서 스스로 빈궁한 생활을 택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빈천이 무조건 미덕이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부귀 또한 무조건 불의가 될 수 없다 論語, 卷8, 泰伯篇.「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자의 자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일종의 결벽증 내지는 불의에 의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가 부형의 부귀를 무조건 불의시하면서 세속을 피하여 오릉 땅에 은거하는 것이나, 남에게서 받은 것은 거위 한 마리까지도 불의의 물건이라 하여 먹다가 토해 내는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가 부귀는 물론 일상적인 인간의 삶을 부정하면서, 고착된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고 있음이 이를 분명히 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 가치규범의 본질적 뜻을 망각하고, 그 표면적인 자구(字句)의 뜻만을 받아들여 초래된 결과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도덕규범이 오히려 그러한 삶의 실현을 제약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덕규범이 인간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의 삶이 도덕규범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 인간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인간의 현실적 삶을 부정하는 가치규범은 이미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규범이 진정한 존재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토대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도덕규범이 사회의 변화를 외면한 채 자기만의 정당성을 고집하게 되면, 그 규범은 차츰 현실과 괴리된 관념으로 화석화하여 인간의 사고와 감각을 규제하는 도그마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가 오릉 중자의 고사를 프롤로그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극빈한 삶에 자족하며 오직 도덕군자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중자의 삶을 숭고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극히 희화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중자의 삶에 대한 희화적 표현은 두루 발견되는데, 그 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겨오 문밧 움물가에 다 노앗드니 잇 O 요동는 지경에 졍신이 좀 낫든지 엽을 더드머 보니 오얏 열 히 맛참 러
추천자료
 올바른 자아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올바른 자아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송대 정통론(正統論)의 형성과 그 내용
송대 정통론(正統論)의 형성과 그 내용 한민족 형성과정의 제문제
한민족 형성과정의 제문제 의약분업에 있어서의 정책형성과정
의약분업에 있어서의 정책형성과정 성경의 형성사
성경의 형성사 1920년대 시 - 현대시의 형성기
1920년대 시 - 현대시의 형성기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나라의 시각비교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나라의 시각비교 송대 신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송대 신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군사혁명과 해적의 탄생 -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함선, 제국을 중...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군사혁명과 해적의 탄생 -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함선, 제국을 중... 톰슨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에 대한 연구 (맑스주의 계급이론)
톰슨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에 대한 연구 (맑스주의 계급이론)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재중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한인의 만주이주배경 & 한인사회의 성격, 일본제국주의의 ...
재중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한인의 만주이주배경 & 한인사회의 성격, 일본제국주의의 ... 궁예 견훤의 세력형성과정과 대신라정책
궁예 견훤의 세력형성과정과 대신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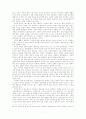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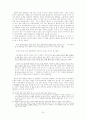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