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1) 귀족사회 정의에 대한 논란
2-2) 문벌귀족의 형성
2-3) 본관제
2-4) 전시과
2-5) 문벌귀족사회의 쇠퇴
3. 결론
2-1) 귀족사회 정의에 대한 논란
2-2) 문벌귀족의 형성
2-3) 본관제
2-4) 전시과
2-5) 문벌귀족사회의 쇠퇴
3. 결론
본문내용
쳐 한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자겸의 난이 그러하다. 이자겸의 난은 인종 대(1122~1146)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인주이씨 가문은 이미 문종 대(1046~1083)부터 외척으로 정권을 장악해 왔다. 누 대에 걸쳐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자 이자겸은 왕위를 노리고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자겸은 난을 일으키면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인종을 자신의 사가(私家)에 위폐 시켰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서 고려 왕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사회는 묘청의 난으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진다. 비록 1년 만에 난이 진압되었으나 묘청이 등장한 인종 6년부터 헤아리면 무려 7년 동안 묘청과 개경 문벌세력간의 알력싸움으로 혼란스러웠다. 묘청의 난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은 서경천도였다. 따라서 서경천도를 주장한 이들은 비단 묘청만 아니라 서경과 인근 지역 출신의 문벌귀족들도 이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경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벌귀족들은 김부식을 위시하여 이들을 진압하고자 한 것이다.
인종 이후 의종은 환관들을 등용하게 되고 다시 이들과 문벌귀족들 간의 알력다툼이 생기자 그 틈을 타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고려 전기 문벌귀족사회는 결정적으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유교적인 소양과 행정력이 부족한 무신들이 문관 직을 차지하면서 성종이후 정비된 관직정치체제 역시 방만히 운영된다. 무신란 이후 비록 문벌귀족들이 중앙정계에서 많이 쫓겨나게 되었으나 최충헌 집권이후 무신정권이 안정되면서 다시 문관들이 등용되면서 문벌귀족들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3. 결론
고려전기 문벌귀족사회는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전국의 지방 세력들을 본관제 등을 통해 지배층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무력적, 정치적 힘을 소유한 호족출신 공신들을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몰아내고 유교적인 소양과 학식을 갖춘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중앙 정치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유지를 거느리고 사회적인 특권을 세습하며 문벌귀족을 이루었다. 성종 연간을 거치면서 중앙 정치기구가 정비되고 문벌귀족사회가 안정되어 갔으나 목종 이후 잇따른 반란과 국왕의 폐위, 거란과의 전란으로 문벌귀족사회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거란과의 전란이 고려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벌귀족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문종 연간에는 전시과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특정가문이 정권을 장기 독점하게 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들이 나타났다. 이자겸의 난으로 촉발된 문벌귀족사회의 내부분쟁은 묘청의 난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종 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고 문관들의 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귀족들은 중앙정치무대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종기,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1985.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박용운, 『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경인문화사, 2003.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사회는 묘청의 난으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진다. 비록 1년 만에 난이 진압되었으나 묘청이 등장한 인종 6년부터 헤아리면 무려 7년 동안 묘청과 개경 문벌세력간의 알력싸움으로 혼란스러웠다. 묘청의 난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은 서경천도였다. 따라서 서경천도를 주장한 이들은 비단 묘청만 아니라 서경과 인근 지역 출신의 문벌귀족들도 이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경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벌귀족들은 김부식을 위시하여 이들을 진압하고자 한 것이다.
인종 이후 의종은 환관들을 등용하게 되고 다시 이들과 문벌귀족들 간의 알력다툼이 생기자 그 틈을 타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고려 전기 문벌귀족사회는 결정적으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유교적인 소양과 행정력이 부족한 무신들이 문관 직을 차지하면서 성종이후 정비된 관직정치체제 역시 방만히 운영된다. 무신란 이후 비록 문벌귀족들이 중앙정계에서 많이 쫓겨나게 되었으나 최충헌 집권이후 무신정권이 안정되면서 다시 문관들이 등용되면서 문벌귀족들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3. 결론
고려전기 문벌귀족사회는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전국의 지방 세력들을 본관제 등을 통해 지배층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무력적, 정치적 힘을 소유한 호족출신 공신들을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몰아내고 유교적인 소양과 학식을 갖춘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중앙 정치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유지를 거느리고 사회적인 특권을 세습하며 문벌귀족을 이루었다. 성종 연간을 거치면서 중앙 정치기구가 정비되고 문벌귀족사회가 안정되어 갔으나 목종 이후 잇따른 반란과 국왕의 폐위, 거란과의 전란으로 문벌귀족사회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거란과의 전란이 고려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벌귀족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문종 연간에는 전시과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특정가문이 정권을 장기 독점하게 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들이 나타났다. 이자겸의 난으로 촉발된 문벌귀족사회의 내부분쟁은 묘청의 난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종 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고 문관들의 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귀족들은 중앙정치무대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종기,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1985.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박용운, 『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경인문화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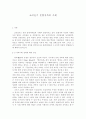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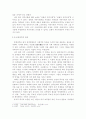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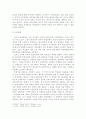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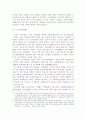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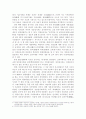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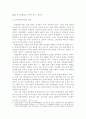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