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혼례(婚禮)
Ⅱ. 혼례의 역사
Ⅲ. 혼례 절차의 종류
Ⅳ. 혼례 절차의 이상형
Ⅴ. 혼례 절차
Ⅰ. 상장례
Ⅱ. 상장례의 역사
Ⅲ. 장례와 상례의 차이점
Ⅳ. 상장례의 절차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참고 문헌
Ⅱ. 혼례의 역사
Ⅲ. 혼례 절차의 종류
Ⅳ. 혼례 절차의 이상형
Ⅴ. 혼례 절차
Ⅰ. 상장례
Ⅱ. 상장례의 역사
Ⅲ. 장례와 상례의 차이점
Ⅳ. 상장례의 절차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地面)과 같은 정도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토라고 한다.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평토제를 지내고 나면, 집사가 영좌(靈座:혼령을 안치하는 장소)를 철거하고 상주는 영여에 혼백을 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 집으로 오거나, 상여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되돌아온다(다른 길로 와야 귀신이 못 따라 온다고 함). 되돌아올 때 상주들은 영여를 뒤따르는데 이를 반혼이라 한다. 집에 돌아오면 안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혼백을 맞이한다. 혼백은 빈소에 모셔진다. 그러면 망자에게 반혼을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이를 반혼제(返魂祭)라 한다. 앞에 주과포혜를 진실하고(차려놓고) 술을 치고 축을 읽고 상주들이 두 번 절한다.
⑩. 기제사(忌祭祀) 기제사: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祭祀
전의 각종의례
영좌를 장지에서 반혼하여 와서 혼백을 다시 모시고 난 후부터 담제(嬉祭)를 지내기 전까지 지내는 각종 제사를 묶어 흉제(凶祭)라 한다. 기제사 지내기 전의 각종 제사는 담제를 지내므로써 보통 끝이 난다.
ㄱ.우제(虞祭)
갓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로 일종의 위령제이다. 우제는 세 번 지내는데, 세 차례 모두 다 그 집안의 기제사 방식(가문에 따라 다름)과 동일하게 지내고 곡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우제(初虞祭)
반혼한 혼백을 빈소에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라 한다. 초우제와 반혼제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초우제는 장사 당일에 지내야 한다. 초우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지만 빗질은 하지 못한다.
-재우제(再虞祭)
원래는 초우제를 지내고 난 다음날 또는 그 하루 거른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보통은 초우제 지낸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삼우제(三虞祭)
재우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는 비로소 묘역에 갈 수 있다. 상주는 간단한 묘제(墓祭)를 올리고 성분이 잘 되었는지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직접 살피고 잔손질을 한다.
최근에 와서는 상기(喪期)를 단축할 경우 삼오날(삼우제날) 가서 봉분 옆에 흙을 파고
혼백을 묻는다. 이를 매혼(埋魂)이라 한다.
ㄴ.졸곡제(卒哭祭)
삼우제를 지내고 3개월 이후 날을 잡아 졸곡제를 지낸다. 최근에는 상기가 짧을 경우 삼우제가 끝난 뒤 첫 강일에 지내기도 한다. 졸곡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을 올릴 때만 곡을 하고, 평시에는 빈소에서 곡을 하지 않는다. 졸곡제 전에는 축문에 상주를 \"疏子○○\"라 쓰지만 졸곡 후에는 \"孝子○○\"라고 쓴다.
ㄷ. 부제
졸곡제 다음에 지내는 제사로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붙여 모시는 제사이다. 사당이 있는 경우 망위(亡位)의 신주를 모셔가서 이미 봉안되어 있는 선망신위(先亡神位)들과 존비위차에 맞게 자리매김하여 제사를 모신다. 철상 후 빈소로 신주를 다시 모셔온다.
ㄹ. 소상(小祥)
사망 후 1년만에 지내는 제사로 제사 방식은 우제와 비슷하다. 먼 친척도 오고 문상객(주로 초상 때 조문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오므로 음식을 많이 장만해 대접한다. 소상을 치르고 나면 일반적으로 바깥상주와 안상주는 요질과 수질을 착용하지 않는다.
ㅁ. 대상(大祥)
사망 후 2년만에 지내는 제로 소상과 같은 방식으로 지낸다. 소상 때 보다 많이 오는 큰 행사이다. 보통 대상이 끝나면 사당이 있는 경우 신주는 사당에 안치하고 영좌는 철거한다.
담제를 따로 지내지 않는 경우는 이날 바로 탈상하고 상기(喪期)를 끝내기도 한다.
ㅂ. 담제
대상 후 두 달째 되는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이날 탈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담제 때 탈상하고는 사당 고사를 한번 더 지내는데 이를 길제(吉祭)라한다. 이후의 제사는 기제사로서 이는 제례(祭禮)에 포함시키고 상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혼인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려는 욕망처럼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관계를 이루었다. 또한 혼인은 고유의 정신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참아가며 서로 간의 도리를 지키고 평생 동안 고락을 같이 하며 일생을 사는 것이다. 혼례는 이런 혼인을 행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다.
또한 상장례도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고 일상생활로 회귀하는 절차의 원리이고, 우리나라 관혼상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예로써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지금은 복잡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전통혼례와 상장례가 많이 간소화되고 또 많이 치러지지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로써 정중한 마음으로 치러지던 우리의 혼례와 상장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에 다가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혼례)
윤숙자,「한국의 혼례음식」, 지구문화사, 2001
김동욱,「한국민속학」, 새문사, 2003
박경휘,「조선민족혼인사연구」,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신병주,「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효형, 2001
조희진,「韓國民俗學究論薯 14」 - 한국 전통 혼례의 절차에 관한 연구」, 1998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http://k5000.nurlmedia.co.kr/intro.asp?Book=한국민속대관
(상장례)
임돈희,『빛깔있는 책들-조상제례』대원사, 1990
임재해,『빛깔있는 책들-전통상례』대원사, 1990
이영춘,『차례와 제사』대원사, 1994
http://100.naver.com/100.nhn?docid=87109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107719
朴柱弘, 韓國民俗學槪論, 螢雪出版社, 1992,
권순만, 종합 관혼상제, 일신서적출판사, 2002
*목 차
Ⅰ. 혼례(婚禮)
Ⅱ. 혼례의 역사
Ⅲ. 혼례 절차의 종류
Ⅳ. 혼례 절차의 이상형
Ⅴ. 혼례 절차
Ⅰ. 상장례
Ⅱ. 상장례의 역사
Ⅲ. 장례와 상례의 차이점
Ⅳ. 상장례의 절차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참고 문헌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평토제를 지내고 나면, 집사가 영좌(靈座:혼령을 안치하는 장소)를 철거하고 상주는 영여에 혼백을 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 집으로 오거나, 상여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되돌아온다(다른 길로 와야 귀신이 못 따라 온다고 함). 되돌아올 때 상주들은 영여를 뒤따르는데 이를 반혼이라 한다. 집에 돌아오면 안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혼백을 맞이한다. 혼백은 빈소에 모셔진다. 그러면 망자에게 반혼을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이를 반혼제(返魂祭)라 한다. 앞에 주과포혜를 진실하고(차려놓고) 술을 치고 축을 읽고 상주들이 두 번 절한다.
⑩. 기제사(忌祭祀) 기제사: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祭祀
전의 각종의례
영좌를 장지에서 반혼하여 와서 혼백을 다시 모시고 난 후부터 담제(嬉祭)를 지내기 전까지 지내는 각종 제사를 묶어 흉제(凶祭)라 한다. 기제사 지내기 전의 각종 제사는 담제를 지내므로써 보통 끝이 난다.
ㄱ.우제(虞祭)
갓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로 일종의 위령제이다. 우제는 세 번 지내는데, 세 차례 모두 다 그 집안의 기제사 방식(가문에 따라 다름)과 동일하게 지내고 곡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우제(初虞祭)
반혼한 혼백을 빈소에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라 한다. 초우제와 반혼제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초우제는 장사 당일에 지내야 한다. 초우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지만 빗질은 하지 못한다.
-재우제(再虞祭)
원래는 초우제를 지내고 난 다음날 또는 그 하루 거른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보통은 초우제 지낸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삼우제(三虞祭)
재우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는 비로소 묘역에 갈 수 있다. 상주는 간단한 묘제(墓祭)를 올리고 성분이 잘 되었는지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직접 살피고 잔손질을 한다.
최근에 와서는 상기(喪期)를 단축할 경우 삼오날(삼우제날) 가서 봉분 옆에 흙을 파고
혼백을 묻는다. 이를 매혼(埋魂)이라 한다.
ㄴ.졸곡제(卒哭祭)
삼우제를 지내고 3개월 이후 날을 잡아 졸곡제를 지낸다. 최근에는 상기가 짧을 경우 삼우제가 끝난 뒤 첫 강일에 지내기도 한다. 졸곡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을 올릴 때만 곡을 하고, 평시에는 빈소에서 곡을 하지 않는다. 졸곡제 전에는 축문에 상주를 \"疏子○○\"라 쓰지만 졸곡 후에는 \"孝子○○\"라고 쓴다.
ㄷ. 부제
졸곡제 다음에 지내는 제사로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붙여 모시는 제사이다. 사당이 있는 경우 망위(亡位)의 신주를 모셔가서 이미 봉안되어 있는 선망신위(先亡神位)들과 존비위차에 맞게 자리매김하여 제사를 모신다. 철상 후 빈소로 신주를 다시 모셔온다.
ㄹ. 소상(小祥)
사망 후 1년만에 지내는 제사로 제사 방식은 우제와 비슷하다. 먼 친척도 오고 문상객(주로 초상 때 조문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오므로 음식을 많이 장만해 대접한다. 소상을 치르고 나면 일반적으로 바깥상주와 안상주는 요질과 수질을 착용하지 않는다.
ㅁ. 대상(大祥)
사망 후 2년만에 지내는 제로 소상과 같은 방식으로 지낸다. 소상 때 보다 많이 오는 큰 행사이다. 보통 대상이 끝나면 사당이 있는 경우 신주는 사당에 안치하고 영좌는 철거한다.
담제를 따로 지내지 않는 경우는 이날 바로 탈상하고 상기(喪期)를 끝내기도 한다.
ㅂ. 담제
대상 후 두 달째 되는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이날 탈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담제 때 탈상하고는 사당 고사를 한번 더 지내는데 이를 길제(吉祭)라한다. 이후의 제사는 기제사로서 이는 제례(祭禮)에 포함시키고 상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혼인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려는 욕망처럼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관계를 이루었다. 또한 혼인은 고유의 정신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참아가며 서로 간의 도리를 지키고 평생 동안 고락을 같이 하며 일생을 사는 것이다. 혼례는 이런 혼인을 행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다.
또한 상장례도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고 일상생활로 회귀하는 절차의 원리이고, 우리나라 관혼상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예로써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지금은 복잡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전통혼례와 상장례가 많이 간소화되고 또 많이 치러지지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로써 정중한 마음으로 치러지던 우리의 혼례와 상장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에 다가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혼례)
윤숙자,「한국의 혼례음식」, 지구문화사, 2001
김동욱,「한국민속학」, 새문사, 2003
박경휘,「조선민족혼인사연구」,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신병주,「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효형, 2001
조희진,「韓國民俗學究論薯 14」 - 한국 전통 혼례의 절차에 관한 연구」, 1998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http://k5000.nurlmedia.co.kr/intro.asp?Book=한국민속대관
(상장례)
임돈희,『빛깔있는 책들-조상제례』대원사, 1990
임재해,『빛깔있는 책들-전통상례』대원사, 1990
이영춘,『차례와 제사』대원사, 1994
http://100.naver.com/100.nhn?docid=87109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107719
朴柱弘, 韓國民俗學槪論, 螢雪出版社, 1992,
권순만, 종합 관혼상제, 일신서적출판사, 2002
*목 차
Ⅰ. 혼례(婚禮)
Ⅱ. 혼례의 역사
Ⅲ. 혼례 절차의 종류
Ⅳ. 혼례 절차의 이상형
Ⅴ. 혼례 절차
Ⅰ. 상장례
Ⅱ. 상장례의 역사
Ⅲ. 장례와 상례의 차이점
Ⅳ. 상장례의 절차
Ⅴ. 혼례와 상장례의 조사를 마치며...
*참고 문헌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인 식생활의 역사(원시시대~개화기)
한국인 식생활의 역사(원시시대~개화기) 표준화 검사의 종류 및 방향
표준화 검사의 종류 및 방향 예절의 종류와 인사 예절의 방식과 변천
예절의 종류와 인사 예절의 방식과 변천 가정위탁 사업의 개념 및 목적,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정위탁 사업의 개념 및 목적,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터키에 대하여... (역사,문화,종교,인종,정치,사회- 총괄)
터키에 대하여... (역사,문화,종교,인종,정치,사회- 총괄)  무역결제의 종류와 형태
무역결제의 종류와 형태 [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교육훈련]직업훈련(직업교육)의 역사,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목적,...
[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교육훈련]직업훈련(직업교육)의 역사,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목적,... 국수의 종류, 우동
국수의 종류, 우동 [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의 정의, 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의 종류와 ...
[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의 정의, 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의 종류와 ... 한복의 모든 것 - 한복의 역사와 발전 및 한복의 구조와 특성, 한복의 보관 및 관리, 생활풍...
한복의 모든 것 - 한복의 역사와 발전 및 한복의 구조와 특성, 한복의 보관 및 관리, 생활풍... 전통문양의 개념, 전통문양의 역사, 전통문양학습(전통문양교육)의 의의, 전통문양학습(전통...
전통문양의 개념, 전통문양의 역사, 전통문양학습(전통문양교육)의 의의, 전통문양학습(전통...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종류,특징,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동...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종류,특징,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동... [벤처기업][벤처기업 평가기관][벤처기업 해외진출]벤처기업의 의미, 벤처기업의 역사, 벤처...
[벤처기업][벤처기업 평가기관][벤처기업 해외진출]벤처기업의 의미, 벤처기업의 역사, 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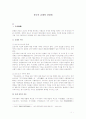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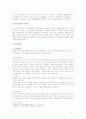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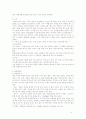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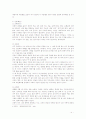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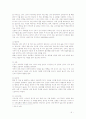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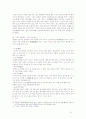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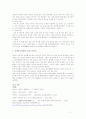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