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론 (Theory)
Ⅱ. 근대화 이론
Ⅲ. 근대화 이론의 맹점
Ⅳ. 근대화 이론의 비판
Ⅴ. 인과관계 (Causation)
참고 문헌
Ⅱ. 근대화 이론
Ⅲ. 근대화 이론의 맹점
Ⅳ. 근대화 이론의 비판
Ⅴ. 인과관계 (Causation)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납적 일반화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고성 산불피해의 경우 산불피해의 일회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실례를 찾아 같은 경우가 많았다면 그때서야 일반화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이례”라는 현상이 나온다. 만약 100가지 사례 중에서 10가지의 이례가 나온다고 일반화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500가지의 사례 중에서 50가지 이상의 이례가 나온다고 부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일반화된 것을 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례로서 일반화시키는 귀납적 추리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한 내재적 역동성을 찾아내는 것은 다른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고성 산불피해와 같은 자연현상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나타난 이유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등산객의 실화 → 바람에 의한 산불확산 → 고성피해”까지의 인과경로의 진행내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왜 살인을 하게 하는지는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으며 단지 확증되지 못한 이론으로만 감각경험의 공백을 채울 뿐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정량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살인이 공변하는 모습을 그려낼 수는 있다 해도 그러한 두 변수가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인과관계는 사회과학 연구에 어떻게 이용되고 인과관계의 설명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경험론적 시각과 더불어 중시되는 것은 결정론적 시각이다. 결정론적 시각에서는 일간의 행동을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모든 인간의 행동이 결정론적으로 운명 지워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설명은 결정론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의 도출과 인과관계의 고찰은 경험론적 시각으로 연구하고 그 설명에 있어서는 결정론적 시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복합론적 설명방식(idiographic model of explanation)이다. 이는 어떤 특정사례에 대한 설명에 가능한 한 모든 원인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성 산불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등산객의 실화, 고의적 방화, 산 속 고압선의 합선”등 가능한 모든 원인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단일론적 설명방식(monothetic model of explanation)이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모든 이유를 밝히고자 하지 않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들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고성 산불의 원인에서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등산객의 실화”로 현상을 설명한다면 이 단일론적 설명방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단일론적 설명방식은 좀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는 설명하고 사회과학에 이용하는데 실상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원인의 다양성(variety of cause)을 들 수 있다. “가로수가 죽었다.”라는 결과가 있을 때 이의 원인은 “산성비가 원인이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인에는 또한 “배기가스로 공기가 오염되어 산성비가 내린다.”라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에는 또한 “자동차가 많다.”라는 원인이 있다. 이처럼 원인의 원인이 계속 있는 원인의 다양성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로 인과관계의 연쇄반응(chainreaction)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설명이 용이하려면 그 과정이 경험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본 속담에 “봄바람이 불면 통장사가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과관계의 연속성을 잘 나타낸다. “봄바람”과 “통장사”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봄바람이 분다는 것은 황사(黃砂)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사가 오면 먼지로 인하여 장님이 되고 이 장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 고양이를 잡아먹고 이에 쥐가 늘어나 쌀통이 못쓰게 된다. 그래서 통장사가 돈을 벌게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에 이르는 그 인과 과정이 경험적 지식만으로는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설명이 어렵다. 세 번째의 이유는 같은 원인이지만 다른 결과(same cause → different effet)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런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양 중세 봉건주의의 몰락과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가 등장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전체주의가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정치형태가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지만 봉건주의의 반대로 인한 원인은 같다. 마지막 이유로 원인의 피상성(su-perficiation)이 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찾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원인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결혼 못한 노처녀가 신경질적이다”라는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결혼 못한 것”이지만 성격이 본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설명은 쉽지가 않다. 지금까지 인과관계(caus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과관계란 결과에 대한 필요조건, 일대일 혹은 다대일 함수의 관계로서 성립한다고 수 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인과관계는 여러 이유로 설명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 렬,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서울 : 박영사, 1999)
○ 최한수, 『정치학 연구 방법론』(서울 : 대왕사, 1993)
○ 노동일, 『정치학 방법론』(서울 : 박영사, 1996)
○ 김웅진, 『비교정치론 강의1』(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 김웅진, 『정치학 방법론 서설』(서울 : 명지사, 1997)
참 고 문 헌
○ 김 렬,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서울 : 박영사, 1999)
○ 최한수, 『정치학 연구 방법론』(서울 : 대왕사, 1993)
○ 노동일, 『정치학 방법론』(서울 : 박영사, 1996)
○ 김웅진, 『비교정치론 강의1』(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 김웅진, 『정치학 방법론 서설』(서울 : 명지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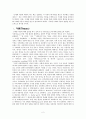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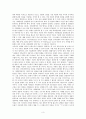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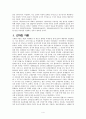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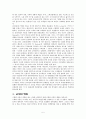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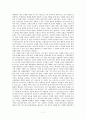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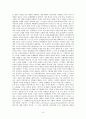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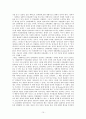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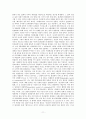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