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김부식의 생애
2. 김부식의 문학관과 시문의 특성
(1) 문학관
(2) 시의 특성
(3) 문의 특성
3. 김부식의 역사관과 삼국사기
(1)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와 목적
(2) 삼국사기 논쟁
(3)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사관과 의의
결론
본론
1. 김부식의 생애
2. 김부식의 문학관과 시문의 특성
(1) 문학관
(2) 시의 특성
(3) 문의 특성
3. 김부식의 역사관과 삼국사기
(1)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와 목적
(2) 삼국사기 논쟁
(3)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사관과 의의
결론
본문내용
讀文) 신라 시대부터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설총이 정리하였다고 한다. 보통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고 토를 붙인 것인데 세종의 한글 창제 이전에 고려와 조선의 하급 관리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의 시가도 망라할 수 있었다.
열전에서 당나라와 끝까지 혈전을 벌인 백제복신을 빠뜨리고 항복하여 당나라의 신하가 된 흑치상지를 특별히 기록해 놓은 사실은 명백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③ 그 밖의 의견들
긍정론
부정론
신라의 고유 방언인 거서간(居西干), 차차웅(次次雄) 등 왕명을 고유한 우리말로 사용.
유가 전통인 할고지효(割股之孝)를 비난.
동성혼의 옹호.
삼국유사보다 합리적이며 객관적 서술 방식.
유가적인 역사관의 정윤론(正閏論)을 수입하여 신라를 정통으로 서술.
모든 사물의 평가 척도를 유학의 명제에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 교조주의적 편향화.
중국사료의 무비판적 답습, 삼국의 매 시기간의 차이. 발전의 역사적 특질의 차이를 고려함없이 일률적 관찰.
천문, 역상 기사들의 기계적 유추. 왕력과 연대의 착오.
인민의 생활 모습과 사회의 발전 단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불충분.
(3)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사관과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삼국사기》의 평가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삼국사기》에도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적 사관과 철저한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한 것은 옳지 않고,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은 중원 왕조인 당나라에 대한 불손한 태도 때문이며, 백제 또한 전쟁을 일삼아 대국에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평한 것은 명백히 사대주의적 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인 향가나 불교, 화랑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거나 유교적 성격에 맞게 바꾸어 놓기까지 했다. 이것은 곧 김부식의 사관과 연결되며 민족주의 사학의 관점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이며, 세련된 문장의 관찬 역사서로서 고대 삼국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가를 알려주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결 론
고려조의 지배층의 한 축으로 살았던 김부식은 유교를 현실생활에 끌어들이려는 당대 풍조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문학, 정치, 유학의 선각자 위치에 서야 했던 그가 심미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한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김부식은 문학이란 군주를 권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선양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하여 유가적 엄숙함을 견지하는 시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착상에다 고사를 적절하게 삽입한 것이어서 차라리 시보다는 산문에 더 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부식은 당시 유행하던 육조풍(六朝風)의 사륙 변려문체를 탈피하여 당송시대에 발전한 고문체(古文體)를 시도함으로써 문체의 일변을 꾀하였고 그로 인해 변려체가 점차 쇠퇴해지고 고문체가 문장의 주류를 이루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은 김부식의 독자적이고 확고한 문학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의 모든 사상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는 고대의 설화 중심적신화 중심적인 역사 서술이 아닌 합리성을 추구하는 역사 서술로 역사학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삼국사기》는 신라정통론을 바탕으로 하고 중국의 유교 윤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역사서로 그 사대적인 성향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신채호를 비롯한 많은 선학들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 받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자주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재해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국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곧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인식과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점이다.
유학자이자 역사가, 정치가, 문학가로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김부식은 우리의 관심과 연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
참고문헌
*「이화어문집(梨花語文集)」제 4판
*「한문학연구(漢文學硏究)」제 2권
*「조선한국학연구」제 7집, 신성출판사
* 황천우, 1981,《三國史記조사보고서》, 문화재단
* 이기백, 1976, 《삼국사기론》 , 문학과 지성
의 시가도 망라할 수 있었다.
열전에서 당나라와 끝까지 혈전을 벌인 백제복신을 빠뜨리고 항복하여 당나라의 신하가 된 흑치상지를 특별히 기록해 놓은 사실은 명백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③ 그 밖의 의견들
긍정론
부정론
신라의 고유 방언인 거서간(居西干), 차차웅(次次雄) 등 왕명을 고유한 우리말로 사용.
유가 전통인 할고지효(割股之孝)를 비난.
동성혼의 옹호.
삼국유사보다 합리적이며 객관적 서술 방식.
유가적인 역사관의 정윤론(正閏論)을 수입하여 신라를 정통으로 서술.
모든 사물의 평가 척도를 유학의 명제에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 교조주의적 편향화.
중국사료의 무비판적 답습, 삼국의 매 시기간의 차이. 발전의 역사적 특질의 차이를 고려함없이 일률적 관찰.
천문, 역상 기사들의 기계적 유추. 왕력과 연대의 착오.
인민의 생활 모습과 사회의 발전 단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불충분.
(3)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사관과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삼국사기》의 평가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삼국사기》에도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적 사관과 철저한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한 것은 옳지 않고,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은 중원 왕조인 당나라에 대한 불손한 태도 때문이며, 백제 또한 전쟁을 일삼아 대국에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평한 것은 명백히 사대주의적 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인 향가나 불교, 화랑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거나 유교적 성격에 맞게 바꾸어 놓기까지 했다. 이것은 곧 김부식의 사관과 연결되며 민족주의 사학의 관점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이며, 세련된 문장의 관찬 역사서로서 고대 삼국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가를 알려주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결 론
고려조의 지배층의 한 축으로 살았던 김부식은 유교를 현실생활에 끌어들이려는 당대 풍조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문학, 정치, 유학의 선각자 위치에 서야 했던 그가 심미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한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김부식은 문학이란 군주를 권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선양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하여 유가적 엄숙함을 견지하는 시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착상에다 고사를 적절하게 삽입한 것이어서 차라리 시보다는 산문에 더 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부식은 당시 유행하던 육조풍(六朝風)의 사륙 변려문체를 탈피하여 당송시대에 발전한 고문체(古文體)를 시도함으로써 문체의 일변을 꾀하였고 그로 인해 변려체가 점차 쇠퇴해지고 고문체가 문장의 주류를 이루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은 김부식의 독자적이고 확고한 문학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의 모든 사상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는 고대의 설화 중심적신화 중심적인 역사 서술이 아닌 합리성을 추구하는 역사 서술로 역사학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삼국사기》는 신라정통론을 바탕으로 하고 중국의 유교 윤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역사서로 그 사대적인 성향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신채호를 비롯한 많은 선학들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 받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자주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재해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국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곧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인식과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점이다.
유학자이자 역사가, 정치가, 문학가로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김부식은 우리의 관심과 연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
참고문헌
*「이화어문집(梨花語文集)」제 4판
*「한문학연구(漢文學硏究)」제 2권
*「조선한국학연구」제 7집, 신성출판사
* 황천우, 1981,《三國史記조사보고서》, 문화재단
* 이기백, 1976, 《삼국사기론》 , 문학과 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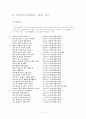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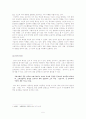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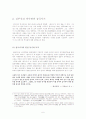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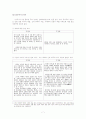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