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집은 이웃과 서로 처마와 담이 붙어 있었고,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삼국유사 제2 기이편 ‘또 사절유택’
처음 텍스트에서는 신라의 전성시대의 가구 수를 알 수 있고 부유한 35채의 큰 집(그러나 본문을 보면 39채라고 되어있다)을 금입택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신라의 부유한 이들은 사절유택이라 하여 계절마다 각기 다른 별장에서 유흥을 벌였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부유한 귀족들은 그에 맞는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또 금입택(金入宅)이라는 이름을 볼 때 실제로 금을 입힌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畓坪) ―이 땅은 예전부터 한전(閑田)이다. 새로 경작했기 때문에 신답평이라 한 것이다. ‘답(畓)’자는 속자다―에 가서 산악을 두루 바라보고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말했다.
“이 땅이 여뀌잎처럼 협소하기는 하나, 산천이 기이하게 빼어나니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오. 하물며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매 칠성(聖)이 살 곳으로도 이곳이 적합한데, 이 땅에 의탁하여 강토(疆土)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이 됨에서랴.”
이에 1천5백 보 둘레의 외성(外城)과 궁궐과 전당(殿堂)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고(武庫), 창고를 지을 장소를 마련한 후 일이 끝나자 궁궐로 돌아왔다.
널리 나라 안의 장정·인부·공장(工匠)들을 불러모아 그 달 정월 20일에 성곽일을 시작하니, 3월 10일에 이르러 역사가 일단 끝났다. 궁궐과 옥사(屋舍)만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었으므로 그해 10월에 시작하여 갑진년(44) 2월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 새 궁으로 옮아가서, 대정(大政)을 보살피고 서무(庶務)에도 부지런하였다.…(후략)…
삼국유사 제2 기이편 ‘가락국기’
수로왕은 도읍을 신답평(新畓坪)으로 정함에 있어서 주변을 살펴 정하였다고 하는데 숫자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외성의 규모나 몇몇 건물의 종류, 궁궐을 지은 시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도 길일을 택하여 궁을 옮겼다는 것을 보고 길일을 점치는 것은 이 시기에도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궁궐을 지음에 있어서는 텍스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역을 할 백성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 겨울쯤에 이뤄진 듯하다.
3. 결론
삼국유사에서 나타난 의식주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당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그것들 중에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도 있었고 넓게 살펴보면서 정치사회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고전을 공부하면서 해석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그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전을 통하여 그 시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고 의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삼국유사 제2 기이편 ‘또 사절유택’
처음 텍스트에서는 신라의 전성시대의 가구 수를 알 수 있고 부유한 35채의 큰 집(그러나 본문을 보면 39채라고 되어있다)을 금입택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신라의 부유한 이들은 사절유택이라 하여 계절마다 각기 다른 별장에서 유흥을 벌였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부유한 귀족들은 그에 맞는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또 금입택(金入宅)이라는 이름을 볼 때 실제로 금을 입힌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畓坪) ―이 땅은 예전부터 한전(閑田)이다. 새로 경작했기 때문에 신답평이라 한 것이다. ‘답(畓)’자는 속자다―에 가서 산악을 두루 바라보고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말했다.
“이 땅이 여뀌잎처럼 협소하기는 하나, 산천이 기이하게 빼어나니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오. 하물며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매 칠성(聖)이 살 곳으로도 이곳이 적합한데, 이 땅에 의탁하여 강토(疆土)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이 됨에서랴.”
이에 1천5백 보 둘레의 외성(外城)과 궁궐과 전당(殿堂)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고(武庫), 창고를 지을 장소를 마련한 후 일이 끝나자 궁궐로 돌아왔다.
널리 나라 안의 장정·인부·공장(工匠)들을 불러모아 그 달 정월 20일에 성곽일을 시작하니, 3월 10일에 이르러 역사가 일단 끝났다. 궁궐과 옥사(屋舍)만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었으므로 그해 10월에 시작하여 갑진년(44) 2월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 새 궁으로 옮아가서, 대정(大政)을 보살피고 서무(庶務)에도 부지런하였다.…(후략)…
삼국유사 제2 기이편 ‘가락국기’
수로왕은 도읍을 신답평(新畓坪)으로 정함에 있어서 주변을 살펴 정하였다고 하는데 숫자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외성의 규모나 몇몇 건물의 종류, 궁궐을 지은 시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도 길일을 택하여 궁을 옮겼다는 것을 보고 길일을 점치는 것은 이 시기에도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궁궐을 지음에 있어서는 텍스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역을 할 백성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 겨울쯤에 이뤄진 듯하다.
3. 결론
삼국유사에서 나타난 의식주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당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그것들 중에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도 있었고 넓게 살펴보면서 정치사회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고전을 공부하면서 해석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그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전을 통하여 그 시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고 의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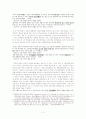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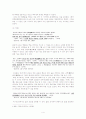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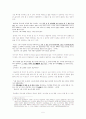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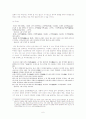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