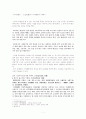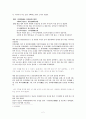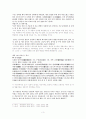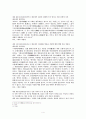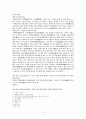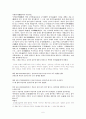목차
없음
본문내용
김숙에게 약바라지 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치면서, ‘김숙이 아직 죽기 전에 산채로 밭두둑[田畔]에 내다 버려라.’ 하였습니다. 훈도(訓導) 섭천지(葉千枝)가 이를 만류하자, 김중미가 팔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김숙이 죽자 사위인 장보경(張保卿)을 시켜서 나무 삽[木]에다 불을 피우고, 또 작은 항아리에 불을 담아다가 관(棺) 밑에 갔다 놓았습니다. 김숙의 시체의 시체가 나오자 또 잿물[灰水]과 복숭아 나무로 만든 빗자루를 가지고 문정(門庭)에다 그 물을 뿌리고 쓸어내면서 푸닥거리[禳]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숙이 죽은 이튿날에는 그는 김여생이 김중미(金仲美)·김중신(金仲信)·김중산(金仲山)·장유호(張由浩)들과 주육(酒肉)을 가지고 노래하는 기생(妓生)들을 데리고서 국상(國喪)을 무시하며 높은 데에 올라가 김숙이 죽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으니, 그들이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유(赦宥)가 지났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중미·김여생·장보경은 저택(宅)하고,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옳기고, 김중신·김중산·장유호·장유도는 저택 형벌의 한가지. 대역(大逆) 죄인이나 강상(綱常) 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만들던 일.
하고, 고향에서 쫓아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중신·김중산·장유호·장유도는 특별히 사유(赦宥)하게 하였다.
잉어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복숭아. ‘신령스런 나무’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술적으로 쓰인 결과가 무척이나 많았다. 심지어 나라에서 나서서 역질 귀신을 쫓기 위해 쓴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 가운데 궁금증을 더해주는 기록이 있었다.
태종 006 03/11#04(정미) / 전라도에 복숭아·오얏·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다
전라도에 복숭아·오얏·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었다.
태종 033 17/03/30(병진) / 봄에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지 아니하다
이 해 봄에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다.
연산 061 12/03/16(병신) / 복숭아 등의 꽃이 피지 않으니, 봄추위를 재앙이라 한 자가 있는지를 묻다
천기가 가을처름 선선하여 복숭아와 오얏의 꽃이 피지 못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옛사람의 문집에도 춘한(春寒)이란 시가 있다. 그러면 봄추위는 옛부터 있는 것이니, 봄추위가 무엇이 해로울 것인가. 요사이 대간들이 봄추위를 재앙이라 하여 소(疏)를 올린 자는 없는가?”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종 때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복숭아와 오얏의 표기. 빈번히 보이는 기록으로 보아 나라 흥망의 척도라 짐작된다. 복숭아의 주술성과 무관하지 않듯이 자연 환경에서 추측하는 거라 생각된다.
성스러운 영물 잉어, 신령스런 복숭아.
제사음식에서 금기시 되었던 것은 물론 주술성과 귀신을 쫓아서 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평상시 생활과 무관하지 않았던 ‘제사’ 음식이기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가까움이 존재했다.
이렇게 ‘금기’시 되기까지는 그 이면의 밀접함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됨을 보여준다.
하고, 고향에서 쫓아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중신·김중산·장유호·장유도는 특별히 사유(赦宥)하게 하였다.
잉어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복숭아. ‘신령스런 나무’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술적으로 쓰인 결과가 무척이나 많았다. 심지어 나라에서 나서서 역질 귀신을 쫓기 위해 쓴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 가운데 궁금증을 더해주는 기록이 있었다.
태종 006 03/11#04(정미) / 전라도에 복숭아·오얏·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다
전라도에 복숭아·오얏·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었다.
태종 033 17/03/30(병진) / 봄에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지 아니하다
이 해 봄에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다.
연산 061 12/03/16(병신) / 복숭아 등의 꽃이 피지 않으니, 봄추위를 재앙이라 한 자가 있는지를 묻다
천기가 가을처름 선선하여 복숭아와 오얏의 꽃이 피지 못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옛사람의 문집에도 춘한(春寒)이란 시가 있다. 그러면 봄추위는 옛부터 있는 것이니, 봄추위가 무엇이 해로울 것인가. 요사이 대간들이 봄추위를 재앙이라 하여 소(疏)를 올린 자는 없는가?”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종 때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복숭아와 오얏의 표기. 빈번히 보이는 기록으로 보아 나라 흥망의 척도라 짐작된다. 복숭아의 주술성과 무관하지 않듯이 자연 환경에서 추측하는 거라 생각된다.
성스러운 영물 잉어, 신령스런 복숭아.
제사음식에서 금기시 되었던 것은 물론 주술성과 귀신을 쫓아서 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평상시 생활과 무관하지 않았던 ‘제사’ 음식이기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가까움이 존재했다.
이렇게 ‘금기’시 되기까지는 그 이면의 밀접함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