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편 가창과 창작>
1. 민요
2. 강강술래
3. 시김새
4. 장단
5. 메기고 받는 형식
6. 삼채장단
7. 삼현육각
8. 평조와 계면조
9. 정간보
10. 12율
<2편 기악>
11. 가야금
12. 거문고
13. 대금
14. 단소
15. 장구
16. 북
17. 징
18. 태평소
19. 풍물놀이
20. 사물놀이
<3편 감상>
21. 판소리
22. 가야금 병창
23. 수제천
24. 대취타
25. 시나위
26. 산조
27. 청성곡
28. 종묘제례악
29. 춘앵전
30. 영산회상
1. 민요
2. 강강술래
3. 시김새
4. 장단
5. 메기고 받는 형식
6. 삼채장단
7. 삼현육각
8. 평조와 계면조
9. 정간보
10. 12율
<2편 기악>
11. 가야금
12. 거문고
13. 대금
14. 단소
15. 장구
16. 북
17. 징
18. 태평소
19. 풍물놀이
20. 사물놀이
<3편 감상>
21. 판소리
22. 가야금 병창
23. 수제천
24. 대취타
25. 시나위
26. 산조
27. 청성곡
28. 종묘제례악
29. 춘앵전
30. 영산회상
본문내용
은 한강 이남의 세습무지역에서 발달했으므로 이 지역을 시나위권이라 부른다. 음악의 유형에 따라 경기도 남부, 충청도 전역과 전라북도·전라남도의 3지역으로 나뉜다. 장단은 살풀이 계열로 일관되어 있으나 시나위권의 3지역에 독특한 차이를 보여 도살풀이권·살풀이권·동살풀이권으로 나누어 부른다. 도살풀이권인 경기지방에서는 도살풀이(섭채)와 몰이를 주로 하여, 발버드래·가래조·삼공잡이 등의 장단이 독특하게 쓰인다. 살풀이권인 충청도와 전라북도지방에서는 살풀이장단 이외의 앉은반·시님·외장구 등이 쓰이고, 동살풀이권인 전라남도지방에서는 진양과 대왕놀이장단도 쓰인다.
악기편성은 향피리·젓대·해금·장구·징으로 이루어진다. 선율은 신악(神樂)과 무악(巫樂)의 특징인 무정형의 악장(樂章)으로 되어 있어 즉흥연주가 가능한데, 이것은 연주자간에 본청(기본음)을 같게 하여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연주하기 때문이다. 가락은 육자배기가락으로 각 악기가 다른 선율을 진행시켜 본청의 통일에 의한 불협화의 조화가 이 음악의 특징이다.
26. 산조
선정이유
초등학교 6학년 제재곡 ‘둥당기타령’ 의 감상곡으로서, 여러 가지 산조에 대해 감상을 하는 학습을 한다. 따라서 산조의 유래 및 특징들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악독주곡(器樂獨奏曲) 형태의 음악으로서, 판소리·민요와 함께 민속음악의 대표적 음악양식이다. 산조는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예인광대들의 음악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 음악을 기악독주곡의 형태로 발전시킨 음악이다. 산조의 즉흥연주기법은 굿판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무부(巫夫)들이 각자의 악기로 시나위가락을 즉흥연주한 기법과 매우 닮아 있다.
산조의 장단은 판소리의 장단과 거의 같다. 판소리가락을 모방한 기악합주곡인 봉장취가 독주악기로 연주되면서 기교가 더욱 확대되어 산조의 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이후 이러한 가락들이 음악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독립된 기악독주곡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산조이다.
27. 청성곡 (청성자진한잎)
선정이유
초등학교 6학년 제재곡 ‘풍년가’의 감상곡으로서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대금 정악 독주곡의 백미라 부르는 \'청성곡\' 은 \'요천순일지곡\' 혹은 \'청성자진한잎\' 이라고도 한다. 청성곡은 가곡 이수대엽을 변조한 \'태평가\'를 2도 높인 다음, 다시 옥타브를 올려 시김새를 첨가하고, 또 특정음을 길게 늘여서 만든 곡이다.
단소로 독주하는 청성곡은 단소 특유의 영롱한 잔가락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단소의 소박하고 영롱함과 아기자기한 표현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대금의 청성곡은 힘이 있고 선이 굵으며, 청의 울림이 있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청성곡에서는 쭉뻗은 선율의 아름다움과 이어지는 잔가락의 시김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28. 종묘제례악
선정이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만큼 우리 국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종묘제례악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종묘)에서 제사(종묘제례)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며,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종묘제례의식의 각 절차마다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인 보태평지무(선왕들의 문덕을 칭송)와 무무인 정대업지무(선왕들의 무공을 찬양)가 곁들여진다.
종묘제례악은 본래 세종 29년(1447)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세조 10년(1464) 제사에 적합하게 고친 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대제에서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이 연주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기악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와 더불어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29. 춘앵전
선정이유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춘앵전과 서양의 왈츠와 비교하는 감상 학습이 나온다. 따라서 춘앵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기 곤란하다.
춘앵전(春鶯)은 조선의 궁중무용으로 춘향전과는 관계가 없다. 반주곡은 《평조회상(平調會相)》이다. 원래 춘앵전이란 이름은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무악(舞樂)의 이름인데 순조때 효명세자가 그 이름을 빌려 직접 만들었다. 당나라의 춘앵전과는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르다. 춘앵무는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 대신 섭정을 할 때 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의 4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든 정재(呈才)로서 여령(女伶)(여자 무용수)이나 무동(舞童) 한명이 노란 옷을 입고 화문석 위에서 추는 독무(獨舞)이다. 효명세자는 이 춘앵무를 봄에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만들었다고 한다.
30. 영산회상
선정이유
전통음악의 한 형태로서, 초등학교 국악 감상관련 내용의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국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한국 전통음악 가운데 궁중이나 민간에서 연주되던 현악합주곡이다. 본래 영산회상이라 하면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會相 : 삼현영산회상)·평조회상(平調會相)을 모두 포함하나 흔히 현악영산회상만을 뜻하기도 한다. 현악영산회상은 영산회상의 여러 곡들 가운데 본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악영산회상이나 평조회상은 이 곡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거문고회상이라고도 하고 중광지곡(重光之曲)이라고도 한다. 주로 조선 후기 지방 선비나 부유한 중인 출신의 풍류객에 의해 전승·발전되었다.
악기편성은 거문고·가야금·해금·단소·세피리·대금·장구로 편성되고 경우에 따라 양금이 포함되기도 한다. 상영산(上靈山)·중영산(中靈山)·세영산(細靈山)·가락덜이[加樂除只]·삼현도들이[三絃還入]·하현도들이[下絃還入]·염불도들이[念佛還入]·타령(打令)·군악(軍樂) 등 모두 9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기편성은 향피리·젓대·해금·장구·징으로 이루어진다. 선율은 신악(神樂)과 무악(巫樂)의 특징인 무정형의 악장(樂章)으로 되어 있어 즉흥연주가 가능한데, 이것은 연주자간에 본청(기본음)을 같게 하여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연주하기 때문이다. 가락은 육자배기가락으로 각 악기가 다른 선율을 진행시켜 본청의 통일에 의한 불협화의 조화가 이 음악의 특징이다.
26. 산조
선정이유
초등학교 6학년 제재곡 ‘둥당기타령’ 의 감상곡으로서, 여러 가지 산조에 대해 감상을 하는 학습을 한다. 따라서 산조의 유래 및 특징들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악독주곡(器樂獨奏曲) 형태의 음악으로서, 판소리·민요와 함께 민속음악의 대표적 음악양식이다. 산조는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예인광대들의 음악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 음악을 기악독주곡의 형태로 발전시킨 음악이다. 산조의 즉흥연주기법은 굿판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무부(巫夫)들이 각자의 악기로 시나위가락을 즉흥연주한 기법과 매우 닮아 있다.
산조의 장단은 판소리의 장단과 거의 같다. 판소리가락을 모방한 기악합주곡인 봉장취가 독주악기로 연주되면서 기교가 더욱 확대되어 산조의 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이후 이러한 가락들이 음악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독립된 기악독주곡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산조이다.
27. 청성곡 (청성자진한잎)
선정이유
초등학교 6학년 제재곡 ‘풍년가’의 감상곡으로서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대금 정악 독주곡의 백미라 부르는 \'청성곡\' 은 \'요천순일지곡\' 혹은 \'청성자진한잎\' 이라고도 한다. 청성곡은 가곡 이수대엽을 변조한 \'태평가\'를 2도 높인 다음, 다시 옥타브를 올려 시김새를 첨가하고, 또 특정음을 길게 늘여서 만든 곡이다.
단소로 독주하는 청성곡은 단소 특유의 영롱한 잔가락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단소의 소박하고 영롱함과 아기자기한 표현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대금의 청성곡은 힘이 있고 선이 굵으며, 청의 울림이 있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청성곡에서는 쭉뻗은 선율의 아름다움과 이어지는 잔가락의 시김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28. 종묘제례악
선정이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만큼 우리 국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종묘제례악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종묘)에서 제사(종묘제례)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며,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종묘제례의식의 각 절차마다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인 보태평지무(선왕들의 문덕을 칭송)와 무무인 정대업지무(선왕들의 무공을 찬양)가 곁들여진다.
종묘제례악은 본래 세종 29년(1447)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세조 10년(1464) 제사에 적합하게 고친 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대제에서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이 연주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기악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와 더불어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29. 춘앵전
선정이유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춘앵전과 서양의 왈츠와 비교하는 감상 학습이 나온다. 따라서 춘앵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기 곤란하다.
춘앵전(春鶯)은 조선의 궁중무용으로 춘향전과는 관계가 없다. 반주곡은 《평조회상(平調會相)》이다. 원래 춘앵전이란 이름은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무악(舞樂)의 이름인데 순조때 효명세자가 그 이름을 빌려 직접 만들었다. 당나라의 춘앵전과는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르다. 춘앵무는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 대신 섭정을 할 때 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의 4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든 정재(呈才)로서 여령(女伶)(여자 무용수)이나 무동(舞童) 한명이 노란 옷을 입고 화문석 위에서 추는 독무(獨舞)이다. 효명세자는 이 춘앵무를 봄에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만들었다고 한다.
30. 영산회상
선정이유
전통음악의 한 형태로서, 초등학교 국악 감상관련 내용의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국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한국 전통음악 가운데 궁중이나 민간에서 연주되던 현악합주곡이다. 본래 영산회상이라 하면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會相 : 삼현영산회상)·평조회상(平調會相)을 모두 포함하나 흔히 현악영산회상만을 뜻하기도 한다. 현악영산회상은 영산회상의 여러 곡들 가운데 본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악영산회상이나 평조회상은 이 곡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거문고회상이라고도 하고 중광지곡(重光之曲)이라고도 한다. 주로 조선 후기 지방 선비나 부유한 중인 출신의 풍류객에 의해 전승·발전되었다.
악기편성은 거문고·가야금·해금·단소·세피리·대금·장구로 편성되고 경우에 따라 양금이 포함되기도 한다. 상영산(上靈山)·중영산(中靈山)·세영산(細靈山)·가락덜이[加樂除只]·삼현도들이[三絃還入]·하현도들이[下絃還入]·염불도들이[念佛還入]·타령(打令)·군악(軍樂) 등 모두 9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천자료
 국악과 가요의 발전방안
국악과 가요의 발전방안 초등 국어과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방안
초등 국어과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방안 남북한의 음악
남북한의 음악 초등 국악 용어 설명
초등 국악 용어 설명 국악(한국전통음악)의 개념, 국악(한국전통음악)의 분류, 국악(전통음악) 관련 학술행사, 초...
국악(한국전통음악)의 개념, 국악(한국전통음악)의 분류, 국악(전통음악) 관련 학술행사, 초... 초등학교 국악교육 용어 정리
초등학교 국악교육 용어 정리 [조소][미술 조소][미술][조각][소조]조소(미술 조소)의 개념, 조소(미술 조소)의 분류, 조소...
[조소][미술 조소][미술][조각][소조]조소(미술 조소)의 개념, 조소(미술 조소)의 분류, 조소... 초등도덕교육 -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초등도덕교육 -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을 각각 1개씩 선...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을 각각 1개씩 선...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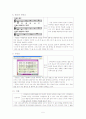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