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같은 날 09:00경부터 6. 4.까지 택시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고 부산시장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4조,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제3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원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직원, 공원, 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상용공, 임시공)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원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직원, 공원, 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상용공, 임시공)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추천자료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
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연구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연구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여부로써 경영권 사항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여부로써 경영권 사항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현행 노동법상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현행 노동법상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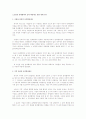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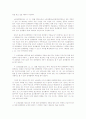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