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나라의 정치
2. 명나라의 정치
3. 명(明)대의 유교(儒敎)
4. 성리학의 기본적 이해
5. 성리학의 역사와 발달과정
6. 주자학이란?
7. 송학(宋學)의 탄생과 강남농법(江南農法)
2. 명나라의 정치
3. 명(明)대의 유교(儒敎)
4. 성리학의 기본적 이해
5. 성리학의 역사와 발달과정
6. 주자학이란?
7. 송학(宋學)의 탄생과 강남농법(江南農法)
본문내용
기를 즐겼고 병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불교, 도교 등 유교 이외의 다른 학문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주자학을 신봉하여 사물에서 이치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는 어디에서 이치를 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8세에 왕양명은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러나 34세 무렵 당시 조정에서 전횡을 일삼던 환관 유근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곤장 40대를 맞고 귀주성(貴州省) 용장역(龍場驛)에 유배되어 역승(驛丞: 숙박 업무를 담당함)으로 좌천되었다. 문화적 불모지이자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용장에서 양명은 손수 물을 긷고 나무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양명은 ‘성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란 의문을 품고 밤낮으로 정좌하고 사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본성이 온전한데 바깥 사물에서 리(理)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임을 주장하게 된다. 얼마 후 유배에서 풀려난 양명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과 소수민족의 봉기를 진압하고 왕실 귀족의 반란을 제압하는 등 장수로서 큰 공을 세웠으나 여러 차례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러면서도 평범한 관료 생활을 할 때에는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양명이 제시한 명제는 육상산의 ‘심즉리’이나 상산과 달리 마음 밖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대학(大學)』의 ‘격물(格物)’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주자의 학설을 부정하고, 격(格)을 정(正)으로 물(物)을 마음의 사(事)로 해석하였다. 즉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르게 해 마음의 본체[理]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격물에 대한 양명의 이해였다. 그가 말한 마음의 본체란 ‘양지(良知) ’인데 이것은 최고의 입법자인 동시에 리(理)의 구현자이며 천지 만물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리(理)의 구현이란 생각은 지행합일론(知行合一論)을 이끌어 낸다. 왕양명의 지행합일론은 앎이란 행의 시작이고 행이란 앎의 완성이란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는 앎과 행을 하나로 보고 참된 앎은 반드시 행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물의 이치를 먼저 깨달음으로써 행할 수 있다는 주자의 선지후행설(先知後行說)에 비해 지식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양지를 실현하는 것[致良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위해 양명은 주자학에서 제시한 격물궁리(格物窮理)와 달리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사상마련(事上磨煉)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양명학에서 제시한 이념들은 주자식의 독서·거경(居敬)·궁리(窮理) 공부보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성을 중시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을 실천하는 주체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낸 것이었고 도덕 실천의 방법을 간단하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양명학은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들에게도 도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고, 서민문화가 발전하고 상인 계급이 성장하던 명대 후기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물의 이치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에서만 찾고자 했던 왕양명의 학문은 그의 사후 두 갈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강조하여 기존의 질서와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주창한 양명 좌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해 나갈 것을 주장하며 다시 주자학에 접근했던 양명 우파이다. 이들 중 양명 좌파는 점차 대두되어 가는 서민문화의 풍조에 호응하여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강학활동을 펼쳐 명대 후기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규범과 예(禮)를 도외시한 체 자율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그들의 사상은, 욕망을 인간 본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존의 사회질서와 체제까지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양명학은 조정의 탄압과 함께 지식인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았고, 명대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7-4. 주자의 야심은?: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
그렇다면 주자는 과연 이 새로운 사서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 주자의 목표는 바로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이다. 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길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성(性)인데, 바로 그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주자는 윤리의 기준을 있음(Sein)에서 찾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즉 그가 아무리 지체 높은 임금이라도 혹은 코흘리개 철부지 꼬마라도 지켜야 할 길이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고 하늘이 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자는 당시 야권(野圈) 중에서도 극좌파쯤에 속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까다로운 사람이었으며, 원리원칙에 무척 충실한 사람이었다. 변변한 벼슬도 없는 주제에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할라치면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요래서 안 된다고 박박 우기며 목소리를 죽이지 않던 사람이 바로 주자였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귀족계급에서는 주자를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주자의 원칙주의적인 자세와 투철한 진리에의 수호의지가 당시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백성의 민심이 무서워 당시 권력층은 주자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7-5. 임금이 임금노릇을 못하면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이런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으로 인해 사실 주자는 하늘 아래 어느 누구에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있었다. 임금이라도 지켜야 할 도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임금이라도 임금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임금이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사실 이미 맹자에서부터 보인다. 그래서 사실 맹자의 책은 당시에는 금서(禁書)였다. 임금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내용이 적잖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명나라지도
원나라지도
사물의 이치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에서만 찾고자 했던 왕양명의 학문은 그의 사후 두 갈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강조하여 기존의 질서와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주창한 양명 좌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해 나갈 것을 주장하며 다시 주자학에 접근했던 양명 우파이다. 이들 중 양명 좌파는 점차 대두되어 가는 서민문화의 풍조에 호응하여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강학활동을 펼쳐 명대 후기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규범과 예(禮)를 도외시한 체 자율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그들의 사상은, 욕망을 인간 본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존의 사회질서와 체제까지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양명학은 조정의 탄압과 함께 지식인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았고, 명대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7-4. 주자의 야심은?: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
그렇다면 주자는 과연 이 새로운 사서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 주자의 목표는 바로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이다. 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길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성(性)인데, 바로 그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주자는 윤리의 기준을 있음(Sein)에서 찾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즉 그가 아무리 지체 높은 임금이라도 혹은 코흘리개 철부지 꼬마라도 지켜야 할 길이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고 하늘이 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자는 당시 야권(野圈) 중에서도 극좌파쯤에 속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까다로운 사람이었으며, 원리원칙에 무척 충실한 사람이었다. 변변한 벼슬도 없는 주제에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할라치면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요래서 안 된다고 박박 우기며 목소리를 죽이지 않던 사람이 바로 주자였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귀족계급에서는 주자를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주자의 원칙주의적인 자세와 투철한 진리에의 수호의지가 당시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백성의 민심이 무서워 당시 권력층은 주자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7-5. 임금이 임금노릇을 못하면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이런 물리학과 윤리학의 통합으로 인해 사실 주자는 하늘 아래 어느 누구에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있었다. 임금이라도 지켜야 할 도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임금이라도 임금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임금이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사실 이미 맹자에서부터 보인다. 그래서 사실 맹자의 책은 당시에는 금서(禁書)였다. 임금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내용이 적잖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명나라지도
원나라지도
추천자료
 성리학(주자학)에 관한 고찰
성리학(주자학)에 관한 고찰 성리학(주자학)의 의미, 성리학(주자학)의 마음관, 성리학(주자학)의 관학화, 성리학(주자학)...
성리학(주자학)의 의미, 성리학(주자학)의 마음관, 성리학(주자학)의 관학화, 성리학(주자학)... [성리학][주자학]성리학(주자학)의 성격, 성리학(주자학)의 역사, 성리학(주자학)의 기본이념...
[성리학][주자학]성리학(주자학)의 성격, 성리학(주자학)의 역사, 성리학(주자학)의 기본이념... 주자학(성리학)의 성격, 주자학(성리학)의 마음관, 주자학(성리학)의 이기설, 주자학(성리학)...
주자학(성리학)의 성격, 주자학(성리학)의 마음관, 주자학(성리학)의 이기설, 주자학(성리학)... 주자학(성리학)의 전파, 주자학(성리학)의 기본이념, 주자학(성리학)의 학파분화, 주자학(성...
주자학(성리학)의 전파, 주자학(성리학)의 기본이념, 주자학(성리학)의 학파분화, 주자학(성... [주자학][성리학]주자학(성리학)의 특징, 주자학(성리학)의 심성론, 주자학(성리학)의 전래, ...
[주자학][성리학]주자학(성리학)의 특징, 주자학(성리학)의 심성론, 주자학(성리학)의 전래, ... [성리학]성리학(주자학)의 개념, 성리학(주자학)의 역사, 성리학(주자학)의 교육사상, 성리학...
[성리학]성리학(주자학)의 개념, 성리학(주자학)의 역사, 성리학(주자학)의 교육사상, 성리학... [주자][주자학][성리학]주자의 태극론, 주자의 교육관, 주자학(성리학)의 개념, 주자학(성리...
[주자][주자학][성리학]주자의 태극론, 주자의 교육관, 주자학(성리학)의 개념, 주자학(성리... 성리학(주자학)의 형성, 성리학(주자학)의 이기이원론, 성리학(주자학)의 태극설, 성리학(주...
성리학(주자학)의 형성, 성리학(주자학)의 이기이원론, 성리학(주자학)의 태극설, 성리학(주... 주자학(성리학)의 기능, 주자학(성리학)의 수용, 주자학(성리학)의 심화, 주자학(성리학)의 ...
주자학(성리학)의 기능, 주자학(성리학)의 수용, 주자학(성리학)의 심화, 주자학(성리학)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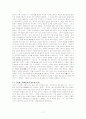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