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④ 시험관을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가열하여 시료로부터 가스가 발생하도록 한다.
⑤ 연소 가스에 의해 변화된 pH 시험지의 색상으로부터 pH 범위 및 산, 염기성을 판정한다.
⑥ 표 2의 자료와 비교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별하도록 한다.
⑦ 미지의 플라스틱 시료의 판별은 비중 측정 결과와 연소 특성 결과를 종합하여 하도록 한다.
3. 결과 (Results)및 고찰
시료
1
2
3
4
5
6
7
8
9
10
실험결과 알아낸
플라스틱 판별
Pvc
pet
HDPE
PS
PP
LDPE
HDPE
PMMA
PVC
ABS
Nylon6
Teflon
평균값
1.15
0.97
0.92
0.92
0.97
1.15
1.25
0.97
1.15
1.25
결과 값은 비중이 각각 다른 용액들을 100ml정도씩 준비한 다음 시료들을 0.05g정도 취하여 이들을 표준용액에 차례로 넣어서 이때 시료표면에 기포가 붙어 있지 않게 주의하여 넣는데 시료가 중간에 떠 있는지 잘 보면서 시료가 용액의 중간에 떠있으면 시료와 용액의 비중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준 용액에서 시료가 각각 가라앉고 뜨는지를 관찰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와 평균값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연소실험에서는 가장 힘든 과정이 연소 시 나오는 가스의 냄새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조원들의 냄새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으며 일반적인 냄새표현을 찾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았다.
<표2. 중요한 플라스틱의 연소 특성>을 참고하면서 보기 보다는 먼저 실험을 하여 마지막에 비교하여 잘 나타나지 않던 시료를 다시 측정하였다.
냄새를 맡는 중에는 과일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시료들도 있었지만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인지 아니면 너무 독해서 인지 냄새는 잘 느끼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연소시 나오는 가스의
냄새가 너무 머리를 아프게 하며 냄새분석 및 data작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비중측정에 있어서
표준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용 액 속에 있는 에탄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개가 없어서 호일로 대체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PMMA를 측정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생겨서
이유를 알아보니 손으로 잘 감아서 안에 공기가 빠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실험의
오차가 생긴 거 같다.
그리고 실험의 편리함을 위해 증류수속에 너무 오랫동안 pH 시험지를 담가 두어서 pH 시험지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고, 미지의 시료의 연소시 시험관을 너무 수직으로 세워서 연소가스가
pH 시험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일부로 리트머스 종이를 실험관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지의 시료에 대한 플라스틱 종류의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과 착오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알고자
했던 정확한 플라스틱 종류에 매우 근접하게 실험값이 나오게 되어서 알찬 실험이 된 거 같다.
5. 참고문헌 (References)
김재문, 고분자화학, p41~p73, 동명사 (1996년)
김병희, 성문이화학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년)
⑤ 연소 가스에 의해 변화된 pH 시험지의 색상으로부터 pH 범위 및 산, 염기성을 판정한다.
⑥ 표 2의 자료와 비교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별하도록 한다.
⑦ 미지의 플라스틱 시료의 판별은 비중 측정 결과와 연소 특성 결과를 종합하여 하도록 한다.
3. 결과 (Results)및 고찰
시료
1
2
3
4
5
6
7
8
9
10
실험결과 알아낸
플라스틱 판별
Pvc
pet
HDPE
PS
PP
LDPE
HDPE
PMMA
PVC
ABS
Nylon6
Teflon
평균값
1.15
0.97
0.92
0.92
0.97
1.15
1.25
0.97
1.15
1.25
결과 값은 비중이 각각 다른 용액들을 100ml정도씩 준비한 다음 시료들을 0.05g정도 취하여 이들을 표준용액에 차례로 넣어서 이때 시료표면에 기포가 붙어 있지 않게 주의하여 넣는데 시료가 중간에 떠 있는지 잘 보면서 시료가 용액의 중간에 떠있으면 시료와 용액의 비중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준 용액에서 시료가 각각 가라앉고 뜨는지를 관찰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와 평균값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연소실험에서는 가장 힘든 과정이 연소 시 나오는 가스의 냄새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조원들의 냄새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으며 일반적인 냄새표현을 찾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았다.
<표2. 중요한 플라스틱의 연소 특성>을 참고하면서 보기 보다는 먼저 실험을 하여 마지막에 비교하여 잘 나타나지 않던 시료를 다시 측정하였다.
냄새를 맡는 중에는 과일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시료들도 있었지만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인지 아니면 너무 독해서 인지 냄새는 잘 느끼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연소시 나오는 가스의
냄새가 너무 머리를 아프게 하며 냄새분석 및 data작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비중측정에 있어서
표준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용 액 속에 있는 에탄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개가 없어서 호일로 대체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PMMA를 측정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생겨서
이유를 알아보니 손으로 잘 감아서 안에 공기가 빠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실험의
오차가 생긴 거 같다.
그리고 실험의 편리함을 위해 증류수속에 너무 오랫동안 pH 시험지를 담가 두어서 pH 시험지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고, 미지의 시료의 연소시 시험관을 너무 수직으로 세워서 연소가스가
pH 시험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일부로 리트머스 종이를 실험관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지의 시료에 대한 플라스틱 종류의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과 착오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알고자
했던 정확한 플라스틱 종류에 매우 근접하게 실험값이 나오게 되어서 알찬 실험이 된 거 같다.
5. 참고문헌 (References)
김재문, 고분자화학, p41~p73, 동명사 (1996년)
김병희, 성문이화학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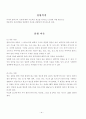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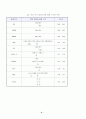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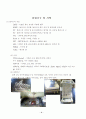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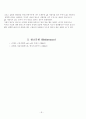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