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본문내용
로 없다. 즉, 之에는 是와 같은 지시성(指示性)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지시성(非指示性)은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 上有麾之, 中有乘之, 下有附之
위에서는 지휘하고, 중간에서는 이어받아 따르고, 아래에서는 이에 부합한다. (明心寶鑑)
○ 易地思之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愛之重之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 衆惡之 必察焉,
뭇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핀다. (論語)
○ 孔子曰, 小子 聽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 말을) 듣거라. (論語)
○ 百行之本, 忍之爲上
백행의 근본은 참는 것이 최상이다. (明心寶鑑)
※ 忍之는 명사구로서 이때 之는 앞의 글자를 술어답게 하는 어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 즉, “忍爲上”과 “忍之爲上”은 어감상 큰 차이가 있다.
○ 小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어렸을 때는 혈기가 미정한 까닭에 경계할 것은 色에 있다. (論語)
※ 역시 마찬가지로 戒在色과 戒之在色은 어감상 차이가 많다. 즉, 전자는 戒가 명사일 뿐이다. 따라서 “경계가 여색에 있다”의 뜻으로 문맥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나 之를 戒다음에 붙임으로써 戒는 명사가 아니라 술어가 되며 하나의 명사구로서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다”의 뜻이 되어 어감이 분명히 다르다.
○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 又如此
가르치는 술법의 차례, 절차, 세목의 상세함이 또한 이와 같다. (大學集註)
○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진실은 하늘의 도리요, 진실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中庸)
위의 글에서 之는 모두 무엇을 딱히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다. 즉,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서 之를 쓴 것이 아니라, 다만 문장의 균형감과 안정감, 어기, 어세, 어감 등을 위해서 써준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네가지 사례들은 모두 “술어+之”가 명사구로 쓰인 것들이다.
3. 之는 문장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어세(語勢), 어기(語氣), 어조(語調) 등을 고르기 위한 기능이 더 중요한 글자이다.
위의 논거만으로도 之는 “대명사목적어”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之는 무엇을 지칭하기 위한 대명사라기 보다는, 즉 뜻이 있는 실사(實辭)라기 보다는 문장내에서 “기능”을 주로 하는 허사(虛辭)에 가까운 글자이다. 이러한 기능은 위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니와, 아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爲善者 天報之以福 (善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明心寶鑑)
○ 有陰德者 天報以福 (음덕을 쌓은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蒙求)
※위의 두 문장은 거의 똑같은 문장이다. 그런데 하나는 之를 쓰고 하나는 之를 쓰지 않았다. 그것은 어감상의 차이이다. 즉, 아래의 문장은 4.4의 한문 고유의 댓구 형식에 따랐기 때문에, 之를 붙여주면 어감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 沽酒市脯 不食 (論語)
※ 여기서는 食이 타동사임에도 之를 붙이지 않았다. 역시 之를 붙이면 어감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不+술어+之”와 같은 형태의 구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별로 쓰이지 않는다. 아래의 문장을 보면 之가 어감, 어세, 어기 등을 고르기 위한 기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勢利紛華 不近者 爲潔, 近之而不染者 爲尤潔
권세와 이익의 화려함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고결한 것이요, 가까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는 자는 더욱 고결한 것이다. (菜根譚)
※ 이 문장에서 之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한다. 즉, 之를 통해서 문장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세(語勢)와 어조(語調) 등을 고르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不近者”를 不近之者“라고 하지 않거니와, ”近之而不染者“를 ”近而不染之者“라고 한다거나, ”近之而不染之者“라고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어감과 어세 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한 ”不+술어+之“와 같은 구문은 특별한 어세를 나타내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 得爲而不爲 不得爲而爲之 均於不孝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데도 하는 것은 불효에 있어서는 똑같다. (論語集註)
※ 여기서도 之는 어조를 고르기 위한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조동사(得, 可)+술어+之”와 같은 구문도 어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즉, 위의 문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得爲而不爲”를 “得爲之而不爲之”라 하지 않은 것은 이유 있는 것이다.
○ 王曰 王政可得聞與
왕께서 이르기를, 왕도정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孟子)
※이 문장에서도 “王政可得聞之與”라 하지 않은 것은 어세가 좋지 못해서이다.
특히 아래의 예문들은 모두 之가 어기를 고르기 위한 기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관용구들이다.
○ 願比死者 一之 如之何則可
죽은 자를 위하여 한번 원수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孟子)
○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 일으키길 좋하는 일은 아직 없었다. (論語)
○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만약 그것이(임금의 말이) 옳기 때문에 어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또한 좋지 않습니까? (論語)
위의 표현들은 대부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감을 위한 것이지,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 之를 쓴 것이 아니다.
이상으로 대략 之의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之는 한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이며, 또한 한문을 가장 한문답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글자이다. 본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之를 “목적어대명사”라는 명칭으로 불러서는 之의 온전한 쓰임새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또한 之의 쓰임새에 대해서 오해는 물론 자칫 오역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之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기 보다는 그 기능이 더 중요한 글자이며, 그 미묘한 기능을 알지 못하고는 한문의 참맛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 놓았다. 이 글이 다만, 초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비재천학(菲才淺學)을 무릅쓰고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적확(的確)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많은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비지시성(非指示性)은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 上有麾之, 中有乘之, 下有附之
위에서는 지휘하고, 중간에서는 이어받아 따르고, 아래에서는 이에 부합한다. (明心寶鑑)
○ 易地思之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愛之重之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 衆惡之 必察焉,
뭇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핀다. (論語)
○ 孔子曰, 小子 聽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 말을) 듣거라. (論語)
○ 百行之本, 忍之爲上
백행의 근본은 참는 것이 최상이다. (明心寶鑑)
※ 忍之는 명사구로서 이때 之는 앞의 글자를 술어답게 하는 어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 즉, “忍爲上”과 “忍之爲上”은 어감상 큰 차이가 있다.
○ 小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어렸을 때는 혈기가 미정한 까닭에 경계할 것은 色에 있다. (論語)
※ 역시 마찬가지로 戒在色과 戒之在色은 어감상 차이가 많다. 즉, 전자는 戒가 명사일 뿐이다. 따라서 “경계가 여색에 있다”의 뜻으로 문맥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나 之를 戒다음에 붙임으로써 戒는 명사가 아니라 술어가 되며 하나의 명사구로서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다”의 뜻이 되어 어감이 분명히 다르다.
○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 又如此
가르치는 술법의 차례, 절차, 세목의 상세함이 또한 이와 같다. (大學集註)
○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진실은 하늘의 도리요, 진실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中庸)
위의 글에서 之는 모두 무엇을 딱히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다. 즉,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서 之를 쓴 것이 아니라, 다만 문장의 균형감과 안정감, 어기, 어세, 어감 등을 위해서 써준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네가지 사례들은 모두 “술어+之”가 명사구로 쓰인 것들이다.
3. 之는 문장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어세(語勢), 어기(語氣), 어조(語調) 등을 고르기 위한 기능이 더 중요한 글자이다.
위의 논거만으로도 之는 “대명사목적어”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之는 무엇을 지칭하기 위한 대명사라기 보다는, 즉 뜻이 있는 실사(實辭)라기 보다는 문장내에서 “기능”을 주로 하는 허사(虛辭)에 가까운 글자이다. 이러한 기능은 위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니와, 아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爲善者 天報之以福 (善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明心寶鑑)
○ 有陰德者 天報以福 (음덕을 쌓은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蒙求)
※위의 두 문장은 거의 똑같은 문장이다. 그런데 하나는 之를 쓰고 하나는 之를 쓰지 않았다. 그것은 어감상의 차이이다. 즉, 아래의 문장은 4.4의 한문 고유의 댓구 형식에 따랐기 때문에, 之를 붙여주면 어감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 沽酒市脯 不食 (論語)
※ 여기서는 食이 타동사임에도 之를 붙이지 않았다. 역시 之를 붙이면 어감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不+술어+之”와 같은 형태의 구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별로 쓰이지 않는다. 아래의 문장을 보면 之가 어감, 어세, 어기 등을 고르기 위한 기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勢利紛華 不近者 爲潔, 近之而不染者 爲尤潔
권세와 이익의 화려함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고결한 것이요, 가까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는 자는 더욱 고결한 것이다. (菜根譚)
※ 이 문장에서 之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한다. 즉, 之를 통해서 문장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세(語勢)와 어조(語調) 등을 고르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不近者”를 不近之者“라고 하지 않거니와, ”近之而不染者“를 ”近而不染之者“라고 한다거나, ”近之而不染之者“라고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어감과 어세 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한 ”不+술어+之“와 같은 구문은 특별한 어세를 나타내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 得爲而不爲 不得爲而爲之 均於不孝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데도 하는 것은 불효에 있어서는 똑같다. (論語集註)
※ 여기서도 之는 어조를 고르기 위한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조동사(得, 可)+술어+之”와 같은 구문도 어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즉, 위의 문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得爲而不爲”를 “得爲之而不爲之”라 하지 않은 것은 이유 있는 것이다.
○ 王曰 王政可得聞與
왕께서 이르기를, 왕도정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孟子)
※이 문장에서도 “王政可得聞之與”라 하지 않은 것은 어세가 좋지 못해서이다.
특히 아래의 예문들은 모두 之가 어기를 고르기 위한 기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관용구들이다.
○ 願比死者 一之 如之何則可
죽은 자를 위하여 한번 원수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孟子)
○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 일으키길 좋하는 일은 아직 없었다. (論語)
○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만약 그것이(임금의 말이) 옳기 때문에 어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또한 좋지 않습니까? (論語)
위의 표현들은 대부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감을 위한 것이지,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 之를 쓴 것이 아니다.
이상으로 대략 之의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之는 한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이며, 또한 한문을 가장 한문답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글자이다. 본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之를 “목적어대명사”라는 명칭으로 불러서는 之의 온전한 쓰임새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또한 之의 쓰임새에 대해서 오해는 물론 자칫 오역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之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기 보다는 그 기능이 더 중요한 글자이며, 그 미묘한 기능을 알지 못하고는 한문의 참맛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 놓았다. 이 글이 다만, 초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비재천학(菲才淺學)을 무릅쓰고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적확(的確)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많은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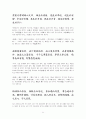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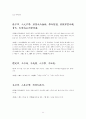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