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등의 문제는 뒤에 가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으로부터 다음이 분명해진다. 즉 고양된 철학적 숙고에의해서 받아들여졌던 로고스-말함-의 우선적 형태는 \'발언된 말\'이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말 내에서도 겉보기에 가장 단순해 보이는 형식인 발언이었다. 발언의 \"이야기\"와 말이 가지는 그 언어적 형태는 명제, 즉 우리가 \"하늘은 푸르다\"를 그 예로 들 수 있는 발언-명제인 것이다.
말의 이러한 형식이 모든 이론적 학문적 말의 근본 형식을 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끈질기게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논리적 반성을 가해왔다. 그 모든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 성과들을 담게 되는 것은 명제들이며, 그것도 무엇보다 이 명제들이 세계에 대한 발언인 한에서의 명제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명제\"로 정식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사유하며-규정하는 발언은 말의 형식들 가운데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형식이 되었다. 진리의 규정 또한 이제는 근본적으로 말의 이러한 양식, 즉 발언명제에로 방향잡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자에 관하여 이렇게 발언하는 발견함이 참이다. 이에 따라서 이론적 학문적 인식의 진리는 진리 자체의 근본 형식과 원초 형식이 되었다. 인식의 진리가 어떤 보편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다른 새김들이 반성의 시야 속으로 들어올 때면 그러한 새김들은 언제나 인식진리에 맞춰져야만 했고, 따라서 그것들은 인식진리의 파생들과 변양들로 이해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론적 인식의 진리가, 심지어 발언의 진리가 곧바로 진리 자체의 근본 형식이라는 사실은 결코 쉽게 통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에 대한 최초의 규정과 이후의 논리학의 전통이 이러한 진리이념에로 방향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 역시 이러한 이념에로 방향잡게 된다. 따라서 논리학은 그 결정적 출발점에서부터 이론적으로 알아듣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유하는 규정의 진리에로 방향잡고 있으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리학과 철학의 이러한 방향설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논리학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이론적 진리의 이러한 우위가 우연적 결과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의 과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문제설정과 파악만이 논리학의 이러한 소박한 출발점을 필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끔 하며, 그래서 그 출발점을 뒤흔들어놓게 된다는 것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참인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것이 이론적인 것이든 실천적인 것이든 간에-이 근원적인 것이며 본래적인 것인지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 관심사는 오히려 근원적이고 본래적으로 \'참인 것\'에 대한 문제, 즉 진리의 일차적 존재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의 논리학은 연구하는-학문적인-철학하는 논리학이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물어야 함을 철학하는 논리학의 근본 과제로 지정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단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뿐이며, 따라서 논리학을 근원성에의 참된 경향으로 이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저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도대체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자체라는 이념이 일종의 환상은 아닌가? 진리 자체는 \"있는가?\", 즉 존재자를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도대체 존재자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의 회의가 이미 빠져들었던 연속된 물음의 사슬에 갇히게 되고 만다.
\"고르기아스는 \'있지 않음\'에 대한 논문과 자연에 대한 논문에서 세 개의 주요 논제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아무것도 있지 않다. 둘째, 만약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에게는 파악 불가능하다. 셋째, 만약 그것이 파악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질 수도, 또 이해될 수도 없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는 \'도대체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의 윤곽을 그리는 것보다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앞선다. 그러나 형식적인 논증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즉 진리 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확정짓는 데에는 이미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 있음과 있지 않음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비록 어떠한 진리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과 진리는 파악 불가능하고 전달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진리라는 말로써 무엇이 이해될 수 있는지가 해명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제가 근본명제로서 확정되어야 한다면, 이 논제의 내용, 따라서 진리로써 의미된 것은 원칙의 투명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구가 \'진리가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진리의 가능적 파악 가능성과 전달 가능성 등에 대한 논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 자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긍정적 대답은 자명하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논구할 때 이미 우리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참되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전망과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리가 도대체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와 함께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심지어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부인되는 곳에서조차 이미 긍정적인 의미로 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인은 진리의 있지 않음에 대한 참된 발언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진리 일반의 존립에 대한 부인은 자신의 고유한 참임을, 따라서 그 존립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으로부터 다음이 분명해진다. 즉 고양된 철학적 숙고에의해서 받아들여졌던 로고스-말함-의 우선적 형태는 \'발언된 말\'이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말 내에서도 겉보기에 가장 단순해 보이는 형식인 발언이었다. 발언의 \"이야기\"와 말이 가지는 그 언어적 형태는 명제, 즉 우리가 \"하늘은 푸르다\"를 그 예로 들 수 있는 발언-명제인 것이다.
말의 이러한 형식이 모든 이론적 학문적 말의 근본 형식을 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끈질기게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논리적 반성을 가해왔다. 그 모든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 성과들을 담게 되는 것은 명제들이며, 그것도 무엇보다 이 명제들이 세계에 대한 발언인 한에서의 명제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명제\"로 정식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사유하며-규정하는 발언은 말의 형식들 가운데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형식이 되었다. 진리의 규정 또한 이제는 근본적으로 말의 이러한 양식, 즉 발언명제에로 방향잡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자에 관하여 이렇게 발언하는 발견함이 참이다. 이에 따라서 이론적 학문적 인식의 진리는 진리 자체의 근본 형식과 원초 형식이 되었다. 인식의 진리가 어떤 보편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다른 새김들이 반성의 시야 속으로 들어올 때면 그러한 새김들은 언제나 인식진리에 맞춰져야만 했고, 따라서 그것들은 인식진리의 파생들과 변양들로 이해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론적 인식의 진리가, 심지어 발언의 진리가 곧바로 진리 자체의 근본 형식이라는 사실은 결코 쉽게 통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에 대한 최초의 규정과 이후의 논리학의 전통이 이러한 진리이념에로 방향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 역시 이러한 이념에로 방향잡게 된다. 따라서 논리학은 그 결정적 출발점에서부터 이론적으로 알아듣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유하는 규정의 진리에로 방향잡고 있으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리학과 철학의 이러한 방향설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논리학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이론적 진리의 이러한 우위가 우연적 결과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의 과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문제설정과 파악만이 논리학의 이러한 소박한 출발점을 필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끔 하며, 그래서 그 출발점을 뒤흔들어놓게 된다는 것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참인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것이 이론적인 것이든 실천적인 것이든 간에-이 근원적인 것이며 본래적인 것인지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 관심사는 오히려 근원적이고 본래적으로 \'참인 것\'에 대한 문제, 즉 진리의 일차적 존재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의 논리학은 연구하는-학문적인-철학하는 논리학이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물어야 함을 철학하는 논리학의 근본 과제로 지정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단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뿐이며, 따라서 논리학을 근원성에의 참된 경향으로 이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저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도대체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자체라는 이념이 일종의 환상은 아닌가? 진리 자체는 \"있는가?\", 즉 존재자를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도대체 존재자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의 회의가 이미 빠져들었던 연속된 물음의 사슬에 갇히게 되고 만다.
\"고르기아스는 \'있지 않음\'에 대한 논문과 자연에 대한 논문에서 세 개의 주요 논제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아무것도 있지 않다. 둘째, 만약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에게는 파악 불가능하다. 셋째, 만약 그것이 파악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질 수도, 또 이해될 수도 없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는 \'도대체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의 윤곽을 그리는 것보다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앞선다. 그러나 형식적인 논증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즉 진리 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확정짓는 데에는 이미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 있음과 있지 않음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비록 어떠한 진리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과 진리는 파악 불가능하고 전달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진리라는 말로써 무엇이 이해될 수 있는지가 해명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제가 근본명제로서 확정되어야 한다면, 이 논제의 내용, 따라서 진리로써 의미된 것은 원칙의 투명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구가 \'진리가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진리의 가능적 파악 가능성과 전달 가능성 등에 대한 논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 자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긍정적 대답은 자명하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논구할 때 이미 우리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참되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전망과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리가 도대체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와 함께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심지어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부인되는 곳에서조차 이미 긍정적인 의미로 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인은 진리의 있지 않음에 대한 참된 발언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진리 일반의 존립에 대한 부인은 자신의 고유한 참임을, 따라서 그 존립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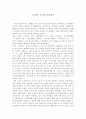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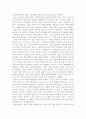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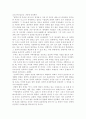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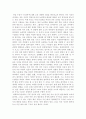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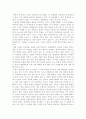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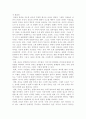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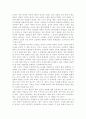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