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진 시대의 현학
들어가는 말
1. 위진 시대의 사회적 배경
2. 위진 시대의 사상가
(1) 왕필(王弼)과 하안(何晏)
(2) 죽림칠현(竹林七賢)
(3) 향수(向秀)와 곽상(郭象)
3. 위진 현학의 사상적 의미
들어가는 말
1. 위진 시대의 사회적 배경
2. 위진 시대의 사상가
(1) 왕필(王弼)과 하안(何晏)
(2) 죽림칠현(竹林七賢)
(3) 향수(向秀)와 곽상(郭象)
3. 위진 현학의 사상적 의미
본문내용
후의 의지처였는지도 모르겠다.
(3) 향수(向秀)와 곽상(郭象)
위진 시대의 현학을 대표하는 저서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장자주(莊子注)이다. 이는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향수(向秀,자는 자기(子期), 227~277)가 저술했던 것을 그가 죽은 뒤 곽상(郭象, ?~312)이 그 뒤를 이어 집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자주를 \'곽향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먼저 하안과 왕필이 “모든 존재, 즉 유(有)는 무(無)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무\'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貴無)”고 주장했다면, 향수(向秀)와 곽상(郭象)은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관점에 반대하여, 만물은 \'자생\'(自生)하며 \'독화\'(獨化)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수와 곽상은 후기 현학자들로 분류되는데, 전기 현학자인 왕필과 하안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 까닭은 노자와 장자가 본래 다른 사상이기 때문이다. 노자와 장자는 도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니 이외의 관심은 다르다. 초기 현학이 노자와 역을 중심으로 무와 유의 개념에 대해 탐구했다면 후기 현학은 장자를 중심으로 세계의 탐구에서 개인의 자유로 문제의식이 점점 소급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장자주의 논의는 무와 유의 문제에서 나아가 우주와 사물의 관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우주와 사물의 관계를 살핀 뒤 자연과 인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자연을 닮은 무위(無爲)의 삶을 강조한다. 우주와 사물과의 관계가 바로 도이다. 본래 도는 세계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는 곧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데 세계의 모습만큼 언어도 다양하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든 그것은 세계를 나타낸다. 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떠한 사물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한없이 변화해 간다. 오직 인간의 언어가 세계의 모습을 한정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즉, 인위(人爲)로써 이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 인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위인 것이다. 무위의 단계에 이르면 성지(聖智)가 나온다. 성지란 곧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지를 깨닫게 되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소요(逍遙)의 경지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러한 구별 또한 나의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나와 세계의 대상은 본래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바로 제물(祭物)이다. 제물의 단계에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가 발휘된다.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인(至人)이 된다. 지인이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인은 이미 일체의 구별을 잊고 “사물과 더불어 합일하기” 때문에 “천지와 일체가 되고 변화의 합일하여” 우주에 따라 만 가지로 변화할 수 있다. 우주는 무궁하므로 지인 역시 무궁하다.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박성규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p.226
즉 도를 체득한 경지인 것이다.
3. 위진 현학의 사상적 의미
본래 춘추전국 시대 이후 도가의 학설은 언제나 이류 내지 삼류로 취급되어 그 명맥만 유지되어 왔다. 한 대 초기의 황로학이나 후 한 말의 태평도나 모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지만 특별한 이론상의 비판이나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상이 변화했다면 그저 현실에 맞는 처세로서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위진 시대에 왕필과 하안을 필두로 한 경학자들에 의해 도가의 사상이 다시 조명된다. 즉,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하안은 경서의 해석에 다시 주석을 다는 소의 저술 방식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물론 위진 시대의 청담 또한 이후에는 학문적 담론에서 벗어나 쾌락적이고 관능적인 요소로 치닫게 되었지만, 기존 경서에서 다루지 않던 우주와 만물에 관한 논의의 깊이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위진의 현학자들 청담을 통해 노자, 장자, 주역 그리고 열자와 양주의 사상들을 한데 종합하였고, 그 성과를 담은 저술들이 오늘날 도가 철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상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오이환, 동아시아의 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3
시게자와 도시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중국 사상, 이혜경 역, 서울, 예문서원, 2003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박성규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김충렬, 김충렬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강길중, 박종현, 정재훈 공저, 中國 歷史의 理解,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03
(3) 향수(向秀)와 곽상(郭象)
위진 시대의 현학을 대표하는 저서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장자주(莊子注)이다. 이는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향수(向秀,자는 자기(子期), 227~277)가 저술했던 것을 그가 죽은 뒤 곽상(郭象, ?~312)이 그 뒤를 이어 집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자주를 \'곽향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먼저 하안과 왕필이 “모든 존재, 즉 유(有)는 무(無)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무\'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貴無)”고 주장했다면, 향수(向秀)와 곽상(郭象)은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관점에 반대하여, 만물은 \'자생\'(自生)하며 \'독화\'(獨化)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수와 곽상은 후기 현학자들로 분류되는데, 전기 현학자인 왕필과 하안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 까닭은 노자와 장자가 본래 다른 사상이기 때문이다. 노자와 장자는 도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니 이외의 관심은 다르다. 초기 현학이 노자와 역을 중심으로 무와 유의 개념에 대해 탐구했다면 후기 현학은 장자를 중심으로 세계의 탐구에서 개인의 자유로 문제의식이 점점 소급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장자주의 논의는 무와 유의 문제에서 나아가 우주와 사물의 관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우주와 사물의 관계를 살핀 뒤 자연과 인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자연을 닮은 무위(無爲)의 삶을 강조한다. 우주와 사물과의 관계가 바로 도이다. 본래 도는 세계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는 곧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데 세계의 모습만큼 언어도 다양하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든 그것은 세계를 나타낸다. 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떠한 사물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한없이 변화해 간다. 오직 인간의 언어가 세계의 모습을 한정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즉, 인위(人爲)로써 이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 인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위인 것이다. 무위의 단계에 이르면 성지(聖智)가 나온다. 성지란 곧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지를 깨닫게 되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소요(逍遙)의 경지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러한 구별 또한 나의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나와 세계의 대상은 본래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바로 제물(祭物)이다. 제물의 단계에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가 발휘된다.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인(至人)이 된다. 지인이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인은 이미 일체의 구별을 잊고 “사물과 더불어 합일하기” 때문에 “천지와 일체가 되고 변화의 합일하여” 우주에 따라 만 가지로 변화할 수 있다. 우주는 무궁하므로 지인 역시 무궁하다.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박성규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p.226
즉 도를 체득한 경지인 것이다.
3. 위진 현학의 사상적 의미
본래 춘추전국 시대 이후 도가의 학설은 언제나 이류 내지 삼류로 취급되어 그 명맥만 유지되어 왔다. 한 대 초기의 황로학이나 후 한 말의 태평도나 모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지만 특별한 이론상의 비판이나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상이 변화했다면 그저 현실에 맞는 처세로서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위진 시대에 왕필과 하안을 필두로 한 경학자들에 의해 도가의 사상이 다시 조명된다. 즉,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하안은 경서의 해석에 다시 주석을 다는 소의 저술 방식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물론 위진 시대의 청담 또한 이후에는 학문적 담론에서 벗어나 쾌락적이고 관능적인 요소로 치닫게 되었지만, 기존 경서에서 다루지 않던 우주와 만물에 관한 논의의 깊이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위진의 현학자들 청담을 통해 노자, 장자, 주역 그리고 열자와 양주의 사상들을 한데 종합하였고, 그 성과를 담은 저술들이 오늘날 도가 철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상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오이환, 동아시아의 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3
시게자와 도시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중국 사상, 이혜경 역, 서울, 예문서원, 2003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박성규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김충렬, 김충렬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강길중, 박종현, 정재훈 공저, 中國 歷史의 理解,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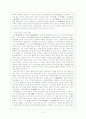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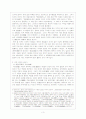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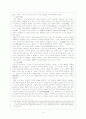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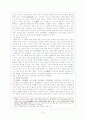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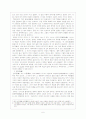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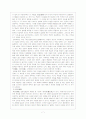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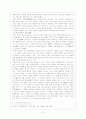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