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교관련 유적 목차
1. 성균관
2. 종 묘
3. 서 원
4. 경회루
5. 양동민속마을
6. 임신서기석
7. 벽송정
8. 경국대전
1. 성균관
2. 종 묘
3. 서 원
4. 경회루
5. 양동민속마을
6. 임신서기석
7. 벽송정
8. 경국대전
본문내용
즐겁게 놀고, 이 때 농악대를 이끌고 동네를 돌며 지신(地神)밟기를 해 주면 음식을 내어 놓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했다. 이 놀이는 농사일에 고생한 머슴을 위로하고 주인과 머슴이 다 같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여유있는 놀이였다.
이와 같이 양동민속마을은 당시의 마을환경, 교육과 정서, 신분계층의 질서, 가옥구조 등 조선시대 문화환경이 집약된 곳이다.
6.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요 약 : 신라시대에 유교 경전을 습득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을 새긴 비석이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시 대 : 삼국시대
소유자: 국립경주박물관
창건 및 재건 : 682년(신문왕 2) 또는 732년(성덕왕 31)에 제작되었거나, 552년(진흥왕 13)이나 612년(진평왕 34)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료 및 규모 : 길이 약 34cm·윗부분 너비 12.5cm·두께 약 2cm의 자연석으로 된 비석 1기
임신서기석은 비석의 첫머리에 새겨진 임신(壬申)이라는 간지(干支)와 충성을 서약하는 글귀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비석은 냇돌의 자연석에 5행으로 74자가 새겨져 있는데, 1행 18자·2행 16자·3행 14자·4행 16자·5행 10자로 되어 있다. 글자는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순수한 한문식 문장이 아닌 우리말식의 한문체이다. 길이는 약 34cm이고, 너비는 윗부분이 12.5cm이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두께는 약 2cm이다.
비석의 제작 연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먼저 신라가 국학(國學)을 설치한 시기와 관련하여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비석에 있는 임신년(壬申年)이라는 간지(干支)와 신라 국학(國學)의 주요한 교과서인 『시경(詩經)』·『상서(尙書)』·『예기(禮記)』 ·『춘추(春秋)』등 유교 경서의 명칭이 거론된 것에 근거하여, 국학이 설치된 시기인 651년(진덕여왕 5) 이후의 임신년인 662년(문무왕 2)에 제작되었거나, 혹은 국학이 완성된 시기인 682년(신문왕 2) 이후의 임신년인 732년(성덕왕 31)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학 설치 이전으로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국학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신라에 유교 경서가 도입되었다는 것과 비문의 내용 중에 화랑도의 근본정신인 충도(忠道)를 실천할 것을 맹세한 것에 근거하여, 화랑도가 융성했던 중고기(中古期)의 임신년인 552년(진흥왕 13)이나 612년(진평왕 34)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벽송정(碧松亭)
지정번호 : 경북문화재자료 제110호
요 약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에 있는 정자
지정연도 : 1985년 8월 5일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산88
시 대 : 통일신라시대
창건 및 재건 :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
재료 및 규모 : 정면 3칸ㆍ측면 2칸의 건물 1동
벽송정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자 내에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학자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의 시문(詩文)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래가 오래 된 건물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유림에 의하여 이 정자가 운영되었으며, 각지의 선비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유생들에게 강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1920년에는 대홍수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건물의 일부분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이 정자는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안림천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정자의 현판(縣板)에는 일두(一) 정여창(鄭汝昌;1450∼1504)과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 등의 시문(詩文)이 남아 있다.
8. 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다음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1469년(예종 1)에 전체 6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유교정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전으로, 이 법전의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지금의 우리나라의 헌법 정치형태와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동민속마을은 당시의 마을환경, 교육과 정서, 신분계층의 질서, 가옥구조 등 조선시대 문화환경이 집약된 곳이다.
6.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요 약 : 신라시대에 유교 경전을 습득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을 새긴 비석이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시 대 : 삼국시대
소유자: 국립경주박물관
창건 및 재건 : 682년(신문왕 2) 또는 732년(성덕왕 31)에 제작되었거나, 552년(진흥왕 13)이나 612년(진평왕 34)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료 및 규모 : 길이 약 34cm·윗부분 너비 12.5cm·두께 약 2cm의 자연석으로 된 비석 1기
임신서기석은 비석의 첫머리에 새겨진 임신(壬申)이라는 간지(干支)와 충성을 서약하는 글귀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비석은 냇돌의 자연석에 5행으로 74자가 새겨져 있는데, 1행 18자·2행 16자·3행 14자·4행 16자·5행 10자로 되어 있다. 글자는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순수한 한문식 문장이 아닌 우리말식의 한문체이다. 길이는 약 34cm이고, 너비는 윗부분이 12.5cm이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두께는 약 2cm이다.
비석의 제작 연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먼저 신라가 국학(國學)을 설치한 시기와 관련하여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비석에 있는 임신년(壬申年)이라는 간지(干支)와 신라 국학(國學)의 주요한 교과서인 『시경(詩經)』·『상서(尙書)』·『예기(禮記)』 ·『춘추(春秋)』등 유교 경서의 명칭이 거론된 것에 근거하여, 국학이 설치된 시기인 651년(진덕여왕 5) 이후의 임신년인 662년(문무왕 2)에 제작되었거나, 혹은 국학이 완성된 시기인 682년(신문왕 2) 이후의 임신년인 732년(성덕왕 31)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학 설치 이전으로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국학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신라에 유교 경서가 도입되었다는 것과 비문의 내용 중에 화랑도의 근본정신인 충도(忠道)를 실천할 것을 맹세한 것에 근거하여, 화랑도가 융성했던 중고기(中古期)의 임신년인 552년(진흥왕 13)이나 612년(진평왕 34)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벽송정(碧松亭)
지정번호 : 경북문화재자료 제110호
요 약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에 있는 정자
지정연도 : 1985년 8월 5일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산88
시 대 : 통일신라시대
창건 및 재건 :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
재료 및 규모 : 정면 3칸ㆍ측면 2칸의 건물 1동
벽송정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자 내에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학자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의 시문(詩文)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래가 오래 된 건물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유림에 의하여 이 정자가 운영되었으며, 각지의 선비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유생들에게 강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1920년에는 대홍수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건물의 일부분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이 정자는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안림천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정자의 현판(縣板)에는 일두(一) 정여창(鄭汝昌;1450∼1504)과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 등의 시문(詩文)이 남아 있다.
8. 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다음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1469년(예종 1)에 전체 6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유교정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전으로, 이 법전의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지금의 우리나라의 헌법 정치형태와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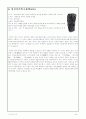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