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 1
개고기의 일반적 특징 .......................................................................................... 2
문헌에 나오는 개고기 .......................................................................................... 3
개고기의 조리법 ................................................................................................. 4
개고기를 좋아했던 유명인 .................................................................................... 5
마치는 말 .......................................................................................................... 7
개고기의 일반적 특징 .......................................................................................... 2
문헌에 나오는 개고기 .......................................................................................... 3
개고기의 조리법 ................................................................................................. 4
개고기를 좋아했던 유명인 .................................................................................... 5
마치는 말 .......................................................................................................... 7
본문내용
닥에는 뼈다귀를 묶어놓아도 되고 또는 밥이나 죽 모두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낫은 박힌 부분이 위로 가게하고 날의 끝은 통의 아래에 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가 주둥이를 넣기는 수월해도 주둥이를 꺼내기는 거북합니다. 또 개가 이미 이끼를 물면 그 주둥이가 불룩하게 커져서 사면으로 찔리기 때문에 끝내는 걸리게 되어 공손히 엎드려 그 꼬리만 흔들 따름입니다.
5일마다 한 마리를 삶으면 하루 이틀 쯤이야 생선찌개를 먹는다 해도 어찌 기운을 잃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1년 366일에 52마리의 개를 삶으면 충분히 고기를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흑산도를 형님의 탕목읍으로 만들어 주어 고기를 먹고 부귀를 누리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고달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으시다니, 역시 사정에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깨 한 말을 이편에 부쳐 드리니 볶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채소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으면 이제 개를 잡을 차례입니다.
또 삶는 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달아매어 껍질을 벗기고 창자나 밥통은 씻어도 그 나머지는 절대로 씻지 말고 곧장 가마솥 속에 넣어서 바로 맑은 물로 삶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꺼내놓고 식초, 장, 기름, 파로 양념을 하여 더러는 볶기도 하고
더러는 다시 삶는데, 이렇게 해야 훌륭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정 박제가의 개고기의 요리법입니다.
위의 편지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 도중 흑산도에 유배가 있는 둘째 형인 정약전 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내용을 보면 정약전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개고기를 먹을 것을 형에게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이 편지의 \"섬 안에 산개가 천 마리 백 마리…\" 부분에서 \'산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 외에도 야생에서 서식하는 개가 존재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일마다 한 마리를 삶으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개고기를 비교적 자주 먹었다는 점도 알 수 있고, 개를 잡는 법 또한 활. 총, 덫, 그물 등 개를 포획하는 방법이 다양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속에 개를 포획하는 방법과 그 요리법이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서술 된 것으로 보아 정약용이 자신이 개고기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편지에서 놀라운 점은 유배생활동안 한주에 한 마리 꼴로 개를 먹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약용이 유배생활동안 왕성한 저작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 주마다 먹었던 개고기의 탁월한 보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치는 말
개고기는 수유, 시력 보강 등의 간단한 증상에서부터 반위증, 정력보강, 난산 같은 중병까지 다양한 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고기는의 개의 살부터 개의 피, 두개골, 심지어 미친개의 담석(구보(狗寶)) : 개의 담낭 속에 생긴 담석)까지 버리는 것 없이 사용해왔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개의 각 부분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그 당시에 개가 주위에 많이 있지 않다면 굳이 저렇게 까지 자세히 효능을 설명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에 개고기에 비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치료법은 많지 않았다는 점이 개의 보편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개의 보편성과 효용성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개를 음식물인 동시에 현대의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급상자 같은 역할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
김상보 『조선 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5일마다 한 마리를 삶으면 하루 이틀 쯤이야 생선찌개를 먹는다 해도 어찌 기운을 잃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1년 366일에 52마리의 개를 삶으면 충분히 고기를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흑산도를 형님의 탕목읍으로 만들어 주어 고기를 먹고 부귀를 누리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고달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으시다니, 역시 사정에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깨 한 말을 이편에 부쳐 드리니 볶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채소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으면 이제 개를 잡을 차례입니다.
또 삶는 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달아매어 껍질을 벗기고 창자나 밥통은 씻어도 그 나머지는 절대로 씻지 말고 곧장 가마솥 속에 넣어서 바로 맑은 물로 삶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꺼내놓고 식초, 장, 기름, 파로 양념을 하여 더러는 볶기도 하고
더러는 다시 삶는데, 이렇게 해야 훌륭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정 박제가의 개고기의 요리법입니다.
위의 편지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 도중 흑산도에 유배가 있는 둘째 형인 정약전 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내용을 보면 정약전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개고기를 먹을 것을 형에게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이 편지의 \"섬 안에 산개가 천 마리 백 마리…\" 부분에서 \'산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 외에도 야생에서 서식하는 개가 존재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일마다 한 마리를 삶으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개고기를 비교적 자주 먹었다는 점도 알 수 있고, 개를 잡는 법 또한 활. 총, 덫, 그물 등 개를 포획하는 방법이 다양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속에 개를 포획하는 방법과 그 요리법이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서술 된 것으로 보아 정약용이 자신이 개고기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편지에서 놀라운 점은 유배생활동안 한주에 한 마리 꼴로 개를 먹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약용이 유배생활동안 왕성한 저작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 주마다 먹었던 개고기의 탁월한 보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치는 말
개고기는 수유, 시력 보강 등의 간단한 증상에서부터 반위증, 정력보강, 난산 같은 중병까지 다양한 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고기는의 개의 살부터 개의 피, 두개골, 심지어 미친개의 담석(구보(狗寶)) : 개의 담낭 속에 생긴 담석)까지 버리는 것 없이 사용해왔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개의 각 부분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그 당시에 개가 주위에 많이 있지 않다면 굳이 저렇게 까지 자세히 효능을 설명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에 개고기에 비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치료법은 많지 않았다는 점이 개의 보편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개의 보편성과 효용성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개를 음식물인 동시에 현대의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급상자 같은 역할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
김상보 『조선 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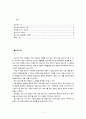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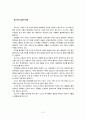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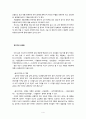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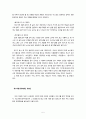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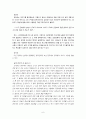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