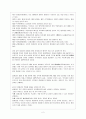본문내용
.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성하였다. 많은 보살상과 영험설화를 그 증거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삼국유사〉에 보이는 관음신앙에 대한 기록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상대사가 동해안 관음굴에서 〈백화도량발원문 白華道場發願文〉을 짓고 기도정진한 결과 관음보살을 친견하고서 낙산사(洛山寺)를 세웠다는 등 고승들과 얽힌 설화들을 통해서도 관음신앙의 성행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요원(了圓)에 의하여 〈법화영험전 法華靈驗傳〉이 편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도 관음신앙이 매우 성하였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숭유억불정책에 의하여 불교의 교학적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조선시대에도 민간의 기복적 신앙으로서의 관음신앙은 단절되지 않았으며, 무속과 결합되어 생활 속 깊이 파고 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복적 신앙을 통하여 불교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불교의 이러한 기복적인 양상은 만해선사(卍海禪師)가 〈조선불교유신론 朝鮮佛敎維新論〉에서 그 개혁을 주장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현대에도 관음신앙은 약화되지 않아서, 3대 관음성지(觀音聖地)인 동해안의 낙산사, 남해안의 보리암(菩提庵), 그리고 강화도의 보문사(普門寺)를 비롯, 영험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음기도도량마다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사찰마다 대부분 관음전(觀音殿)을 따로 건립하여 관음보살상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거나,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돕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봉안하고 있다.
※ 법화승은 법화경의 사상교리를 전파하는 승려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성하였다. 많은 보살상과 영험설화를 그 증거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삼국유사〉에 보이는 관음신앙에 대한 기록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상대사가 동해안 관음굴에서 〈백화도량발원문 白華道場發願文〉을 짓고 기도정진한 결과 관음보살을 친견하고서 낙산사(洛山寺)를 세웠다는 등 고승들과 얽힌 설화들을 통해서도 관음신앙의 성행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요원(了圓)에 의하여 〈법화영험전 法華靈驗傳〉이 편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도 관음신앙이 매우 성하였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숭유억불정책에 의하여 불교의 교학적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조선시대에도 민간의 기복적 신앙으로서의 관음신앙은 단절되지 않았으며, 무속과 결합되어 생활 속 깊이 파고 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복적 신앙을 통하여 불교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불교의 이러한 기복적인 양상은 만해선사(卍海禪師)가 〈조선불교유신론 朝鮮佛敎維新論〉에서 그 개혁을 주장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현대에도 관음신앙은 약화되지 않아서, 3대 관음성지(觀音聖地)인 동해안의 낙산사, 남해안의 보리암(菩提庵), 그리고 강화도의 보문사(普門寺)를 비롯, 영험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음기도도량마다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사찰마다 대부분 관음전(觀音殿)을 따로 건립하여 관음보살상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거나,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돕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봉안하고 있다.
※ 법화승은 법화경의 사상교리를 전파하는 승려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