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미였으며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미엿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중화질서에서 주변이었던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보다 적응이 쉬웠다. 주변에 있었기에 일본의 화이관에서 화는 실체가 불분명했고 이로서 서양에 대한 관점은 중국보다 유연할 수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천하 개념에서 드러난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화이사상은 중국과 달리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경향성이 현저했다. 지배층이 사무라이 집단이었으며 화이사상을 지탱한 문화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이후 “양이(攘夷)로 대표되는 배외주의적 기운이 일본열도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갓다.” 그러나 그 기운의 뿌리는 “화이라는 명분보다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서양제국의 군사적 우월성”이었고 “그 저변에 놓인 서양의 과학기술을 섭취해서 국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전략적 인식이”었다. 일본에겐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생존의 문제였고 적응의 문제였다. 그렇기에 만국공법을 읽는 것은 적응의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중화질서에서 주변이었던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보다 적응이 쉬웠다. 주변에 있었기에 일본의 화이관에서 화는 실체가 불분명했고 이로서 서양에 대한 관점은 중국보다 유연할 수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천하 개념에서 드러난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화이사상은 중국과 달리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경향성이 현저했다. 지배층이 사무라이 집단이었으며 화이사상을 지탱한 문화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이후 “양이(攘夷)로 대표되는 배외주의적 기운이 일본열도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갓다.” 그러나 그 기운의 뿌리는 “화이라는 명분보다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서양제국의 군사적 우월성”이었고 “그 저변에 놓인 서양의 과학기술을 섭취해서 국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전략적 인식이”었다. 일본에겐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생존의 문제였고 적응의 문제였다. 그렇기에 만국공법을 읽는 것은 적응의 생존의 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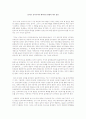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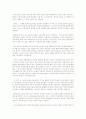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