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구함이 이보다 가까울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적 자아의식을 탈피하여 만물과 자기를 한몸처럼 여기는 대아(大我) 관념을 가짐으로써 자기와 자기 이외의 사람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적극적 이타 행위가 있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마음을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한다. 성인은 본래 타인의 불행을 우려(憂慮)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 등문공 상편에서 요(堯), 순(舜), 우(禹), 후직(后稷), 설(楔)이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들을 언급한 뒤 “요임금만이 우려한다”, “성인이라야 근심이 있다”, “성인의 백성 걱정이 이와 같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평생을 두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도 하였으며, “사람으로서 덕행[德], 지혜[慧], 도술[術], 재지[知]를 가진 이는 언제나 재앙과 근심 속에 있다”고도 하였다.
맹자가 말한 인정(仁政)은 이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 차마 남에게 잔인할 수 없는 마음)’, 즉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려의식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자아의식을 탈피하여 만물과 자기를 한몸처럼 여기는 대아(大我) 관념을 가짐으로써 자기와 자기 이외의 사람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적극적 이타 행위가 있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마음을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한다. 성인은 본래 타인의 불행을 우려(憂慮)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 등문공 상편에서 요(堯), 순(舜), 우(禹), 후직(后稷), 설(楔)이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들을 언급한 뒤 “요임금만이 우려한다”, “성인이라야 근심이 있다”, “성인의 백성 걱정이 이와 같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평생을 두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도 하였으며, “사람으로서 덕행[德], 지혜[慧], 도술[術], 재지[知]를 가진 이는 언제나 재앙과 근심 속에 있다”고도 하였다.
맹자가 말한 인정(仁政)은 이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 차마 남에게 잔인할 수 없는 마음)’, 즉 타인의 불행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려의식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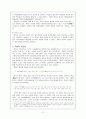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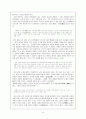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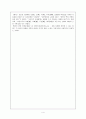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