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를 제외하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의 3음보로 정리되며 마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불리는 민요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때, 여러 차례 붙어 있는 '나다'이라는 여음구와 2행 간격으로 행간에 나타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라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0.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조로 보아 유의어로 보느니보다는 역시 여음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만일에 구음으로 본다면 처음에 '나니나'하는 피리의 구음이 문헌상에 정착되면서 '나난'으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즐가'도 악기의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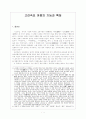
|
여음은 고시가의 후렴부에 주로 붙어 연을 분절한다. 본사가 길면 긴 노래일수록 여음이 개재되어 장형화된 연시로 분절됨을 볼 수 있는데, <정읍사>는 3장 6구의 단연시였는데 여음에 의해 3연으로 되었고 3연이던 〈서경별곡〉은 여음의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3.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가 가극적 성격을 받침한다는 견해
여증동(1982), "<쌍화점> 노래 연구", 『고려시대의 가요문학』(새문사)
도 있으니 이는 물론 고려가요 가운데 유일하다고 할 장형의 후렴을 지녔다는 이유에서다.
6. 음악적 측면에서 본 여음의 종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여음인데 기능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어느 한쪽이 밝혀지면 다른 쪽을 규명하기도 손쉬울 듯하나 전체 시가에서 단 한번 발견되며 고려가요 전반을 통해서도 동일한 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용적인 후렴구라 보기도 어렵다.
3.결론
고려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5.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