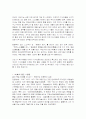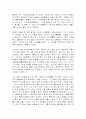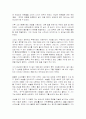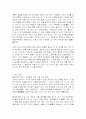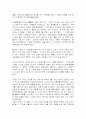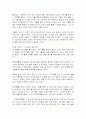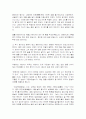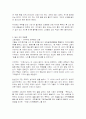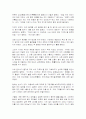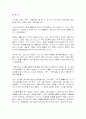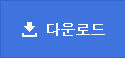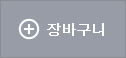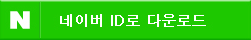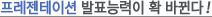본문내용
국만 또렷이 남았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 가도록 문종이 위에 머문 국화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정약용도 그림자와 관련된 멋진 글을 남겼다. 많은 사람이 정약용을 『목민심서』를 지은 근엄한 사상가로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산문처럼 따뜻하고 정스럽고 인간적인 글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는 예술을 알고 아취(雅趣)를 즐길 줄 알았던 사람이다. 국화꽃으로 그림자놀이를 하며 벗들간에 즐겁게 노니는 광경을 묘사한 『국영시서(菊影詩序)』를 보자.
하루는 남고(南皐) 윤이서(尹彛敍)에게 들렀다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 자네가 우리 집에 자면서 나와 함께 국화를 보는 것이 어떻겠나?” 윤이서는, “국화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어찌 밤중에 볼 수가 있겠는가?”하고 하며 아프다고 사양하였다. 내가, “어쨌든 가보기나 하세.”하며 억지로 청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었다. 짐짓 동자를 시켜 등잔을 잡고 꽃 한 송이에 바싹 갖다 대게 하고는 윤이서를 당겨서 이를 보게 하며 말했다. “기이하지 않은가?” 윤이서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의 말이 더 이상하군. 나는 아무리 봐도 기이한 줄 모르겠는걸.” 내가 말했다. “자네 말이 옳아.”
조금 있다가 동자를 시켜 법대로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옷걸이와 책상 등 여러 가지 방안에 있던 산만한 물건들을 치우고 국화의 위치를 정돈하여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등잔도 꼭 알맞은 위치에 놓아두고서 불을 밝혔다.
그러자 기이한 무늬와 희한한 형상이 갑자기 벽에 차오는 것이었다. 가까운 것은 꽃과 잎이 엇갈려 있고 가지와 줄기가 또렷하여 가지런한 것이 마치 수묵화를 그려놓은 것만 같았다. 그 다음 조금 떨어진 것은 너울대고 어른대는 그림자가 춤추듯 하늘거리는 것이 마치 동산에 달이 떠올라 뜨락의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일렁이는 듯하였다. 먼 것은 흐릿하고 모호해서 마치 구름 노을이 엷게 깔린 것만 같고, 사라질 듯 여울지는 것은 파도가 넘쳐흐르는 듯해서, 황홀하고도 비슷한 것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윤이서가 즐거워 크게 소리 지르며 뛸 듯이 기뻐하다가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며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천하의 뛰어난 광경일세그려.” 한참을 그러다 흥분이 가라앉자 술을 내오게 하였다. 술이 거나해지자 서로 시를 지으면서 즐겼다. 이때 주신(舟臣) 이유수(李儒修), 무구(无咎) 윤지눌(尹持訥) 등도 또한 같이 모였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된 그림자를 보여주었더라면 감동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술부터 내와서 자리가 소란스러웠어도 안 될 말이다. 처음에 짐짓 허튼 수를 한 번 두어 상대의 김을 뺀 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해놓고는 느닷없이 정면 공격으로 일격에 무찔러버린다.
가을밤, 국화 화분 하나 앉혀놓고 깜깜한 방안에서 등잔에 불을 붙일 때, 그리하여 일순간 쏟아져나온 빛의 무리들이 만화경 같은 세상을 벽 위에 펼쳐 보일 때 건조하고 답답하던 삶은 문득 생기를 얻는다. 사는 일이 답답하기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무에 있겠는가? 다만 그때 그네들이 지녔던 여유를 우리가 지니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폴 그셀이 엮은 『로댕어록』을 읽다가, 또 하나 인상 깊은 그림자놀이 장면을 접하였다. 로댕이 벌인 그림자놀이이다.
“당신은 여태까지 램프 불빛으로 고대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뇨,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틀림없이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릴테니.”
로댕은 아틀리에 한 구석의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대리석 토르소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것은 ‘메티니의 비너스’의 작은 모조품이었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로댕이 램프를 조각의 옆쪽에 바싹 가까이 가져가면서 복부를 일렁이는 불꽃으로 비추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이렇게 비춰진 불빛은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요철(凹凸)을 대리석 위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잘 보시오!” 그는 아주 조용히 그 비너스 상을 세워놓은 회전반을 돌렸다. 그것이 돌고 있는 동안 나는 복부의 전체적인 형태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기복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다. 언뜻 볼 때는 단순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비할 데 없이 복잡하였다.
“이렇게까지 세부를 관찰하게 될 줄은 뜻밖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오. 자! 허벅지와 복부를 잇는 골짜기 부분의 이 무수한 기복을. 자, 보시오. 골반의 육감적인 요부를 모조리 맛보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이쪽….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요부(凹部)를.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넘치는 열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황홀하다는 듯 그 대리석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육체요!” 이렇게 말한 그는 활기 있게 덧붙였다. “키스와 애무 아래서 만들어졌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요.” 갑자기 조각의 허리에 손바닥을 대고는 말했다. “이 동체에 닿으면 체온이 느껴질 정도예요.”
고수(高手)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의 눈은 남들이 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단번에 읽어낸다. 핵심을 찌른다. 국화 그림자를 연출하며 벗들과 가을밤을 보내던 정약용의 그림자놀이와, 비너스 상 둘레로 램프를 돌리면서 햇볕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조각상 위의 수많은 요철을 음미하던 로댕의 그림자놀이는 참 무던히 닮아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양(洋)의 동서도 없고 때의 고금(古今)도 없다.
그저 주는 눈길에 사물은 결코 제 비밀을 열어보이지 않는다.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이는 나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워낙 환한 조명 속에 살다 보니 이제 우리는 좀체로 제 그림자조차 보기가 어렵다. 도시의 밝은 불빛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삶이 빚어내는 그늘이다. 그림자가 없는 삶에는 그늘이 없다. 녹슬 줄 모르는 스테인리스처럼, 언제나 웃고 있는 마케팅처럼, 0과 1 사이를 끊임없이 깜빡거리는 디지털처럼 그늘이 없다. 덧없는 시간 속에 덧없는 인생들이 덧없는 생각을 하다가 덧없이 스러져간다. 도처에 바빠 죽겠다는 아우성뿐이다
정약용도 그림자와 관련된 멋진 글을 남겼다. 많은 사람이 정약용을 『목민심서』를 지은 근엄한 사상가로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산문처럼 따뜻하고 정스럽고 인간적인 글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는 예술을 알고 아취(雅趣)를 즐길 줄 알았던 사람이다. 국화꽃으로 그림자놀이를 하며 벗들간에 즐겁게 노니는 광경을 묘사한 『국영시서(菊影詩序)』를 보자.
하루는 남고(南皐) 윤이서(尹彛敍)에게 들렀다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 자네가 우리 집에 자면서 나와 함께 국화를 보는 것이 어떻겠나?” 윤이서는, “국화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어찌 밤중에 볼 수가 있겠는가?”하고 하며 아프다고 사양하였다. 내가, “어쨌든 가보기나 하세.”하며 억지로 청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었다. 짐짓 동자를 시켜 등잔을 잡고 꽃 한 송이에 바싹 갖다 대게 하고는 윤이서를 당겨서 이를 보게 하며 말했다. “기이하지 않은가?” 윤이서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의 말이 더 이상하군. 나는 아무리 봐도 기이한 줄 모르겠는걸.” 내가 말했다. “자네 말이 옳아.”
조금 있다가 동자를 시켜 법대로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옷걸이와 책상 등 여러 가지 방안에 있던 산만한 물건들을 치우고 국화의 위치를 정돈하여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등잔도 꼭 알맞은 위치에 놓아두고서 불을 밝혔다.
그러자 기이한 무늬와 희한한 형상이 갑자기 벽에 차오는 것이었다. 가까운 것은 꽃과 잎이 엇갈려 있고 가지와 줄기가 또렷하여 가지런한 것이 마치 수묵화를 그려놓은 것만 같았다. 그 다음 조금 떨어진 것은 너울대고 어른대는 그림자가 춤추듯 하늘거리는 것이 마치 동산에 달이 떠올라 뜨락의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일렁이는 듯하였다. 먼 것은 흐릿하고 모호해서 마치 구름 노을이 엷게 깔린 것만 같고, 사라질 듯 여울지는 것은 파도가 넘쳐흐르는 듯해서, 황홀하고도 비슷한 것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윤이서가 즐거워 크게 소리 지르며 뛸 듯이 기뻐하다가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며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천하의 뛰어난 광경일세그려.” 한참을 그러다 흥분이 가라앉자 술을 내오게 하였다. 술이 거나해지자 서로 시를 지으면서 즐겼다. 이때 주신(舟臣) 이유수(李儒修), 무구(无咎) 윤지눌(尹持訥) 등도 또한 같이 모였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된 그림자를 보여주었더라면 감동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술부터 내와서 자리가 소란스러웠어도 안 될 말이다. 처음에 짐짓 허튼 수를 한 번 두어 상대의 김을 뺀 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해놓고는 느닷없이 정면 공격으로 일격에 무찔러버린다.
가을밤, 국화 화분 하나 앉혀놓고 깜깜한 방안에서 등잔에 불을 붙일 때, 그리하여 일순간 쏟아져나온 빛의 무리들이 만화경 같은 세상을 벽 위에 펼쳐 보일 때 건조하고 답답하던 삶은 문득 생기를 얻는다. 사는 일이 답답하기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무에 있겠는가? 다만 그때 그네들이 지녔던 여유를 우리가 지니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폴 그셀이 엮은 『로댕어록』을 읽다가, 또 하나 인상 깊은 그림자놀이 장면을 접하였다. 로댕이 벌인 그림자놀이이다.
“당신은 여태까지 램프 불빛으로 고대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뇨,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틀림없이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릴테니.”
로댕은 아틀리에 한 구석의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대리석 토르소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것은 ‘메티니의 비너스’의 작은 모조품이었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로댕이 램프를 조각의 옆쪽에 바싹 가까이 가져가면서 복부를 일렁이는 불꽃으로 비추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이렇게 비춰진 불빛은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요철(凹凸)을 대리석 위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잘 보시오!” 그는 아주 조용히 그 비너스 상을 세워놓은 회전반을 돌렸다. 그것이 돌고 있는 동안 나는 복부의 전체적인 형태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기복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다. 언뜻 볼 때는 단순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비할 데 없이 복잡하였다.
“이렇게까지 세부를 관찰하게 될 줄은 뜻밖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오. 자! 허벅지와 복부를 잇는 골짜기 부분의 이 무수한 기복을. 자, 보시오. 골반의 육감적인 요부를 모조리 맛보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이쪽….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요부(凹部)를.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넘치는 열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황홀하다는 듯 그 대리석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육체요!” 이렇게 말한 그는 활기 있게 덧붙였다. “키스와 애무 아래서 만들어졌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요.” 갑자기 조각의 허리에 손바닥을 대고는 말했다. “이 동체에 닿으면 체온이 느껴질 정도예요.”
고수(高手)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의 눈은 남들이 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단번에 읽어낸다. 핵심을 찌른다. 국화 그림자를 연출하며 벗들과 가을밤을 보내던 정약용의 그림자놀이와, 비너스 상 둘레로 램프를 돌리면서 햇볕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조각상 위의 수많은 요철을 음미하던 로댕의 그림자놀이는 참 무던히 닮아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양(洋)의 동서도 없고 때의 고금(古今)도 없다.
그저 주는 눈길에 사물은 결코 제 비밀을 열어보이지 않는다.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이는 나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워낙 환한 조명 속에 살다 보니 이제 우리는 좀체로 제 그림자조차 보기가 어렵다. 도시의 밝은 불빛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삶이 빚어내는 그늘이다. 그림자가 없는 삶에는 그늘이 없다. 녹슬 줄 모르는 스테인리스처럼, 언제나 웃고 있는 마케팅처럼, 0과 1 사이를 끊임없이 깜빡거리는 디지털처럼 그늘이 없다. 덧없는 시간 속에 덧없는 인생들이 덧없는 생각을 하다가 덧없이 스러져간다. 도처에 바빠 죽겠다는 아우성뿐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교육학 계론 요약정리
교육학 계론 요약정리 문법 <음운론> 요약정리 서브노트
문법 <음운론> 요약정리 서브노트 [교육학]교육사회학 요약정리(5장,6장,8장)
[교육학]교육사회학 요약정리(5장,6장,8장) 조직행태론 요약정리
조직행태론 요약정리 행정법2요약정리
행정법2요약정리 [현대시인] 유치환론-허무의지와 수사학 요약정리
[현대시인] 유치환론-허무의지와 수사학 요약정리 한국의갯벌 요약정리
한국의갯벌 요약정리 남편과 아내사이 (김준기) - 책 요약정리
남편과 아내사이 (김준기) - 책 요약정리 3장 사회보장 관련 논쟁 및 이론 요약정리
3장 사회보장 관련 논쟁 및 이론 요약정리 학습장애 요약정리
학습장애 요약정리 신학자 불트만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논평을10줄 정도 기...
신학자 불트만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논평을10줄 정도 기... 레닌저 생화학 (Lehninger Principles of Biochemistry) 5판 Ch12 요약정리
레닌저 생화학 (Lehninger Principles of Biochemistry) 5판 Ch12 요약정리 생태학적 접근에 대하여 과제분량의 70%로 요약정리하고,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사회복지사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하여 과제분량의 70%로 요약정리하고,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사회복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