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序)
2.관념(觀念)과 추상(抽象)
3.구상(具象) 지향(指向)과 추상적(抽象的) 결과(結果)
4.시인(詩人)의 비시적(非詩的) 몰락(沒落)에 대하여
2.관념(觀念)과 추상(抽象)
3.구상(具象) 지향(指向)과 추상적(抽象的) 결과(結果)
4.시인(詩人)의 비시적(非詩的) 몰락(沒落)에 대하여
본문내용
라 예술가의 주관 속에서 여과된 이차적 대상이다. 산문인 사물이 시로 결합된 것이다. 한시(漢詩)의 회화성에 매료되었던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도 결국은 산수도의 그것과 같은 것이고, 렌섬이 말한 물리적 시(physical poetry)도 지향점은 같다. 이런 세계를 두고 흔히 동양적 표현으로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말을 쓴다.
객관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그림에서조차 감정 이입이 요구됨에 비추어본다면 황석우의 시는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니 그것은 실수라기보다 애당초 감동보다는 글엮기에 치중한 그의 태도 또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함이 옳을 듯하다. 그가 노린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형상 그 자체였을 따름이며, 그것도 매우 유행적인 어사의 조합 또는 상투적 제시였다.
시를 쓰는 이유는 한두 가지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어째야 시가 되는가는 대상을 통한 인간의 인식과 발견을 함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감동도 정서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황석우는 그 점에 소흘하였다. 저가 느끼고 저가 제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그저 그려 내기에 급급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화관의 간판이나 이발소 그림을 그리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실의 근거를 우리는 그가 즐겨 사용한 역은유에서 찾을 수 있다.
밤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달은
그를 숭배(崇拜)하는 처녀(處女)들과
힝는 그의 친(親)한 동창(同窓)의 벗들의
니마 힝 식기렴갓치 보이고
낫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태양(太陽)은
산(山)골작이의 맑은 물 가운데
가슴 헛치고
목물하려 힝여듬과 갓치 보인다.
이 시에는 표현의 주체가 제거되어 있다. 아니 몰인간(沒人間)이라고 함이 옳다. 비유의 공식을 연습이나 하듯이 그저 그리기만 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아무런 감정적 공감도 없고, 개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후기 작품 70여 편이 모두 이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후기에만 나타나는 징후는 아니다. 이미 그의 전성기라고나 할 『폐허』기에 표현의 상투성을 통해 몰개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적 형상화는 유행적이고 분위기 있는 것이면 족했지 개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기림(金起林)의 시를 상식 이하의 선으로 혹평하였고,
『조선시단』 8호(1934. 9.)에서 \'최근 시단 개별(槪瞥)\'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림(金起林), 모윤숙(毛允淑), 조영출(趙靈出) 등의 시에 대하여 평을 하면서 김기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1연의 \'아스팔트 우에는 4월의 석양이 조렵고\'라는 구(句)의 소운(所云) \'조렵고\'는 무슨 다른 말의 오식(誤植)이 안일까? 그대로 보면 그 어의(語義)가 통(通)해지지 않는다.
시단의 주제자로 군림하고자 한 황석우가 의지할 수 있는 거점이 \'형용 제일주의\'였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가 담당했던 시단에서의 역할이나 관계를 보건대, 사람 사는 일에는 승하되 시에는 둔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고는 달리 더 찾아 낼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재능의 문제요 가슴의 문제였다.
황석우는 시를 썼으되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인이 아니었다. 오직 물리적 관찰자요, 남들 즐겨 쓰는 말을 조합하여 옮겨 놓는 배우적 인사였을 따름이다. 연극에서 배경의 설정은 곧 극중인물에 대한 설명도 된다는 정도의 이해만 갖추었더라도 그의 시가 그 정도로까지 파탄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시인으로서 파탄했고, 그는 서정에 관한 한 맹목에 다름 없었으며, 그 서정성의 결여가 그의 시를 인간 부재의 시로 만든 것이다.
시인(詩人)의 비시적(非詩的) 몰락(沒落)에 대하여
작가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 하나로 그 위대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가령 셰익스피어 같은 진정한 작가에게도 타작(馱作)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인정한다. 그에게는 타작을 뒤덮을 만한 걸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황석우는 위대한 시인일 수 있다. 그에게 <벽모의 묘>라는 걸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이 작품이 그의 여타 작품과 너무나 다른 세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석우가 어느 작품에서도 빠뜨린 적이 없는 직유도 거기엔 없고, 직설적인 기술도 없다. 당대의 시단 수준으로는 상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동일인에게 이처럼 커다란 간극이 생기는가. 그 단서를 위하여 최남선(崔南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남선은 신체시와 함께 거론되는 사람이다. 그 가치는 나중에 두더라도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온 시인이다. 그런 그가 나중에 철저히 매달린 것은 정형 율격을 버리는 신체시가 아니라 정형으로 돌아가는 창가였다. 그 내용도 서정이나 철학보다는 지리나 역사와 같은 지적(知的) 대상들이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새로운 실험보다는 안정된 의지로 달려가게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시적 재능에서 찾을 도리밖에 없다. 그의 신체시 작품이라 할 <힝 두고>나 <태백산 시집> 등에서 무절제한 산문으로 지나치게 달려가버렸던 그의 시적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재능을 의심하게 된다.
서정이건 인식이건 시의 자루에 담을 알맹이에 승산이 서지 않을 때 시인들이 형식에 매달리는 일은 흔히 보는 사건이다. 최남선이 창가에 매달린 것은 황석우가 형용에 매달린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문단이라 할 무대에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때의 문단이란 출판사의 사장이거나 편집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의 문단을 주무른 황석우는 비시적(非詩的) 행적을 남겼다는 점, 그리고 이 시대에 문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김소월(金素月)과 한용운(韓龍雲) 등은 시사(詩史)에 길이 남아 우리를 \'눈감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은 시인은 물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길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얻는다.
객관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그림에서조차 감정 이입이 요구됨에 비추어본다면 황석우의 시는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니 그것은 실수라기보다 애당초 감동보다는 글엮기에 치중한 그의 태도 또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함이 옳을 듯하다. 그가 노린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형상 그 자체였을 따름이며, 그것도 매우 유행적인 어사의 조합 또는 상투적 제시였다.
시를 쓰는 이유는 한두 가지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어째야 시가 되는가는 대상을 통한 인간의 인식과 발견을 함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감동도 정서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황석우는 그 점에 소흘하였다. 저가 느끼고 저가 제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그저 그려 내기에 급급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화관의 간판이나 이발소 그림을 그리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실의 근거를 우리는 그가 즐겨 사용한 역은유에서 찾을 수 있다.
밤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달은
그를 숭배(崇拜)하는 처녀(處女)들과
힝는 그의 친(親)한 동창(同窓)의 벗들의
니마 힝 식기렴갓치 보이고
낫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태양(太陽)은
산(山)골작이의 맑은 물 가운데
가슴 헛치고
목물하려 힝여듬과 갓치 보인다.
이 시에는 표현의 주체가 제거되어 있다. 아니 몰인간(沒人間)이라고 함이 옳다. 비유의 공식을 연습이나 하듯이 그저 그리기만 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아무런 감정적 공감도 없고, 개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후기 작품 70여 편이 모두 이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후기에만 나타나는 징후는 아니다. 이미 그의 전성기라고나 할 『폐허』기에 표현의 상투성을 통해 몰개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적 형상화는 유행적이고 분위기 있는 것이면 족했지 개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기림(金起林)의 시를 상식 이하의 선으로 혹평하였고,
『조선시단』 8호(1934. 9.)에서 \'최근 시단 개별(槪瞥)\'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림(金起林), 모윤숙(毛允淑), 조영출(趙靈出) 등의 시에 대하여 평을 하면서 김기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1연의 \'아스팔트 우에는 4월의 석양이 조렵고\'라는 구(句)의 소운(所云) \'조렵고\'는 무슨 다른 말의 오식(誤植)이 안일까? 그대로 보면 그 어의(語義)가 통(通)해지지 않는다.
시단의 주제자로 군림하고자 한 황석우가 의지할 수 있는 거점이 \'형용 제일주의\'였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가 담당했던 시단에서의 역할이나 관계를 보건대, 사람 사는 일에는 승하되 시에는 둔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고는 달리 더 찾아 낼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재능의 문제요 가슴의 문제였다.
황석우는 시를 썼으되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인이 아니었다. 오직 물리적 관찰자요, 남들 즐겨 쓰는 말을 조합하여 옮겨 놓는 배우적 인사였을 따름이다. 연극에서 배경의 설정은 곧 극중인물에 대한 설명도 된다는 정도의 이해만 갖추었더라도 그의 시가 그 정도로까지 파탄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시인으로서 파탄했고, 그는 서정에 관한 한 맹목에 다름 없었으며, 그 서정성의 결여가 그의 시를 인간 부재의 시로 만든 것이다.
시인(詩人)의 비시적(非詩的) 몰락(沒落)에 대하여
작가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 하나로 그 위대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가령 셰익스피어 같은 진정한 작가에게도 타작(馱作)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인정한다. 그에게는 타작을 뒤덮을 만한 걸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황석우는 위대한 시인일 수 있다. 그에게 <벽모의 묘>라는 걸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이 작품이 그의 여타 작품과 너무나 다른 세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석우가 어느 작품에서도 빠뜨린 적이 없는 직유도 거기엔 없고, 직설적인 기술도 없다. 당대의 시단 수준으로는 상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동일인에게 이처럼 커다란 간극이 생기는가. 그 단서를 위하여 최남선(崔南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남선은 신체시와 함께 거론되는 사람이다. 그 가치는 나중에 두더라도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온 시인이다. 그런 그가 나중에 철저히 매달린 것은 정형 율격을 버리는 신체시가 아니라 정형으로 돌아가는 창가였다. 그 내용도 서정이나 철학보다는 지리나 역사와 같은 지적(知的) 대상들이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새로운 실험보다는 안정된 의지로 달려가게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시적 재능에서 찾을 도리밖에 없다. 그의 신체시 작품이라 할 <힝 두고>나 <태백산 시집> 등에서 무절제한 산문으로 지나치게 달려가버렸던 그의 시적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재능을 의심하게 된다.
서정이건 인식이건 시의 자루에 담을 알맹이에 승산이 서지 않을 때 시인들이 형식에 매달리는 일은 흔히 보는 사건이다. 최남선이 창가에 매달린 것은 황석우가 형용에 매달린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문단이라 할 무대에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때의 문단이란 출판사의 사장이거나 편집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의 문단을 주무른 황석우는 비시적(非詩的) 행적을 남겼다는 점, 그리고 이 시대에 문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김소월(金素月)과 한용운(韓龍雲) 등은 시사(詩史)에 길이 남아 우리를 \'눈감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은 시인은 물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길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얻는다.
추천자료
 스콜라주의 교육목적론
스콜라주의 교육목적론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정신의학적 증상론
정신의학적 증상론 [수학교육론] 폴리아 문제해결 교육론의 심리학적 배경
[수학교육론] 폴리아 문제해결 교육론의 심리학적 배경 [조직행동론] 재미경영 사례 조사
[조직행동론] 재미경영 사례 조사 [정신건강론] 적응문제와 정신건강
[정신건강론] 적응문제와 정신건강 전문학과 금오신화론 요약
전문학과 금오신화론 요약 [서양철학론] 흄의 인식론
[서양철학론] 흄의 인식론 [불교문학론] 십우도와 선시
[불교문학론] 십우도와 선시 [보육교사론] 내가 생각하는 ‘보육교사상’을 서술하기
[보육교사론] 내가 생각하는 ‘보육교사상’을 서술하기 (가족복지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요약정리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복지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요약정리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복지론] 재혼가정 {재혼가족의 개념, 관련 법, 실태, 문제점}
[가족복지론] 재혼가정 {재혼가족의 개념, 관련 법, 실태, 문제점} [가족복지론]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이론적 특성과 개입 기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해결중심]
[가족복지론]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이론적 특성과 개입 기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해결중심] ★ 조직행동론 - 조직문화 (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및 기능 ,조직문화의 역할 ,기업사례 ,긍정...
★ 조직행동론 - 조직문화 (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및 기능 ,조직문화의 역할 ,기업사례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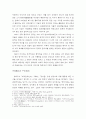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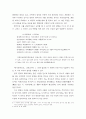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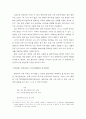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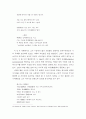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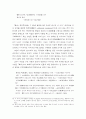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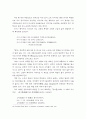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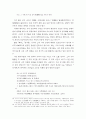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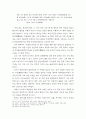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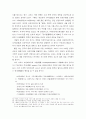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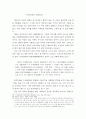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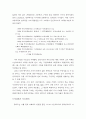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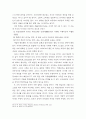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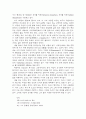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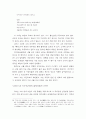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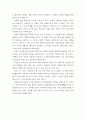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