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Ⅱ. 스트레스의 발생 요건
Ⅲ. 스트레스의 증후 발견
Ⅳ.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대응
Ⅴ. 佛敎와 禪의 스트레스 認知의 방향
Ⅵ. 境界를 통한 스트레스의 克服
Ⅶ. 경계를 극복하는 공부심
Ⅰ.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Ⅱ. 스트레스의 발생 요건
Ⅲ. 스트레스의 증후 발견
Ⅳ.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대응
Ⅴ. 佛敎와 禪의 스트레스 認知의 방향
Ⅵ. 境界를 통한 스트레스의 克服
Ⅶ. 경계를 극복하는 공부심
본문내용
사의훈습(不思議熏習)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가사의 훈습은 사람의 인연 습관에 사로잡혀 상식으로 사량해 나가는 훈습이니 이것은 중생들이 훈습해나가는 모습을 이름이요, 부사의 훈습은 그 무엇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사량할 수 없는 훈습이니 이것은 곧 자성의 본래인 진여(眞如)에 돌아가는 훈습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사의 훈습은 곧 중생에 사로잡힘이 없는 본연의 진경에 이르기 위한 훈습이라고 원효는 밝히고 있다. 이것이 선가에서 자주 말하는 성품의 본래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부사의 훈습의 진경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공부길이다. 천만 경계를 극복하는 부사의 훈습에 이르는 길은 곧 다양한 방법으로 밝히고 있었던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천만경계에도 도심이 상하지 않게 하는 공부는 곧 천만경계중에서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로서 어느 곳에서나 물들고 썩이지 않는 공부를 연마하는 길로 밝힌 것이다.
가) 성품을 찾아 공부하면 철주(鐵柱)의 중심이 되고 석벽(石壁)의 외면(外面)이 된다.
나) 염기즉(念起卽) 각(覺), 각즉무(覺卽無)
다) 불천로(不遷怒) 불이과(不二過)
라) 외불방입(外不放入) 내불방출(內不放出)
마) 니불(泥佛)은 부도수(不渡水), 목불(木佛)은 부도화(不渡火), 금불(金佛)은 부도로(不渡爐)이나 오직 자성불(自性佛)만은 능힌 도중생세계(能渡衆生世界)한다..
이상을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능히 마음의 자유를 얻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낼수 있다. 그 의지가 곧 육조대사가 밝힌 법문:『육근(六根)이 육진중(六塵中)에 출입(出入)하되 물들지도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내거(來去)를 자유(自由)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 천만 경계를 당하면 곧 공부할때가 돌아왔다는 심경으로 스스로 공부심을 갖이고 그 경계를 극복하여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을 밝힌 것이다.
Ⅶ 경계를 극복하는 공부심
우리는 자주 스트레스에 당하여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간다. 그러나 어느 새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안타깝게 발견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계(境界)인 줄 모르고 경계를 겪는 경우와 경계임을 알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대처하고 이를 당하는 경우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경계속에서 자기의 습관만을 가중하는 것과, 자기의 습관임을 깨달어 스스로의 마음에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는 것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특히 우리는 지난 날, 예기치 못한 경계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습관과 서로 만나저 또 하나의 업(業)을 쌓아가면 사로잡혀 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속에 말려들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어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禪) 공부 하는 사람은 경계를 당하면 먼저 자성에 반조할 것이요, 자성에 반조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계에 따라 생겼던 망념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예요 선을 통해 보림(保任)하는 공부인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몇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밝혀 경계 속에서 능히 공부하는 길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천만 경계를 당하여도 우리는 먼저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하는 공부가 공부의 과제이다.
우리는 선(禪)공부를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공부라 할 것이요, 또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부동하게 되는 공부가 곧 정(定)공부인 것이다. 여기에서 천만 경계에 부동하는 공부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희로애락에 사로잡혀지는 요란한 경계를 당한다 해도 오직 한 생각 부동하는 마음을 대중하여 살게 되면 그것이 곧 공부심이 아닐 수 없다. 이 마음이 영원히 동하지 아니하고 한 생각 변질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능히 큰 공부를 하는 길이 된다. 일단 경계에 동하여 마음이 일어나서 한 생각 마음의 상처를 갖었다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살지 말 것이다. 무엇에 끌려 한 번 동하게 되었다 해도 그 마음을 속깊히 참회하고 다시는 동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동했다는 상을 놓고 심력을 잡아서 본연심(本然心)을 회복하는 공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청정해지는 원리가 생기게 된다. 이 마음 온전하게 바로 잡게 되면 곧 자성이 청정해저서 한 마음 온전한 심경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본연심이 항상 안정을 얻게 된다.
2. 천만 경계를 당할때에 그 것이 능히 공부하는 꺼리요 실천교재로 보는 공부이니 이것이 곧 그 마음으로 능히 공부심을 대조할 것.
우리는 흔히 경계는 버려야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 경계는 공부를 실천하게하는 큰 교재이다. 따라서 경계없이는 공부하는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경계없이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울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공부속에 일하고 일속에 공부하는 길로서 이것이 능히 둘이 아닌 한 마음의 대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속에 공부하는 것은 곧 일하는 고재를 경계에서 찾어내야 하고, 공부속에서 일을 찾는 것도 또한 경계 속에서 일과 함께하는 공부의 꺼리를 찾어내야 한다. 이 경계속에서 찾는 교재는 꾸준한 일기(日記)를 통해서 경계에 대하는 공부를 하는 경우와 경계속에 기도하는 심경으로 찾는 공부이니 그 마음을 반조하는 공부가 바로 경계속에서 찾어야 한다.
3. 천만경계를 당할 때 보은하는 대상을 삼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천만 경계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곧 우리의 진리요 알고보면 큰 은혜가 얼굴을 달리하고 현전한 것임을 돌려 생각하고 은혜에 보은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심경으로 경계를 대하는 공부를 찾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히 은혜에 보은 하는 길이되어 능히 스트레스가 자연히 사라지고 한생각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천만경계를 대할 때 능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변화된것임을 알고 안정된 심경으로 경계를 대하자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스트레스는 우리의 공부꺼리요, 일꺼리며, 또한 복을 작만하는 꺼리임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꺼리이다.
이런 점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부사의 훈습의 진경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공부길이다. 천만 경계를 극복하는 부사의 훈습에 이르는 길은 곧 다양한 방법으로 밝히고 있었던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천만경계에도 도심이 상하지 않게 하는 공부는 곧 천만경계중에서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로서 어느 곳에서나 물들고 썩이지 않는 공부를 연마하는 길로 밝힌 것이다.
가) 성품을 찾아 공부하면 철주(鐵柱)의 중심이 되고 석벽(石壁)의 외면(外面)이 된다.
나) 염기즉(念起卽) 각(覺), 각즉무(覺卽無)
다) 불천로(不遷怒) 불이과(不二過)
라) 외불방입(外不放入) 내불방출(內不放出)
마) 니불(泥佛)은 부도수(不渡水), 목불(木佛)은 부도화(不渡火), 금불(金佛)은 부도로(不渡爐)이나 오직 자성불(自性佛)만은 능힌 도중생세계(能渡衆生世界)한다..
이상을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능히 마음의 자유를 얻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낼수 있다. 그 의지가 곧 육조대사가 밝힌 법문:『육근(六根)이 육진중(六塵中)에 출입(出入)하되 물들지도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내거(來去)를 자유(自由)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 천만 경계를 당하면 곧 공부할때가 돌아왔다는 심경으로 스스로 공부심을 갖이고 그 경계를 극복하여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을 밝힌 것이다.
Ⅶ 경계를 극복하는 공부심
우리는 자주 스트레스에 당하여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간다. 그러나 어느 새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안타깝게 발견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계(境界)인 줄 모르고 경계를 겪는 경우와 경계임을 알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대처하고 이를 당하는 경우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경계속에서 자기의 습관만을 가중하는 것과, 자기의 습관임을 깨달어 스스로의 마음에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는 것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특히 우리는 지난 날, 예기치 못한 경계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습관과 서로 만나저 또 하나의 업(業)을 쌓아가면 사로잡혀 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속에 말려들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어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禪) 공부 하는 사람은 경계를 당하면 먼저 자성에 반조할 것이요, 자성에 반조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계에 따라 생겼던 망념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예요 선을 통해 보림(保任)하는 공부인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몇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밝혀 경계 속에서 능히 공부하는 길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천만 경계를 당하여도 우리는 먼저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하는 공부가 공부의 과제이다.
우리는 선(禪)공부를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공부라 할 것이요, 또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부동하게 되는 공부가 곧 정(定)공부인 것이다. 여기에서 천만 경계에 부동하는 공부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희로애락에 사로잡혀지는 요란한 경계를 당한다 해도 오직 한 생각 부동하는 마음을 대중하여 살게 되면 그것이 곧 공부심이 아닐 수 없다. 이 마음이 영원히 동하지 아니하고 한 생각 변질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능히 큰 공부를 하는 길이 된다. 일단 경계에 동하여 마음이 일어나서 한 생각 마음의 상처를 갖었다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살지 말 것이다. 무엇에 끌려 한 번 동하게 되었다 해도 그 마음을 속깊히 참회하고 다시는 동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동했다는 상을 놓고 심력을 잡아서 본연심(本然心)을 회복하는 공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청정해지는 원리가 생기게 된다. 이 마음 온전하게 바로 잡게 되면 곧 자성이 청정해저서 한 마음 온전한 심경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본연심이 항상 안정을 얻게 된다.
2. 천만 경계를 당할때에 그 것이 능히 공부하는 꺼리요 실천교재로 보는 공부이니 이것이 곧 그 마음으로 능히 공부심을 대조할 것.
우리는 흔히 경계는 버려야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 경계는 공부를 실천하게하는 큰 교재이다. 따라서 경계없이는 공부하는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경계없이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울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공부속에 일하고 일속에 공부하는 길로서 이것이 능히 둘이 아닌 한 마음의 대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속에 공부하는 것은 곧 일하는 고재를 경계에서 찾어내야 하고, 공부속에서 일을 찾는 것도 또한 경계 속에서 일과 함께하는 공부의 꺼리를 찾어내야 한다. 이 경계속에서 찾는 교재는 꾸준한 일기(日記)를 통해서 경계에 대하는 공부를 하는 경우와 경계속에 기도하는 심경으로 찾는 공부이니 그 마음을 반조하는 공부가 바로 경계속에서 찾어야 한다.
3. 천만경계를 당할 때 보은하는 대상을 삼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천만 경계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곧 우리의 진리요 알고보면 큰 은혜가 얼굴을 달리하고 현전한 것임을 돌려 생각하고 은혜에 보은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심경으로 경계를 대하는 공부를 찾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히 은혜에 보은 하는 길이되어 능히 스트레스가 자연히 사라지고 한생각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천만경계를 대할 때 능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변화된것임을 알고 안정된 심경으로 경계를 대하자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스트레스는 우리의 공부꺼리요, 일꺼리며, 또한 복을 작만하는 꺼리임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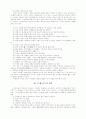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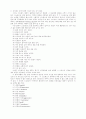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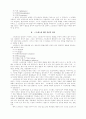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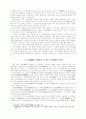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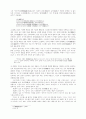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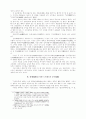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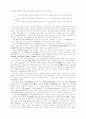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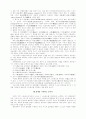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