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Ⅴ.경기체가
Ⅵ. 악 장
Ⅶ. 시 조
Ⅷ. 가 사
Ⅸ.민 요
Ⅹ. 희곡
?.설화
?.소설
ⅩⅢ . 수필
ⅩⅣ . 평론
Ⅵ. 악 장
Ⅶ. 시 조
Ⅷ. 가 사
Ⅸ.민 요
Ⅹ. 희곡
?.설화
?.소설
ⅩⅢ . 수필
ⅩⅣ . 평론
본문내용
相當히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詩話에도 中國의 詩話 以前에도 저와 같이 歌謠에 대하여 詩의 批評과 마찬가지로 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緣由이기에 日本詩話의 경우는 初期에는 詩의 學習을 爲主로 하는 詩談.詩法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峻嚴하고 深奧한 詩의 批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2. 古代評論의 性格
韓國 뿐만 아니라, 中國.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古代評論의 性格은 순수하고 전문적인 批評이 아니라, 그 資料가 隨筆形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評論書가 獨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隨筆.雜著.稗說說類에 混合되어 있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이제 古代評論을 살펴보건대 詩評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3. 評論의 資料
評論資料는 詩話가 大部分이다.
4.詩評의 大綱
1) 高麗時代의 用事와 新意
(1)用事論
用事란 故事를 사용한다는 준말이고 故事란 말은 單純한 옛일이란 \'故事\' 만이 아니라 \'古意 \'.古語\'.\'古人\'. \'古詩句\'등 모든 典故를 意味한다.
(가)換骨奪胎論
換骨奪胎는 內容面의 變異를 意味하기 보다는 오히려 外飾的 모양의 變異를 의미하는 境遇가 더욱 常例的인 것으로 보아진다. 故事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꾸어 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나 개선을 할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하고, 다만 그 言語의 수식만으로서 詩에 능하다 하여 足히 여기고 있던 것이, 바로 이 綺麗만을 지상목표로 삼던 用事論者들의 詩觀이었던 것이다.
(나)琢句法
이들은 의미내용에 변화를 試圖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字句의 단련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 字句의 단련을 곧 琢句法이라고 칭하였다 琢句란 글자 그대로 句를 쪼아서 잘 조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新意論
高麗詩論의 내용론은 사실상 氣를 설명하거나 情을 설명하거나 모두 新意論의 보충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高麗詩論의 내용론은, 곧 新意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 李奎報의 主意論
詩句를 雕鏤丹靑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웁기는 하나, 그러나 만일 含蓄深厚한 意가 없을 것 같으면, 처음에는 비록 볼만하나 거듭 볼수록 맛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優→ 以意爲主(達意氣) → 含蓄深厚 → (內容)
天-----氣 |
|
+---劣 → 雕文爲工(綺麗文辭) →浮靡淺薄 →(形式)
나) 崔滋의 主氣論
崔滋의 詩論을 종합해 볼 때에 新意를 주장하되 수사면을 또한 무시하지 않았고, 단 用事에서 벗어나서 표절에 이르는 것은 추호도 용납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新意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意의 근본이 되는 氣에 들어가서, 그 氣의 豪邁하고 壯逸한 경지, 즉 다시 맣하면 李奎報가 주장하는 氣의 優秀者를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崔滋의 主氣論은 생각컨대 아무리 剽竊風을 논박하고 新意를 崇尙하려한들, 그 근본문제를 천명해 내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나머지, 새로이 일보 전진시켜서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진다.
2) 朝鮮初期의 修辭論
文章으로 가장 이름 높은 이가 바로 徐居正이다 .그는 詩에 대해서 탁견을 가지고 <東人詩話>를 저술하였는 데, 詩에 있어서는 文章修辭보다는 오히려 기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朝鮮朝 初期에는 故事使用, 즉 用事手段과 對遇法이 시론의 主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故事使用은 飜案法으로, 對遇는 音借對와 扇對 등에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詩話, 즉 詩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修辭論이 主가 되었던 것이다.
3)朝鮮中期의 尊唐論
조선조 초기의 修辭論은 곧 宋詩의 연장인 셈이다. 宋詩의 뒤에는 黃山谷이 조직한 江西詩派의 영향으로 오로지 綺麗한 修辭에만 힘쓰고 詩의 意味內容을 등한히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明나라에 이르러서 前.後七子들에 의하여 復古派의 尊唐論이 일에 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히 宋詩로부터 唐詩로 옮아 가는 추세가 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自我論
앞서의 시평들은 盛唐第一主義를 주장해서 겨우 唐詩를 모방할 뿐, 마침내 自己的인 詩論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自我覺醒을 통하여 일어난 自我論이 일면서 이 시기에는 詩의 잘잘못을 막론하고 반드시 自己의 情感을 표현하여야 되었던 것이다.
自我의 참된 感情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農岩.西浦 뿐만 아니라, 당시에 洪萬宗의 <旬五志>등에서 論한 禪도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 이러한 詩論은 대개 시대적 自覺期의 所産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5)理學影響論
한편 尊尊唐論의 詩論이 일고 나서 이어서 詩論上에 理學的 영향의 詩話가 또 있었다. 중국의 詩論은 楊萬里.嚴羽 등이 禪學으로 詩를 比喩하고 禪學으로 詩를 說明한 이래로 詩話家에서 많이 그 說을 採擇하여 드디어는 格調.神韻說을 産出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說이 弊端이 있으므로 또 性靈說을 釀生하기에 이르렀다.
中國에서는 禪學으로 詩를 比兪하여 格調로 發展하고 그 矛盾으로 神韻說이 나오고, 또 모자라서 性靈說이 나오고 그래도 不足하여 期理說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히려 執一而失一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여기에 比해서 우리가 儒學의 理氣說을 빌어서 詩學을 比喩한 것은 그 理論이 整然하여 數百年 硏討한 中國의 詩理論보다 오히려 더욱 우수한 理論을 發明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진다.
5. 結 語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許多한 詩論은 形式論이 아니면 內容論에 屬한다. 中國에서의 唐代와 元.明 詩論의 詩格. 詩式 등과 明. 淸代의 格調神韻說등은 모두 形式論에 해당하고 宋代의 理氣詩論이라든가 淸代의 性靈 . 肌理說은 內容論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高麗詩論의 핵심인 新意와 用事는 內容과 形式의 對立이었고, 朝鮮初의 修辭論은 勿論 形式論에 해당되고, 그 後에 나타난 自我論은 內容說에 해당된다. 但 理氣論의 理說은 內容, 氣說은 形式論으로 볼 수 있다. 이 內容과 形式의 問題는 어느 時代, 어느 地域에서나 모두 있을 수 있는 理說으로서 어느 한 쪽을 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때문에 이 두가지는 수레의 輪과 새의 翼이 서로 도와야 완벽하게 작용하듯이 詩論에서도 이 兩說을 균형있게 받아들여서 서로 攻擊하거나 害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古代評論의 性格
韓國 뿐만 아니라, 中國.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古代評論의 性格은 순수하고 전문적인 批評이 아니라, 그 資料가 隨筆形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評論書가 獨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隨筆.雜著.稗說說類에 混合되어 있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이제 古代評論을 살펴보건대 詩評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3. 評論의 資料
評論資料는 詩話가 大部分이다.
4.詩評의 大綱
1) 高麗時代의 用事와 新意
(1)用事論
用事란 故事를 사용한다는 준말이고 故事란 말은 單純한 옛일이란 \'故事\' 만이 아니라 \'古意 \'.古語\'.\'古人\'. \'古詩句\'등 모든 典故를 意味한다.
(가)換骨奪胎論
換骨奪胎는 內容面의 變異를 意味하기 보다는 오히려 外飾的 모양의 變異를 의미하는 境遇가 더욱 常例的인 것으로 보아진다. 故事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꾸어 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나 개선을 할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하고, 다만 그 言語의 수식만으로서 詩에 능하다 하여 足히 여기고 있던 것이, 바로 이 綺麗만을 지상목표로 삼던 用事論者들의 詩觀이었던 것이다.
(나)琢句法
이들은 의미내용에 변화를 試圖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字句의 단련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 字句의 단련을 곧 琢句法이라고 칭하였다 琢句란 글자 그대로 句를 쪼아서 잘 조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新意論
高麗詩論의 내용론은 사실상 氣를 설명하거나 情을 설명하거나 모두 新意論의 보충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高麗詩論의 내용론은, 곧 新意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 李奎報의 主意論
詩句를 雕鏤丹靑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웁기는 하나, 그러나 만일 含蓄深厚한 意가 없을 것 같으면, 처음에는 비록 볼만하나 거듭 볼수록 맛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優→ 以意爲主(達意氣) → 含蓄深厚 → (內容)
天-----氣 |
|
+---劣 → 雕文爲工(綺麗文辭) →浮靡淺薄 →(形式)
나) 崔滋의 主氣論
崔滋의 詩論을 종합해 볼 때에 新意를 주장하되 수사면을 또한 무시하지 않았고, 단 用事에서 벗어나서 표절에 이르는 것은 추호도 용납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新意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意의 근본이 되는 氣에 들어가서, 그 氣의 豪邁하고 壯逸한 경지, 즉 다시 맣하면 李奎報가 주장하는 氣의 優秀者를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崔滋의 主氣論은 생각컨대 아무리 剽竊風을 논박하고 新意를 崇尙하려한들, 그 근본문제를 천명해 내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나머지, 새로이 일보 전진시켜서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진다.
2) 朝鮮初期의 修辭論
文章으로 가장 이름 높은 이가 바로 徐居正이다 .그는 詩에 대해서 탁견을 가지고 <東人詩話>를 저술하였는 데, 詩에 있어서는 文章修辭보다는 오히려 기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朝鮮朝 初期에는 故事使用, 즉 用事手段과 對遇法이 시론의 主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故事使用은 飜案法으로, 對遇는 音借對와 扇對 등에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詩話, 즉 詩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修辭論이 主가 되었던 것이다.
3)朝鮮中期의 尊唐論
조선조 초기의 修辭論은 곧 宋詩의 연장인 셈이다. 宋詩의 뒤에는 黃山谷이 조직한 江西詩派의 영향으로 오로지 綺麗한 修辭에만 힘쓰고 詩의 意味內容을 등한히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明나라에 이르러서 前.後七子들에 의하여 復古派의 尊唐論이 일에 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히 宋詩로부터 唐詩로 옮아 가는 추세가 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自我論
앞서의 시평들은 盛唐第一主義를 주장해서 겨우 唐詩를 모방할 뿐, 마침내 自己的인 詩論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自我覺醒을 통하여 일어난 自我論이 일면서 이 시기에는 詩의 잘잘못을 막론하고 반드시 自己의 情感을 표현하여야 되었던 것이다.
自我의 참된 感情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農岩.西浦 뿐만 아니라, 당시에 洪萬宗의 <旬五志>등에서 論한 禪도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 이러한 詩論은 대개 시대적 自覺期의 所産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5)理學影響論
한편 尊尊唐論의 詩論이 일고 나서 이어서 詩論上에 理學的 영향의 詩話가 또 있었다. 중국의 詩論은 楊萬里.嚴羽 등이 禪學으로 詩를 比喩하고 禪學으로 詩를 說明한 이래로 詩話家에서 많이 그 說을 採擇하여 드디어는 格調.神韻說을 産出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說이 弊端이 있으므로 또 性靈說을 釀生하기에 이르렀다.
中國에서는 禪學으로 詩를 比兪하여 格調로 發展하고 그 矛盾으로 神韻說이 나오고, 또 모자라서 性靈說이 나오고 그래도 不足하여 期理說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히려 執一而失一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여기에 比해서 우리가 儒學의 理氣說을 빌어서 詩學을 比喩한 것은 그 理論이 整然하여 數百年 硏討한 中國의 詩理論보다 오히려 더욱 우수한 理論을 發明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진다.
5. 結 語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許多한 詩論은 形式論이 아니면 內容論에 屬한다. 中國에서의 唐代와 元.明 詩論의 詩格. 詩式 등과 明. 淸代의 格調神韻說등은 모두 形式論에 해당하고 宋代의 理氣詩論이라든가 淸代의 性靈 . 肌理說은 內容論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高麗詩論의 핵심인 新意와 用事는 內容과 形式의 對立이었고, 朝鮮初의 修辭論은 勿論 形式論에 해당되고, 그 後에 나타난 自我論은 內容說에 해당된다. 但 理氣論의 理說은 內容, 氣說은 形式論으로 볼 수 있다. 이 內容과 形式의 問題는 어느 時代, 어느 地域에서나 모두 있을 수 있는 理說으로서 어느 한 쪽을 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때문에 이 두가지는 수레의 輪과 새의 翼이 서로 도와야 완벽하게 작용하듯이 詩論에서도 이 兩說을 균형있게 받아들여서 서로 攻擊하거나 害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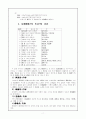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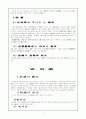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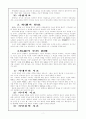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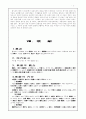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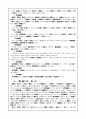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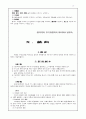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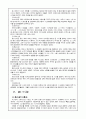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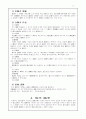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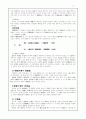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