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연구동향
3. 양천제(良賤制)의 성립배경
4. 양천제
(1)양천제설
(2)양천제의 전개
5. 양천제의 변화
(1)반상제로의 변화
(2)신분제의 붕괴
6. 결론
<참고문헌>
2. 연구동향
3. 양천제(良賤制)의 성립배경
4. 양천제
(1)양천제설
(2)양천제의 전개
5. 양천제의 변화
(1)반상제로의 변화
(2)신분제의 붕괴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적으로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다. 즉 양천제에서 양신분이 국역을 담당하고 천신분을 그것을 담당하지 않는 구조로부터, 양반층은 국역에서 면제되고 상민층은 그것을 부담하는 반상제로 변화한 것이다.
16세기말 17세기초에 걸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왕조교체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양반계층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나는 한편 전쟁후의 양반사회는 계속적인 당쟁을 통해 그 자체를 분화시켜갔다. 양반 중 계속 정권에 참여한 양반을 벌열, 정권에서 소외되어 지방에 토착하여 기반을 가진 양반을 향반, 향반 중에서 가세가 몰락하여 쇠잔한 양반을 잔반(殘班)이라 하였다. 향반은 벌열에 비하여 지위가 떨어졌으며, 잔반은 대부분 소작농이 되었는데 잔반의 수는 점차 늘어갔다. 몰락해 가는 양반층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가 실학자들처럼 농민층의 편에 가까워지기는 했으나 아직 그들과 일체화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한편, 뒷날의 이필제·전봉준 등과 같이 농민층과 이해가 거의 일치해져서 그 역사의식을 높이고 농민층을 위한 정치적 변혁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처지로 바뀌어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6세기경부터 이와 같은 규제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양반인구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조선왕조시대 전체에 걸친, 그리고 전국적인 신분별 인구통계를 근거로 한 양반인구의 수를 밝힐 만한 자료는 아직 구할 수 없다. 다만 특정의 지역의 호적대장을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호적상에 나타난 신분별 인구수의 변화현상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11)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 신분의 붕괴〉,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2년
양인이나 천인이 납속이나 공명첩 매입을 통해 호적상으로 양반이 되었다 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마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제상으로 양반신분을 얻은 그들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법제적 신분과 경제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양반으로 변해갔다. 먼저 상당히 오래된 연구업적이긴 하지만 경상도 대구지방의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문호개방 이전에 이미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이 실증된다. 자료에 따라 1690년을 제1기로, 1729년과 1732년을 제2기로, 1783년과 1786년, 1789년을 묶어 제3기로, 1858년을 제4기로 잡은 이 연구에 의하면, 각 신분별 戶數가 전체 호수에서 차지한 비율은 표1과 같다.
<표 1>대구지방의 신분별 호구수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합 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1기
290
9.2
1,694
53.7
1,172
37.1
3,156
100
2기
579
18.7
1,689
54.6
824
26.6
3,092
100
3기
1,055
37.5
1,616
57.5
140
5.0
2,810
100
4기
2,099
70.3
842
28.2
44
1.5
2,985
100
<표1>에서와 같이 제1기 즉 1690년에서 제4기 1858년까지 168년 사이에 전체 호수 중에서 양반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9.2%에서 70.3%로 무려 76배나 증가했다. 대구가 도회지여서 경제력 높은 비양반층이 많았고 그들이 양반신분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곳에 비해 양반호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제1기인 1690년의 양반호 비유이 9.2%나 된 것은 15세기나 16세기에 비해 이미 양반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 생각되며, 더구나 그 이후 양반호 비율의 급증은 놀랄 만 한다. 더구나 이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 양반호 1호당 평균 인구는 왕조기와 큰 변호가 없어서 제1기에는 3.5명이었고 제4기에는 3.1명이었다. 1호당 평균 인구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면서 양반호의 비율이 7.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곧 실제로 양반인구가 그 비율만큼 증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시대의 영남지방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양반과 노비 인구도 또한 가장 많았다. 영남지방은 ‘추노지향(鄒魯之鄕)’ 등으로 불리어 신분질서의 뿌리가 깊은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영남지방의 양반수 증가로 인한 그 권위의 실추와 중세적 신분질서의 와해 현상에 비추어 다른 지방의 추세를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약용이 \"나라 안의 사람이 모두 양반이 되면 양반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말은 이와 같은 양반수의 증가추세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은 신분구조의 변동을 가속화시켰다.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광작, 경영형 부농 및 양인지주의 출현, 상업작물의 확대 재배 등은 농촌사회를 변질시켰고 농민층을 분화시켜 신분제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의 농민층 분해는 특히 소작지의 보유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의 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형 부농의 성장과 소작지 집적은 다른 한편에서 빈농 및 무전농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몰락농민들은 유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부를 통해 노비와 양인층이 각각 양인이나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 신분층은 격증하고 반대로 피지배 신분층은 격감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이준구, 《조선후기 양반신분이동에 관한》, 일조각, 1981년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탐구실, 《조선신분사 탐구》, 현문사, 1987년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신분의 붕괴》, 성대대동문화연구원, 1972년
강만길, 《조선후기 고립제 발달》, 한국사연구, 1976년
최영희,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사회변동, 신분제도》, 사학연구, 1963년
유승원, 《朝鮮初期 身分制 硏究 》, 乙酉文化社 , 1987년
이성무, 〈朝鮮初期 身分史硏究의 再檢討〉《역사학보》102호, 역사학회, 1984년
한영우, 〈朝鮮初期 社會階層 硏究에 대한 再論〉《 韓國史論 12》, 국사편찬위원회, 1983년
이성무, 《 朝鮮初期 兩班硏究 》, 一潮閣, 1981년
송준호, 《朝鮮社會史硏究 :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硏究》, 一潮閣,
1987년
16세기말 17세기초에 걸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왕조교체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양반계층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나는 한편 전쟁후의 양반사회는 계속적인 당쟁을 통해 그 자체를 분화시켜갔다. 양반 중 계속 정권에 참여한 양반을 벌열, 정권에서 소외되어 지방에 토착하여 기반을 가진 양반을 향반, 향반 중에서 가세가 몰락하여 쇠잔한 양반을 잔반(殘班)이라 하였다. 향반은 벌열에 비하여 지위가 떨어졌으며, 잔반은 대부분 소작농이 되었는데 잔반의 수는 점차 늘어갔다. 몰락해 가는 양반층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가 실학자들처럼 농민층의 편에 가까워지기는 했으나 아직 그들과 일체화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한편, 뒷날의 이필제·전봉준 등과 같이 농민층과 이해가 거의 일치해져서 그 역사의식을 높이고 농민층을 위한 정치적 변혁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처지로 바뀌어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6세기경부터 이와 같은 규제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양반인구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조선왕조시대 전체에 걸친, 그리고 전국적인 신분별 인구통계를 근거로 한 양반인구의 수를 밝힐 만한 자료는 아직 구할 수 없다. 다만 특정의 지역의 호적대장을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호적상에 나타난 신분별 인구수의 변화현상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11)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 신분의 붕괴〉,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2년
양인이나 천인이 납속이나 공명첩 매입을 통해 호적상으로 양반이 되었다 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마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제상으로 양반신분을 얻은 그들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법제적 신분과 경제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양반으로 변해갔다. 먼저 상당히 오래된 연구업적이긴 하지만 경상도 대구지방의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문호개방 이전에 이미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이 실증된다. 자료에 따라 1690년을 제1기로, 1729년과 1732년을 제2기로, 1783년과 1786년, 1789년을 묶어 제3기로, 1858년을 제4기로 잡은 이 연구에 의하면, 각 신분별 戶數가 전체 호수에서 차지한 비율은 표1과 같다.
<표 1>대구지방의 신분별 호구수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합 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호 수
백분비
1기
290
9.2
1,694
53.7
1,172
37.1
3,156
100
2기
579
18.7
1,689
54.6
824
26.6
3,092
100
3기
1,055
37.5
1,616
57.5
140
5.0
2,810
100
4기
2,099
70.3
842
28.2
44
1.5
2,985
100
<표1>에서와 같이 제1기 즉 1690년에서 제4기 1858년까지 168년 사이에 전체 호수 중에서 양반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9.2%에서 70.3%로 무려 76배나 증가했다. 대구가 도회지여서 경제력 높은 비양반층이 많았고 그들이 양반신분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곳에 비해 양반호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제1기인 1690년의 양반호 비유이 9.2%나 된 것은 15세기나 16세기에 비해 이미 양반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 생각되며, 더구나 그 이후 양반호 비율의 급증은 놀랄 만 한다. 더구나 이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 양반호 1호당 평균 인구는 왕조기와 큰 변호가 없어서 제1기에는 3.5명이었고 제4기에는 3.1명이었다. 1호당 평균 인구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면서 양반호의 비율이 7.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곧 실제로 양반인구가 그 비율만큼 증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시대의 영남지방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양반과 노비 인구도 또한 가장 많았다. 영남지방은 ‘추노지향(鄒魯之鄕)’ 등으로 불리어 신분질서의 뿌리가 깊은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영남지방의 양반수 증가로 인한 그 권위의 실추와 중세적 신분질서의 와해 현상에 비추어 다른 지방의 추세를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약용이 \"나라 안의 사람이 모두 양반이 되면 양반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말은 이와 같은 양반수의 증가추세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은 신분구조의 변동을 가속화시켰다.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광작, 경영형 부농 및 양인지주의 출현, 상업작물의 확대 재배 등은 농촌사회를 변질시켰고 농민층을 분화시켜 신분제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의 농민층 분해는 특히 소작지의 보유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의 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형 부농의 성장과 소작지 집적은 다른 한편에서 빈농 및 무전농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몰락농민들은 유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부를 통해 노비와 양인층이 각각 양인이나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 신분층은 격증하고 반대로 피지배 신분층은 격감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이준구, 《조선후기 양반신분이동에 관한》, 일조각, 1981년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탐구실, 《조선신분사 탐구》, 현문사, 1987년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신분의 붕괴》, 성대대동문화연구원, 1972년
강만길, 《조선후기 고립제 발달》, 한국사연구, 1976년
최영희,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사회변동, 신분제도》, 사학연구, 1963년
유승원, 《朝鮮初期 身分制 硏究 》, 乙酉文化社 , 1987년
이성무, 〈朝鮮初期 身分史硏究의 再檢討〉《역사학보》102호, 역사학회, 1984년
한영우, 〈朝鮮初期 社會階層 硏究에 대한 再論〉《 韓國史論 12》, 국사편찬위원회, 1983년
이성무, 《 朝鮮初期 兩班硏究 》, 一潮閣, 1981년
송준호, 《朝鮮社會史硏究 :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硏究》, 一潮閣,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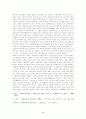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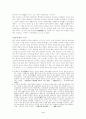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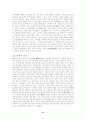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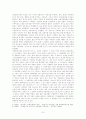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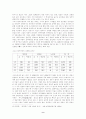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