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자
1. 청자의 기법
2. 고려청자의 발달 과정 및 쇠퇴
(1) 전기(발전기)
(2) 중기(성기)
(3) 후기(쇠퇴기)
3. 고려청자의 특색
Ⅱ. 백자
1. 백자의 기법
2. 조선시대 백자의 발달 과정
(1) 전기(1392∼1650)
(2) 중기(1651∼1751)
(3) 후기(1752∼조선조 말)
3. 문양
Ⅲ. 분청사기
1. 분청사기의 기법
2. 특징
3. 발생과 역사
4. 종류
(1) 인화기법
(2) 상감기법
(3) 박지기법
(4) 음각기법
(5) 철화기법
(6) 귀얄기법
(7) 분장기법
1. 청자의 기법
2. 고려청자의 발달 과정 및 쇠퇴
(1) 전기(발전기)
(2) 중기(성기)
(3) 후기(쇠퇴기)
3. 고려청자의 특색
Ⅱ. 백자
1. 백자의 기법
2. 조선시대 백자의 발달 과정
(1) 전기(1392∼1650)
(2) 중기(1651∼1751)
(3) 후기(1752∼조선조 말)
3. 문양
Ⅲ. 분청사기
1. 분청사기의 기법
2. 특징
3. 발생과 역사
4. 종류
(1) 인화기법
(2) 상감기법
(3) 박지기법
(4) 음각기법
(5) 철화기법
(6) 귀얄기법
(7) 분장기법
본문내용
태토와 표면분장 상태가 백자화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외적 요인과 사기 제조 제도상의 문제 등 내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분청사기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다.
4. 종류
(1) 인화기법
국화 나비 연판(蓮瓣) 여의두 연권문(連圈文) 등의 모양을 도장으로 찍은 뒤 백토로 분장하고 닦아내면 도장이 찍힌 부분에는 백토가 감입되어 흰 무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종의 상감기법으로 이 중에서도 국화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 말 청자상감은 유약 태토 기형에서 모두 퇴락한 모습을 보였고 무늬에서도 몇 개의 소략한 인화무늬와 몇 줄의 선만이 상감되고 있다.
조선 초에 들어와서는 분청사기의 모습을 상당히 갖추어 인화기법도 다소 조밀하게 정비되고 그릇 외면에도 소략하나마 무늬가 들어가고 있다. 나비무늬 돌림무늬 여의두무늬 연판무늬가 등장하나 크고 작은 국화무늬가 가장 많다. 이러한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 분청사기인화기법의 발생과정으로 \'공안부명대접\'과 \'경승부명접시\'에서 엿볼 수 있다.
세종부터 단종 때까지는 인화기법이 발전, 완성되는 시기인데 정통3년명묘지와 함께 출토된 \'장흥고명대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무늬인 국화무늬가 작아지고 무늬 사이에 여백이 보인다. 세조대가 되면 \'덕녕부명대접\', \'삼가(三加)인수명대접\', \'군위인수부명대접\', 그리고 천순6년(1462) 명월산군태지와 함께 발견된 \'분청인화국화문호\' 등에서 인화무늬는 최고의 세련미를 보인다.
전면이 인화기법으로 메워져 백토의 분장이 증가하고 무늬도 개체의 국화무늬 집단무늬 내지는 원권무늬로 세련된다. 따라서 국화무늬 자체에 여백이 없어지고 질서정연한 무늬대가 성립된다. 또 여의두무늬는 없어지고 돌림무늬도 현저히 감소한다. 성종대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가마터에서 발굴된 세련된 분청인화기법 그릇들이 있으며, 인화무늬는 귀얄무늬 상감무늬 박지무늬 음각무늬와 병용되기도 한다. 성종대 이후부터 16세기가 되면 귀얄기법과 분장기법이 늘어난다.
인화기법은 매우 얕아지고 백토분장 없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귀얄로 얇게 분장한 뒤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히는 등 쇠퇴해 가는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또 각 무늬대의 구획도 사라져 퇴조 현상을 보인다.
(2) 상감기법
분청사기 상감기법은 고려 상감청자와 직결되며 조선 초기의 상감청자와는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태토 유약 기형 기법에서 분청사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분청상감공안명연당초문대접은 흑백상감으로 무늬가 흩어지면서 특이한 율동감을 보이고 있다. 또 분청상감의성고(義成庫)명병도 분청상감공안명연당초문대접과 더불어 상감무늬의 형태를 보여주는 조선 초기의 작품이다. 정소공주묘 출토의 분청상감초화문사이호는 인화기법의 국화무늬가 약간 곁들인 활달한 초화무늬로 그릇 전체를 메웠고, 회색 태토에 담청색 유약을 입힌 전형적인 상감기법의 분청사기이다.
1440년 작품인 분청상감정통5년명연어문대반은 일종의 묘지로서 그릇 안에 연어(蓮魚)무늬와 지문(誌文)을 흑백상감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고려청자와 유사하나 무늬와 상감기법은 분청사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15세기 중엽의 상감기법의 자료로는 광주광역시 충효동 출토의 도편들이 있다.
(3) 박지기법
박지기법은 귀얄로 백토분장하거나 백토물에 담갔다가 꺼낸 뒤 무늬를 그리고 무늬 이외의 배경을 긁어낸 뒤 생기는 무늬로, 태토의 검은색과 백토무늬의 대비가 선명히 나타나는 효과를 보인다. 박지기법의 성립 발전 쇠퇴의 과정을 밝힐 자료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나 송광사의 고봉화상의 사리탑에서 발견된 분청박지연어문호가 있다.
고봉화상은 1430년(세종 12)에 입적하였으므로, 이 항아리는 1430년 이전의 작품으로 연어무늬의 능숙한 표현과 연판무늬의 배치가 상당히 세련되어 1430년 이전부터 박지기법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하게 한다. 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터로부터 박지기법 도편이 수집된다.
(4) 음각기법
음각(오목새김)기법은 박지기법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따로 취급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나 선조(線彫)의 음각수법만으로 백토분장한 표면에 무늬를 그린 것을 박지기법과 구별해서 특별히 음각기법이라고 한다. 결국 백색의 배경에 흑색선의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병 편병 항아리 등에 많이 사용되었고 호남지방에서 성행하였다.
(5) 철화기법
철화기법은 회흑색의 태토 위에 귀얄로 백토분장을 한 뒤에 철사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입힌 것을 말한다. 철화기법의 편년자료로는 1927년 계룡산록 도요지 발굴조사 때 출토된 묘지편이 있다. 즉 성화23년(1487) 홍치3년(1490) 가정15년(1536) 등인데 이들 묘지편을 통해 볼 때 철화기법은 인화기법이나 상감기법보다는 다소 늦은 15세기 후반경에 발전하여 16세기 전반경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형으로는 병 항아리 장군 대접 등에 많이 이용되었고 무늬는 당초 연화 연당초 모란 삼엽 버들 등의 식물무늬가 많으며 이 밖에 물고기 연지어조(蓮池魚鳥)무늬가 있다. 특히 무늬의 재구성과 추상화는 주목할 만하다. 가마터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와 화산리 일대 계룡산 기슭에서 출토되며 인화기법 귀얄기법 상감기법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다.
(6) 귀얄기법
귀얄기법은 분청사기에 있어서 모든 백토분장기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청사기귀얄기법이라 함은 귀얄자국 외에 다른 기법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회흑색의 태토 위에 귀얄로 힘 있고 빠른 속도로 바르기 때문에 백분의 백토 흔적과 태토색과의 대비로 운동감을 줄 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무늬 효과까지 나타내므로 신선한 분위기를 보인다. 특히, 16세기에 성행하여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지방에 따라 귀얄기법의 차이가 있다.
(7) 분장기법
백토물에 덤벙 담갔다가 꺼낸 뒤 유약을 입힌 것이므로 백토 분장의 효과는 매우 침착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겨 주며, 대개의 경우 손으로 굽을 잡고 거꾸로 담그므로 굽 언저리에 백토가 묻지 않아 상하로 암회색의 태토와 대비를 이루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전라도지방에서 많이 생산했으며, 16세기 백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 종류
(1) 인화기법
국화 나비 연판(蓮瓣) 여의두 연권문(連圈文) 등의 모양을 도장으로 찍은 뒤 백토로 분장하고 닦아내면 도장이 찍힌 부분에는 백토가 감입되어 흰 무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종의 상감기법으로 이 중에서도 국화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 말 청자상감은 유약 태토 기형에서 모두 퇴락한 모습을 보였고 무늬에서도 몇 개의 소략한 인화무늬와 몇 줄의 선만이 상감되고 있다.
조선 초에 들어와서는 분청사기의 모습을 상당히 갖추어 인화기법도 다소 조밀하게 정비되고 그릇 외면에도 소략하나마 무늬가 들어가고 있다. 나비무늬 돌림무늬 여의두무늬 연판무늬가 등장하나 크고 작은 국화무늬가 가장 많다. 이러한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 분청사기인화기법의 발생과정으로 \'공안부명대접\'과 \'경승부명접시\'에서 엿볼 수 있다.
세종부터 단종 때까지는 인화기법이 발전, 완성되는 시기인데 정통3년명묘지와 함께 출토된 \'장흥고명대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무늬인 국화무늬가 작아지고 무늬 사이에 여백이 보인다. 세조대가 되면 \'덕녕부명대접\', \'삼가(三加)인수명대접\', \'군위인수부명대접\', 그리고 천순6년(1462) 명월산군태지와 함께 발견된 \'분청인화국화문호\' 등에서 인화무늬는 최고의 세련미를 보인다.
전면이 인화기법으로 메워져 백토의 분장이 증가하고 무늬도 개체의 국화무늬 집단무늬 내지는 원권무늬로 세련된다. 따라서 국화무늬 자체에 여백이 없어지고 질서정연한 무늬대가 성립된다. 또 여의두무늬는 없어지고 돌림무늬도 현저히 감소한다. 성종대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가마터에서 발굴된 세련된 분청인화기법 그릇들이 있으며, 인화무늬는 귀얄무늬 상감무늬 박지무늬 음각무늬와 병용되기도 한다. 성종대 이후부터 16세기가 되면 귀얄기법과 분장기법이 늘어난다.
인화기법은 매우 얕아지고 백토분장 없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귀얄로 얇게 분장한 뒤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히는 등 쇠퇴해 가는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또 각 무늬대의 구획도 사라져 퇴조 현상을 보인다.
(2) 상감기법
분청사기 상감기법은 고려 상감청자와 직결되며 조선 초기의 상감청자와는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태토 유약 기형 기법에서 분청사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분청상감공안명연당초문대접은 흑백상감으로 무늬가 흩어지면서 특이한 율동감을 보이고 있다. 또 분청상감의성고(義成庫)명병도 분청상감공안명연당초문대접과 더불어 상감무늬의 형태를 보여주는 조선 초기의 작품이다. 정소공주묘 출토의 분청상감초화문사이호는 인화기법의 국화무늬가 약간 곁들인 활달한 초화무늬로 그릇 전체를 메웠고, 회색 태토에 담청색 유약을 입힌 전형적인 상감기법의 분청사기이다.
1440년 작품인 분청상감정통5년명연어문대반은 일종의 묘지로서 그릇 안에 연어(蓮魚)무늬와 지문(誌文)을 흑백상감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고려청자와 유사하나 무늬와 상감기법은 분청사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15세기 중엽의 상감기법의 자료로는 광주광역시 충효동 출토의 도편들이 있다.
(3) 박지기법
박지기법은 귀얄로 백토분장하거나 백토물에 담갔다가 꺼낸 뒤 무늬를 그리고 무늬 이외의 배경을 긁어낸 뒤 생기는 무늬로, 태토의 검은색과 백토무늬의 대비가 선명히 나타나는 효과를 보인다. 박지기법의 성립 발전 쇠퇴의 과정을 밝힐 자료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나 송광사의 고봉화상의 사리탑에서 발견된 분청박지연어문호가 있다.
고봉화상은 1430년(세종 12)에 입적하였으므로, 이 항아리는 1430년 이전의 작품으로 연어무늬의 능숙한 표현과 연판무늬의 배치가 상당히 세련되어 1430년 이전부터 박지기법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하게 한다. 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터로부터 박지기법 도편이 수집된다.
(4) 음각기법
음각(오목새김)기법은 박지기법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따로 취급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나 선조(線彫)의 음각수법만으로 백토분장한 표면에 무늬를 그린 것을 박지기법과 구별해서 특별히 음각기법이라고 한다. 결국 백색의 배경에 흑색선의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병 편병 항아리 등에 많이 사용되었고 호남지방에서 성행하였다.
(5) 철화기법
철화기법은 회흑색의 태토 위에 귀얄로 백토분장을 한 뒤에 철사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입힌 것을 말한다. 철화기법의 편년자료로는 1927년 계룡산록 도요지 발굴조사 때 출토된 묘지편이 있다. 즉 성화23년(1487) 홍치3년(1490) 가정15년(1536) 등인데 이들 묘지편을 통해 볼 때 철화기법은 인화기법이나 상감기법보다는 다소 늦은 15세기 후반경에 발전하여 16세기 전반경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형으로는 병 항아리 장군 대접 등에 많이 이용되었고 무늬는 당초 연화 연당초 모란 삼엽 버들 등의 식물무늬가 많으며 이 밖에 물고기 연지어조(蓮池魚鳥)무늬가 있다. 특히 무늬의 재구성과 추상화는 주목할 만하다. 가마터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와 화산리 일대 계룡산 기슭에서 출토되며 인화기법 귀얄기법 상감기법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다.
(6) 귀얄기법
귀얄기법은 분청사기에 있어서 모든 백토분장기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청사기귀얄기법이라 함은 귀얄자국 외에 다른 기법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회흑색의 태토 위에 귀얄로 힘 있고 빠른 속도로 바르기 때문에 백분의 백토 흔적과 태토색과의 대비로 운동감을 줄 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무늬 효과까지 나타내므로 신선한 분위기를 보인다. 특히, 16세기에 성행하여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지방에 따라 귀얄기법의 차이가 있다.
(7) 분장기법
백토물에 덤벙 담갔다가 꺼낸 뒤 유약을 입힌 것이므로 백토 분장의 효과는 매우 침착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겨 주며, 대개의 경우 손으로 굽을 잡고 거꾸로 담그므로 굽 언저리에 백토가 묻지 않아 상하로 암회색의 태토와 대비를 이루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전라도지방에서 많이 생산했으며, 16세기 백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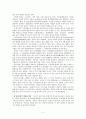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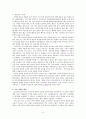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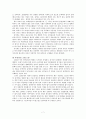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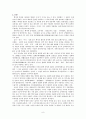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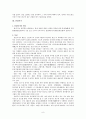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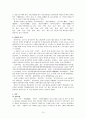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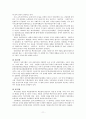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