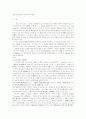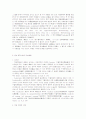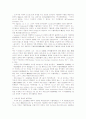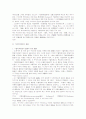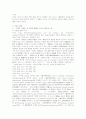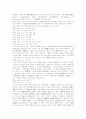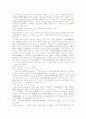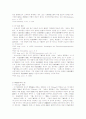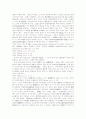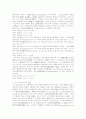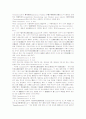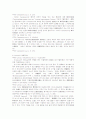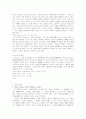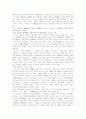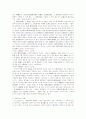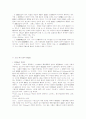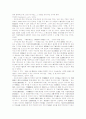본문내용
性的 不當利得返還請求權」 이라는 새로운 不當利得 類型을 제시한다.(加藤雅信, 不當利得, 전게서, 31면, 93면). 또 川村泰啓,「不當利得返還請求權の諸類型 (1)」, 判例評論 76호-川村泰啓,「不當利得返還請求權の諸類型 (3)」, 判例評論 78호, 四官和未, 전게서, 53면-56면 등 참조.) 혹은 有因論의 포기 내지 債權法과 物權法의 峻別을 對應關係으로 순화 함으로써 物權變動 理論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試圖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給付(利得)返還請求權」과 「他人의 財貨로부터의 利得返還請求權」의 分化는 近代法에 있어서 所有權과 債權契約의 분리 독립에 對應하는 것이고,所有者와 非所有者 사이의 對抗關係와 契約 當事者間의 구체적인 緊張 對抗關係의 分化에 대응하는것 이므로, 物權變動을 有因的으로 構成하느냐의 차이를 넘어서 그것은 近代法 一般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것이다.
주133) 川村泰啓,「返還さるへき利得の範圍(5)」, 判例評論 67號 21면.
V. 結論
_ (1)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不當利得 制度를 統一的 基礎 위에서 파악할 것인가 그보다도 각종 不當利得의 類型化에 의하여 그 基礎를 구할 것인가 하는 論爭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定着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는 (i)不當利得制度를 統一的인 基礎위에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는 입장과, (ii)그것이 抽象的 幻想的이든 혹은 實定的이든 간에 統一的인 基礎를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으로 大別할 수 있다.
_ 전자의 입장은 Wilburg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 이었으며, 후자의 입장은 그 「通一的 基礎」의 지향성과 강도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편이다. 즉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를 a)正義 公評의 原理에서 求하는 것, b)財貨의 侵害(Eingriff)에 求하는 것 c)法律上의 原因을 欠缺한 「財貨移轉」내지「法的으로 [59] 보호되지 아니하는 財貨割當의 移動」에 求하는 것, d)「債權法的 基礎의 欠缺(Mangel der schuldrechtlichen Unterlage)」 내지 「損失者의 法的으로 중요한 意思(rechtserheblicher Wille)의 欠缺」에 求하는 것 등이 그것들 이었다.
_ 그런데 이들 後者의 입장을 보다 統一的인 基礎 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學說 가운데, 그 統一的 기본원리로 부터 직접 利得의 不當性을 규정 지우려고 하는 학설들은 이미 일찍부터 批判을 받아왔다.주134) . 한편 비록 後者의 입장을 취하는 者이긴 하지만 抽象的 基本原理(思想)의 존재를 반드시 否定하지는 않고, 그와 같은 原理를 일응 存置 시키면서, 그러나 不當利得의 類型 으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2가지 종류(「給付」利得과 「기타 방법에 의한」利得의 2가지 類型)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그 類型에 따라 個別的으로 不當利得의 要件 效果를 규정하려고 하는 學說이 있다.주135)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현재로서는 有力한데, 이 입장에 따르면 상술한 不當利得의 基礎에 관한 前者의 입장과 後者의 입장은 매우 接近하게 된다. 그것은 적어도 현재의 學問狀況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問題의 실제적 의의는 이제 認定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주134) 類型論者에 의한 統一說 비판에 관하여 상세한 것 으로는 山田幸二, 전게서, 8면 註5 참조
주135) Leonhard ; Caemmerer ; Esser ; Kotter, Zur Rechtsnatur der Leistungskontiktion, Acp. 153, 193ff ; Enneccerus ; Lehmann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II. 7. Aufl. 또 일본에 있어서는 四官和未, 전게서가 代表的이다.
_ (2)요컨데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를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게되어 온 論爭은 利得現象의 單一性을 둘러싼 문제, 및 法律上의 原因=利得의 不當性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전게되어 왔던 것 으로서, 당초에는 立法者의 意思에 따라 不當利得 制度를 統一的으로 파악 하려는 입장이 主流를 이루었으나, 후에 이르러 類型論의 전게를 보게 되고 더나아가 判例(독일의 경우)도 그에 同調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에 관한 理解의 方向은 그 統一的 파악을 사실상 포기하고 「給付」利得과 「기타 방법에 의한」利得으로 分化的 類型的 고찰에로 轉換 되거나, 不當利得 制度의 「機能的」측면을 고려 하면서 새로운 類型化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_ 이제 統一的 不當利得法의 構成要件이 裁判規範으로서의 適合性을 상실하고 있 [60] 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밝혀 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理由가 없는 것도 아니다. 즉 不當利得法은 法制史的으로 볼 때, 傳統的으로 統一的인 法制道로서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독일의 法典編纂期에 立法 내지 學說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아래 急遽制定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構成要件의 條文化 方式이 오늘날 현실적 紛爭樣態에 卽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通說과 같이 傳統的 見解에 입각하여 不當利得의 모든 현상을 모순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再檢討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주136) 주137)
주136) 물론 현재의 모든 學說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類型的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독일의 학설에 따라 類型化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李銀榮, 債權各論, 504면, 507면 이하 참고) 그것은 不當利得의 判斷을 法官의 衡平感覺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不合理한 면을 갖지 때문이다.
주137) 玄病哲, 不當利得에 있어서의 類型論, 法學論叢 제6집, 217면
_ 이제 문제는 「個別的 法律關係를 확실하게 규율하는 특정한 不當利得 規範의 提示」를 위하여 어떠한 類型化 작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되는데, 이 경우 「不當利得 制度의 機能的 側面」을 특히 강조하는 類型化 방향, 그리고 그 方法論주138) 은 우리나라의 民法 제741조의 條文構造와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주138) 四官和未, 전게서, 47면 이하 참조.
주133) 川村泰啓,「返還さるへき利得の範圍(5)」, 判例評論 67號 21면.
V. 結論
_ (1)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不當利得 制度를 統一的 基礎 위에서 파악할 것인가 그보다도 각종 不當利得의 類型化에 의하여 그 基礎를 구할 것인가 하는 論爭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定着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는 (i)不當利得制度를 統一的인 基礎위에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는 입장과, (ii)그것이 抽象的 幻想的이든 혹은 實定的이든 간에 統一的인 基礎를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으로 大別할 수 있다.
_ 전자의 입장은 Wilburg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 이었으며, 후자의 입장은 그 「通一的 基礎」의 지향성과 강도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편이다. 즉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를 a)正義 公評의 原理에서 求하는 것, b)財貨의 侵害(Eingriff)에 求하는 것 c)法律上의 原因을 欠缺한 「財貨移轉」내지「法的으로 [59] 보호되지 아니하는 財貨割當의 移動」에 求하는 것, d)「債權法的 基礎의 欠缺(Mangel der schuldrechtlichen Unterlage)」 내지 「損失者의 法的으로 중요한 意思(rechtserheblicher Wille)의 欠缺」에 求하는 것 등이 그것들 이었다.
_ 그런데 이들 後者의 입장을 보다 統一的인 基礎 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學說 가운데, 그 統一的 기본원리로 부터 직접 利得의 不當性을 규정 지우려고 하는 학설들은 이미 일찍부터 批判을 받아왔다.주134) . 한편 비록 後者의 입장을 취하는 者이긴 하지만 抽象的 基本原理(思想)의 존재를 반드시 否定하지는 않고, 그와 같은 原理를 일응 存置 시키면서, 그러나 不當利得의 類型 으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2가지 종류(「給付」利得과 「기타 방법에 의한」利得의 2가지 類型)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그 類型에 따라 個別的으로 不當利得의 要件 效果를 규정하려고 하는 學說이 있다.주135)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현재로서는 有力한데, 이 입장에 따르면 상술한 不當利得의 基礎에 관한 前者의 입장과 後者의 입장은 매우 接近하게 된다. 그것은 적어도 현재의 學問狀況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問題의 실제적 의의는 이제 認定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주134) 類型論者에 의한 統一說 비판에 관하여 상세한 것 으로는 山田幸二, 전게서, 8면 註5 참조
주135) Leonhard ; Caemmerer ; Esser ; Kotter, Zur Rechtsnatur der Leistungskontiktion, Acp. 153, 193ff ; Enneccerus ; Lehmann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II. 7. Aufl. 또 일본에 있어서는 四官和未, 전게서가 代表的이다.
_ (2)요컨데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를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게되어 온 論爭은 利得現象의 單一性을 둘러싼 문제, 및 法律上의 原因=利得의 不當性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전게되어 왔던 것 으로서, 당초에는 立法者의 意思에 따라 不當利得 制度를 統一的으로 파악 하려는 입장이 主流를 이루었으나, 후에 이르러 類型論의 전게를 보게 되고 더나아가 判例(독일의 경우)도 그에 同調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不當利得 制度의 基礎에 관한 理解의 方向은 그 統一的 파악을 사실상 포기하고 「給付」利得과 「기타 방법에 의한」利得으로 分化的 類型的 고찰에로 轉換 되거나, 不當利得 制度의 「機能的」측면을 고려 하면서 새로운 類型化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_ 이제 統一的 不當利得法의 構成要件이 裁判規範으로서의 適合性을 상실하고 있 [60] 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밝혀 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理由가 없는 것도 아니다. 즉 不當利得法은 法制史的으로 볼 때, 傳統的으로 統一的인 法制道로서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독일의 法典編纂期에 立法 내지 學說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아래 急遽制定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構成要件의 條文化 方式이 오늘날 현실적 紛爭樣態에 卽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通說과 같이 傳統的 見解에 입각하여 不當利得의 모든 현상을 모순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再檢討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주136) 주137)
주136) 물론 현재의 모든 學說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類型的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독일의 학설에 따라 類型化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李銀榮, 債權各論, 504면, 507면 이하 참고) 그것은 不當利得의 判斷을 法官의 衡平感覺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不合理한 면을 갖지 때문이다.
주137) 玄病哲, 不當利得에 있어서의 類型論, 法學論叢 제6집, 217면
_ 이제 문제는 「個別的 法律關係를 확실하게 규율하는 특정한 不當利得 規範의 提示」를 위하여 어떠한 類型化 작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되는데, 이 경우 「不當利得 制度의 機能的 側面」을 특히 강조하는 類型化 방향, 그리고 그 方法論주138) 은 우리나라의 民法 제741조의 條文構造와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주138) 四官和未, 전게서, 47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