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경우에 업무도급형 통신근로자는 당해 국가의 일반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든가 아니면 아무런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든가 할 것이다.주62)
주62) 종래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구 벨기에법(section III, paragraph 4, of the Royal Ordinace, 1969년 12월 28일)에 따르면, 가내근로자란 \'천연원료로 작업하거나 특히 한 명 이상의 거래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로 작업하는 자\'로서, 이 정의에 의하면 업무도급형 통신근로자는 가내근로법령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일본에서도 가내에서 전자적 텍스트-프로세싱 작업은 일부의 경우(플로피디스켓과 같은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내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Vittorio Di Martino Linda Wirth, 앞의 논문, 544면).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B. Veneziani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신자본주의 경제(neo-capitalist economy)에서 사용자는 매니저와 전문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기술경제(technologically-based economy)에서는 매니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기에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도로 숙련되어 있어 작업의 종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란 거의 없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전문적 기술이 이미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의 권한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기업의 조직에 연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성은 작업과 조직사이의 연관(link between work and organiz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내근로 따라서 통신근로자가 기업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종속적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작업수행이라는 조건이 권한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B. Veneziani, 앞의 논문, 219면).
_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즉 통신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노동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통신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_ 무엇보다 먼저 당해 통신근로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작업자의 능력과 그에 따른 작업주문자와의 관계\'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앞의 유형화(III-4 참조)에서 통신근로자가 자신의 기능이나 능력 등으로 인해 작업주문자와 계약상 대등성이 유지될 수[67] 있는 \'전문형\'과 \'중간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계약상 당사자간의 대등성이 없는 \'단순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보다는 작업의 실질에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현행 판례의 태도보다는 필자가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던 종속성의 정도와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를 비교형량하는 방법(II-3 후반부 참조)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방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통신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근로자형 통신근로자\'와 같이 규율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보호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가내노동법의 보호대상에 통신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IV. 결 론
_ 이상에서 가내근로와 통신근로의 노동법적 규율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_ 먼저, 가내근로 또는 가내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율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현행법상 가내근로자는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서는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학설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 역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적은 없지만, 그 동안 근로자성 판단에서 보여 주었던 입장에 의할 경우 가내근로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의 판례법 등을 참조하여 가내근로자의 계약상대방(위탁자)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와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근로자성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실태와 가내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가내근로협약\'(제177호)과 \'가내근로권고\'(제184호)를 참고하여, 새로운 법(가내노동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8] _ 다음으로 통신근로자의 경우는 가내근로자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통신근로자 중에는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근로를 행하는 경우(근로자형 통신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업무도급형 통신근로자)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다른 노동법 규정의 적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근로자성의 판단에서는 통신근로의 성격(전문형 중간형인가 아니면 단순형인가)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가지는 기능 또는 능력으로 인해 계약상대방과 대등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형 중간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근로계약인가 아닌가)을 먼저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순형의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의 실질을 보아 통신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종속성(또는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통신근로자의 경우에는 가내근로자에 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주62) 종래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구 벨기에법(section III, paragraph 4, of the Royal Ordinace, 1969년 12월 28일)에 따르면, 가내근로자란 \'천연원료로 작업하거나 특히 한 명 이상의 거래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로 작업하는 자\'로서, 이 정의에 의하면 업무도급형 통신근로자는 가내근로법령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일본에서도 가내에서 전자적 텍스트-프로세싱 작업은 일부의 경우(플로피디스켓과 같은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내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Vittorio Di Martino Linda Wirth, 앞의 논문, 544면).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B. Veneziani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신자본주의 경제(neo-capitalist economy)에서 사용자는 매니저와 전문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기술경제(technologically-based economy)에서는 매니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기에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도로 숙련되어 있어 작업의 종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란 거의 없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전문적 기술이 이미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의 권한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기업의 조직에 연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성은 작업과 조직사이의 연관(link between work and organiz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내근로 따라서 통신근로자가 기업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종속적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작업수행이라는 조건이 권한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B. Veneziani, 앞의 논문, 219면).
_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즉 통신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노동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통신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_ 무엇보다 먼저 당해 통신근로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작업자의 능력과 그에 따른 작업주문자와의 관계\'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앞의 유형화(III-4 참조)에서 통신근로자가 자신의 기능이나 능력 등으로 인해 작업주문자와 계약상 대등성이 유지될 수[67] 있는 \'전문형\'과 \'중간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계약상 당사자간의 대등성이 없는 \'단순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보다는 작업의 실질에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현행 판례의 태도보다는 필자가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던 종속성의 정도와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를 비교형량하는 방법(II-3 후반부 참조)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방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통신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근로자형 통신근로자\'와 같이 규율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보호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가내노동법의 보호대상에 통신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IV. 결 론
_ 이상에서 가내근로와 통신근로의 노동법적 규율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_ 먼저, 가내근로 또는 가내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율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현행법상 가내근로자는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서는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학설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 역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적은 없지만, 그 동안 근로자성 판단에서 보여 주었던 입장에 의할 경우 가내근로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의 판례법 등을 참조하여 가내근로자의 계약상대방(위탁자)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와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근로자성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실태와 가내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가내근로협약\'(제177호)과 \'가내근로권고\'(제184호)를 참고하여, 새로운 법(가내노동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8] _ 다음으로 통신근로자의 경우는 가내근로자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통신근로자 중에는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근로를 행하는 경우(근로자형 통신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업무도급형 통신근로자)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다른 노동법 규정의 적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근로자성의 판단에서는 통신근로의 성격(전문형 중간형인가 아니면 단순형인가)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가지는 기능 또는 능력으로 인해 계약상대방과 대등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형 중간형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근로계약인가 아닌가)을 먼저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순형의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의 실질을 보아 통신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종속성(또는 독립사업가로서의 요소)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통신근로자의 경우에는 가내근로자에 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비정규직][고용]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
[비정규직][고용]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 [여성실업][여성실업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여성고용]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
[여성실업][여성실업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여성고용]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의 건강 및 산업보건 실태 조사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의 건강 및 산업보건 실태 조사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완벽 정리)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완벽 정리) 여성 근로자 복지(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 직종, 임금, 승진, 휴가및보육, 성희롱, 근무...
여성 근로자 복지(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 직종, 임금, 승진, 휴가및보육, 성희롱, 근무... 여성 근로자 복지(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 직종, 임금, 승진, 휴가및보육, 성희롱, 근무...
여성 근로자 복지(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 직종, 임금, 승진, 휴가및보육, 성희롱, 근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 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 법적 기초, 보수의 종류,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 법적 기초, 보수의 종류,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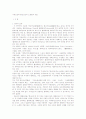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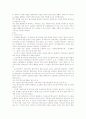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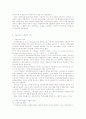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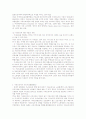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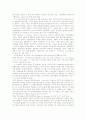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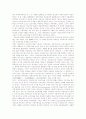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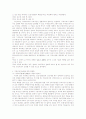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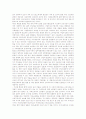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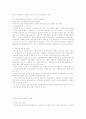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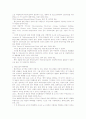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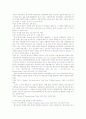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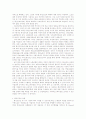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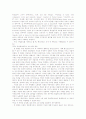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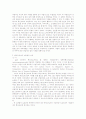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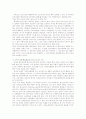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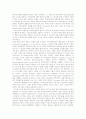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