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째, 법해석자나 법적용자에게 부여된 판단의 폭 - 혹은 \"裁量\" - 에 있어서도 이 둘은 거의 흡사하다. 즉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이 - 대부분 그 법적 결과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 法理論의 構成方法(juristische Konstruktion)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一般條項을 내용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도 법해석자의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 또한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이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의 내용을 법관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채울 수 있다면, 一般條項의 소위 \"價値充塡\"도 법해석자나 혹은 법적용자의 일상도덕적인 관념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이 둘 모두 법개념이라는 미명하에 \"隱蔽社會學\"的인 事實들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槪念法學과 一般條項의 이런 특성이 가장 잘 어우러진 경우를 형법의 이론적인 체계와 그 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범죄의 개별요건들을 세분화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은 대부분 一般條項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즉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부는 대부분 사회상당성에 의해 판단되며, 위법성은 사회상규 등에 의해 개괄적으로 조각될 수 있고, 책임은 행위자의 기대가능성에 따라 판단되며, 그리고 양형은 정상참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 - 즉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이 고답적인 개념의 암기에 그친다거나 혹은 우리의 법실무가 합리적인 법적 논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도덕을 중시한다는 비판 - 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형법해석에 길잡이가 되는 법치국가의 여러 원칙들이 침해된다는 지적은 결코 과장된 주장이 아닐 것이다.
V
_ 그렇다면 이런 류의 해석방법에 대해 \"應用法哲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사실상 이 주제는 그 자체 별도의 논문을 요할 만큼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기본방향만을 간략하게 암시하는[1178] 것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_ 첫째, 현재의 해석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의 본질적인 징표가 되는 연결고리 - 즉 개념과 법체계와의 상관관계 -를 지금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달리 말해, 槪念法學的인 발상법에 의해 서로 분리된 법개념과 생활사태를 다시금 연결지움으로써, 법개념 및 법적 결정의 정당성이 형식적인 개념의 체계성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무런 실천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은 槪念法學的인 論議의 虛構性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법개념 혹은 법적 논거의 정당성이 체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개별적인 사태의 규범적인 타당성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전제조건이 마련될 때, 刑法解釋學의 법개념들은 - 自然法論者들의 주장과 같이 - 실정법상 규정된 法規則(Rule)의 영역을 넘어서서 法原理(Principle)와 서로 연관지워질 수 있다.주34)
주34) 法規則(Rule)가 法原理(Principle)의 구별에 대해서는 특히 R.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ed., 1978, 22면 이하; R.Alexy, \"Zum Begriff des Rechtsprinzips\", in: Rechtstheorie, Beiheft Bd. I, 1979, 59면 이하 참조. 요컨대 법문의 해석과 해석학적 체계의 준수는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즉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조건은 개별사태가 지니는 규범적인 의미를 법원리적으로 구체화시킨 법적 논거에 의해 마련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학적 개념 혹은 체계들이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이론과 실무와 같이 해석학적 지식들만을 마치 \"성서\"와 같이 떠받드는 풍토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_ 둘째, 가능한 한 형법의 영역으로부터 一般條項的인 槪念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형법에 대해 一般條項的인 槪念이 지니는 기능이 올바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一般條項的인 槪念은 그 특성상 법적 판단을 도덕적인 판단으로 변질시킬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사용은 단지 세부화된 해석학적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一般條項的인 槪念들은 법외적인 영역으로 편성될 것이며, 그 결과 - 法實證主義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법적 판단은 개괄적인 도덕적 판단과 서로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법치국가의 원칙도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一般條項의 援[1179] 用은 다양한 법적 사태를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며 또한 사회상규 등의 법외적인 척도를 법적 체계 안의 기준과 서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형법해석에 대해 순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一般條項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리고 세분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一般條項에로의 逃避\"는 곧 法解釋學의 抛棄로 귀결될 소지가 많다. 요컨대 \"법원리\"를 무시하는 形式主義的인 槪念法學的 思考도 문제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세분화 된 \"法規則\" 대신 개괄적인 윤리기준만을 들여대는 一般條項의 원용도 방법론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一般條項的인 조항들은 형법해석에 대해 단지 \"最後補充的인 原則(Ultima ratio)\"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_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볼 때,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과 一般條項的인 槪念의 원용은 법치국가의 시험대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형법의 해석이 형법에 내재한 법원리로부터 획득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 모두 형법의 영역에서 추출되면 될 수록 한층 더 법치국가적인 刑法解釋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물론 \"應用法哲學\"의 임무는 바로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행 刑法解釋學이 지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V
_ 그렇다면 이런 류의 해석방법에 대해 \"應用法哲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사실상 이 주제는 그 자체 별도의 논문을 요할 만큼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기본방향만을 간략하게 암시하는[1178] 것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_ 첫째, 현재의 해석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의 본질적인 징표가 되는 연결고리 - 즉 개념과 법체계와의 상관관계 -를 지금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달리 말해, 槪念法學的인 발상법에 의해 서로 분리된 법개념과 생활사태를 다시금 연결지움으로써, 법개념 및 법적 결정의 정당성이 형식적인 개념의 체계성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무런 실천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은 槪念法學的인 論議의 虛構性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법개념 혹은 법적 논거의 정당성이 체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개별적인 사태의 규범적인 타당성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전제조건이 마련될 때, 刑法解釋學의 법개념들은 - 自然法論者들의 주장과 같이 - 실정법상 규정된 法規則(Rule)의 영역을 넘어서서 法原理(Principle)와 서로 연관지워질 수 있다.주34)
주34) 法規則(Rule)가 法原理(Principle)의 구별에 대해서는 특히 R.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ed., 1978, 22면 이하; R.Alexy, \"Zum Begriff des Rechtsprinzips\", in: Rechtstheorie, Beiheft Bd. I, 1979, 59면 이하 참조. 요컨대 법문의 해석과 해석학적 체계의 준수는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즉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조건은 개별사태가 지니는 규범적인 의미를 법원리적으로 구체화시킨 법적 논거에 의해 마련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학적 개념 혹은 체계들이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이론과 실무와 같이 해석학적 지식들만을 마치 \"성서\"와 같이 떠받드는 풍토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_ 둘째, 가능한 한 형법의 영역으로부터 一般條項的인 槪念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형법에 대해 一般條項的인 槪念이 지니는 기능이 올바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一般條項的인 槪念은 그 특성상 법적 판단을 도덕적인 판단으로 변질시킬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사용은 단지 세부화된 해석학적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一般條項的인 槪念들은 법외적인 영역으로 편성될 것이며, 그 결과 - 法實證主義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법적 판단은 개괄적인 도덕적 판단과 서로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법치국가의 원칙도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一般條項의 援[1179] 用은 다양한 법적 사태를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며 또한 사회상규 등의 법외적인 척도를 법적 체계 안의 기준과 서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형법해석에 대해 순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一般條項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리고 세분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一般條項에로의 逃避\"는 곧 法解釋學의 抛棄로 귀결될 소지가 많다. 요컨대 \"법원리\"를 무시하는 形式主義的인 槪念法學的 思考도 문제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세분화 된 \"法規則\" 대신 개괄적인 윤리기준만을 들여대는 一般條項의 원용도 방법론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一般條項的인 조항들은 형법해석에 대해 단지 \"最後補充的인 原則(Ultima ratio)\"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_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볼 때, 槪念法學的인 思惟方式과 一般條項的인 槪念의 원용은 법치국가의 시험대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형법의 해석이 형법에 내재한 법원리로부터 획득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 모두 형법의 영역에서 추출되면 될 수록 한층 더 법치국가적인 刑法解釋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물론 \"應用法哲學\"의 임무는 바로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행 刑法解釋學이 지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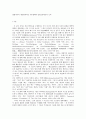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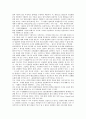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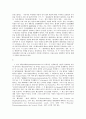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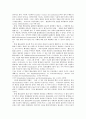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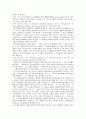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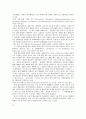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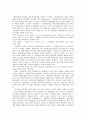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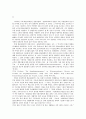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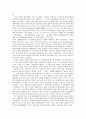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