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차이와 시간성
3. 차이와 내어나름
4. 존재 사건과 내어나름
5. 존재 사건에 속하는 시간-공간과 내어나름
6. 맺음말
2. 차이와 시간성
3. 차이와 내어나름
4. 존재 사건과 내어나름
5. 존재 사건에 속하는 시간-공간과 내어나름
6. 맺음말
본문내용
4). 그렇게 "내줌"의 영역에 들어서서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그 자신의 특출함으로, 즉 존재를 지키는 자로 그리고 존재는 우리 가까이에 머무는 진리의 존재로 본재한다. 그리하여 "내줌"의 "시간-공간"이란 시간은 존재가 내어지는 지평인 동시에 인간이 그의 본질을 얻는 영역을 이룬다.
그렇지만 "내줌"의 시간 스스로가 존재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다. "내줌"의 시간으로부터 내어진 존재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존재 사건"이 "보내준 것"(Gabe)이다. "존재 사건"이 "내줌"의 방식으로, "내줌"의 영역으로부터 존재를 보내는 것이다. 존재가 그리로부터 보내지는 "시간-공간"을 여는 "내줌"은 다시금, "존재 사건"이 존재를 보내주는 지평과 방식으로서, "존재 사건"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내줌(geben, schicken)"은 "내줌"에서 그리고 "내줌"은 다시금 "보내줌"과 함께 "존재 사건"에서 연유한다. 그리하여 "Es gibt Sein"의 "Es"인 "존재 사건"의 "geben"은 존재의 "보내줌(schicken)"이자, 존재가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시간의 영역을 밝게 트이게 하는 "내줌(reichen)"이다. "존재 사건"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는 시간의 열려진 영역에 내맡겨지고, "내줌"의 시간은 존재가 보내지는 존재 진리의 영역으로서 바쳐짐으로써, '존재'와 '시간'은 그 "동일한 것"인 "존재 사건"에 함께 속한다. "존재 사건"이 존재와 시간을 "함께 속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존재와 시간, 시간과 존재를 하나로 묶는 "와"로서 존재와 시간이란 "두 사실(Sache)을 서로 향하게 하고(zueinander halten), 둘의 관련을 견디는(aushalten) 사태(Sachverhalt)"(ZS, 4)다.
6. 맺음말
"존재 사건"에 속하는 "내줌"의 시간에 대한, 말하자면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사건'으로 물음의 위치가 바뀐 사유의 길에서의 시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와 같이 논의하는 것을 통해 다음의 사실이 뚜렷해졌다. 즉 "내줌"에 의해 밝게 트이게 된 "시간-공간"의 시간은 존재자를 드러내며 우리 가까이 이른 존재가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지평인 동시에 인간이 들어서서 떠맡아야 할 영역이다. 이로써 '탈자적-지평적 단일함'인 "시간성"과 "내어나름"의 '사이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존재와 인간을 동시에 떠받친다라는 성격이 "내줌"의 "시간-공간"의 시간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기한 우리의 물음은 다음과 같이 보다 긴박하게 물어질 수 있게 된다. "탈자"의 단일함에 의해 열린 '탈자적-지평적 단일함'인 "시간성"의 시간 또는 "존재 사건"의 "내줌"에 의해 밝게 트인 "시간-공간"의 시간과 동일하게 존재가 내어지는 지평이자 인간이 그의 본질을 얻는 곳으로 사유된 "내어나름"의 "사이에"'는, 하이데거가 사유의 길에서 그때마다 다르게 불렀던 시간의 다른 이름이며 "내어나름"은 "탈자", "내줌"과 함께 시간의 본질인가? 그리하여 "내어나름"은 시간의 고유함으로서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존재와 함께 "존재 사건"에-그것의 고유한 방식과 지평으로서-속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확정적인 대답을 피한 채로 이를 여전히 물음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탈자"의 "시간성"과 "내줌"의 "시간-공간"에 대해 말해진 규정이 "내어나름"의 "사이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내어나름"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의 고유함이다라는 방식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음의 사태 부합적인 해명을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사유의 길에서 동일하게 물어진 하나의 물음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그 동일함 속에서 변화를 동시에 그 상이함 속에서 견지되는 동일함을 놓지 않고 파악하는 철저함 속에서, 숙고하는 사유가 아직도 필요하다 :
"들어서서 오름이 길이라고 불린다면, 이 '길'에서는 언제나 '존재(Seyn)의 의미'에 대한 동일한 물음이, 오직 그 물음만이 물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길에 들어서 있기에] 물음이 서 있는 위치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모든 본질적인 물음은, 그때마다 보다 근원적으로 물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 이전의 것에 이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전-이후의 관계란 더욱이 있을 수 없다. …… '변화'란 본질적이어서, 하나의 물음이 그때그때마다 그 물음의 위치로부터 철저하게 물어질 때만이 비로소 그 폭이 규정될 수 있다(BzP, 84 / 85).
우리는 그러한 사유에 우리의 물음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형이상학의 시기에 존재의 역사는 시간의 사유되지 않은 본질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고 있다"(WiM, 18)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며,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말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귀기울인다. "오히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그것의 본질의 앞선 장소인 내어나름에서 토의함으로써 존재의 역운을, 시원에서부터 그 완료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기조차 하다"(ID, 59 / 60).
참고 문헌
Sein und Zeit(약호 SZ), T bingen 1972.
Die Grundprobleme der Ph nomenologie(GP), 전집 제24권, Frankfurt a. M. 1975.
Was ist Metaphysik?(WiM), Frankfurt a. M. 1965.
Vom Wesen des Grundes(WG). Frankfurt a. M. 1965.
(WdW) in Wegmarken, 전집 제9권, Frankfurt a. M. 1976, 177-202.
Einf hrung in die Metaphysik(EM), 전집 제40권, Frankfurt a. M. 1983.
Beitr ge zur Philosophie(BzP), 전집 제65권, Frankfurt a. M. 1989.
목차
1. 머리말
2. 차이와 시간성
3. 차이와 내어나름
4. 존재 사건과 내어나름
5. 존재 사건에 속하는 시간-공간과 내어나름
6. 맺음말
그렇지만 "내줌"의 시간 스스로가 존재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다. "내줌"의 시간으로부터 내어진 존재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존재 사건"이 "보내준 것"(Gabe)이다. "존재 사건"이 "내줌"의 방식으로, "내줌"의 영역으로부터 존재를 보내는 것이다. 존재가 그리로부터 보내지는 "시간-공간"을 여는 "내줌"은 다시금, "존재 사건"이 존재를 보내주는 지평과 방식으로서, "존재 사건"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내줌(geben, schicken)"은 "내줌"에서 그리고 "내줌"은 다시금 "보내줌"과 함께 "존재 사건"에서 연유한다. 그리하여 "Es gibt Sein"의 "Es"인 "존재 사건"의 "geben"은 존재의 "보내줌(schicken)"이자, 존재가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시간의 영역을 밝게 트이게 하는 "내줌(reichen)"이다. "존재 사건"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는 시간의 열려진 영역에 내맡겨지고, "내줌"의 시간은 존재가 보내지는 존재 진리의 영역으로서 바쳐짐으로써, '존재'와 '시간'은 그 "동일한 것"인 "존재 사건"에 함께 속한다. "존재 사건"이 존재와 시간을 "함께 속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존재와 시간, 시간과 존재를 하나로 묶는 "와"로서 존재와 시간이란 "두 사실(Sache)을 서로 향하게 하고(zueinander halten), 둘의 관련을 견디는(aushalten) 사태(Sachverhalt)"(ZS, 4)다.
6. 맺음말
"존재 사건"에 속하는 "내줌"의 시간에 대한, 말하자면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사건'으로 물음의 위치가 바뀐 사유의 길에서의 시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와 같이 논의하는 것을 통해 다음의 사실이 뚜렷해졌다. 즉 "내줌"에 의해 밝게 트이게 된 "시간-공간"의 시간은 존재자를 드러내며 우리 가까이 이른 존재가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지평인 동시에 인간이 들어서서 떠맡아야 할 영역이다. 이로써 '탈자적-지평적 단일함'인 "시간성"과 "내어나름"의 '사이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존재와 인간을 동시에 떠받친다라는 성격이 "내줌"의 "시간-공간"의 시간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기한 우리의 물음은 다음과 같이 보다 긴박하게 물어질 수 있게 된다. "탈자"의 단일함에 의해 열린 '탈자적-지평적 단일함'인 "시간성"의 시간 또는 "존재 사건"의 "내줌"에 의해 밝게 트인 "시간-공간"의 시간과 동일하게 존재가 내어지는 지평이자 인간이 그의 본질을 얻는 곳으로 사유된 "내어나름"의 "사이에"'는, 하이데거가 사유의 길에서 그때마다 다르게 불렀던 시간의 다른 이름이며 "내어나름"은 "탈자", "내줌"과 함께 시간의 본질인가? 그리하여 "내어나름"은 시간의 고유함으로서 그리로부터 내어지는 존재와 함께 "존재 사건"에-그것의 고유한 방식과 지평으로서-속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확정적인 대답을 피한 채로 이를 여전히 물음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탈자"의 "시간성"과 "내줌"의 "시간-공간"에 대해 말해진 규정이 "내어나름"의 "사이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내어나름"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의 고유함이다라는 방식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음의 사태 부합적인 해명을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사유의 길에서 동일하게 물어진 하나의 물음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그 동일함 속에서 변화를 동시에 그 상이함 속에서 견지되는 동일함을 놓지 않고 파악하는 철저함 속에서, 숙고하는 사유가 아직도 필요하다 :
"들어서서 오름이 길이라고 불린다면, 이 '길'에서는 언제나 '존재(Seyn)의 의미'에 대한 동일한 물음이, 오직 그 물음만이 물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길에 들어서 있기에] 물음이 서 있는 위치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모든 본질적인 물음은, 그때마다 보다 근원적으로 물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 이전의 것에 이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전-이후의 관계란 더욱이 있을 수 없다. …… '변화'란 본질적이어서, 하나의 물음이 그때그때마다 그 물음의 위치로부터 철저하게 물어질 때만이 비로소 그 폭이 규정될 수 있다(BzP, 84 / 85).
우리는 그러한 사유에 우리의 물음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형이상학의 시기에 존재의 역사는 시간의 사유되지 않은 본질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고 있다"(WiM, 18)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며,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말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귀기울인다. "오히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그것의 본질의 앞선 장소인 내어나름에서 토의함으로써 존재의 역운을, 시원에서부터 그 완료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기조차 하다"(ID, 59 / 60).
참고 문헌
Sein und Zeit(약호 SZ), T bingen 1972.
Die Grundprobleme der Ph nomenologie(GP), 전집 제24권, Frankfurt a. M. 1975.
Was ist Metaphysik?(WiM), Frankfurt a. M. 1965.
Vom Wesen des Grundes(WG). Frankfurt a. M. 1965.
Einf hrung in die Metaphysik(EM), 전집 제40권, Frankfurt a. M. 1983.
Beitr ge zur Philosophie(BzP), 전집 제65권, Frankfurt a. M. 1989.
목차
1. 머리말
2. 차이와 시간성
3. 차이와 내어나름
4. 존재 사건과 내어나름
5. 존재 사건에 속하는 시간-공간과 내어나름
6. 맺음말
추천자료
 현대의 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에 관한 하이데거의 사상
현대의 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에 관한 하이데거의 사상 언어의 이해(언어와 실재, 존재와 언어, 시성와 문법성, 시 작품 속 언어 분석)
언어의 이해(언어와 실재, 존재와 언어, 시성와 문법성, 시 작품 속 언어 분석) (영화와 철학과의 만남)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에 관한 철학적 사유
(영화와 철학과의 만남)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에 관한 철학적 사유 도덕적 사유의 기초로서 윤리의 두 유형
도덕적 사유의 기초로서 윤리의 두 유형 현대유럽철학
현대유럽철학 [환경윤리] 지구촌 환경위기 문제와 환경윤리학
[환경윤리] 지구촌 환경위기 문제와 환경윤리학 현대 인간성의 위기 또는 문명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현대 인간성의 위기 또는 문명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과연 정의의 전쟁, 성스러운 전쟁은 존재하는가 - 애니메이션『반딧불의 묘』를 보고
과연 정의의 전쟁, 성스러운 전쟁은 존재하는가 - 애니메이션『반딧불의 묘』를 보고 과학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하여
과학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하여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헤겔(‘절대적 앎’ 개념에서 ‘순수 존재’로 이행한 철학자)
헤겔(‘절대적 앎’ 개념에서 ‘순수 존재’로 이행한 철학자) [도가사상]道(도)의 정의, 道(도)의 깨달음, 도가사상(노장사상)의 개념, 도가사상(노장사상)...
[도가사상]道(도)의 정의, 道(도)의 깨달음, 도가사상(노장사상)의 개념, 도가사상(노장사상)... 이장희 시 연구 (향수적 대상의 환상적 전환에 대한 고찰)
이장희 시 연구 (향수적 대상의 환상적 전환에 대한 고찰) [유토피아의 개념과 유토피아 관련 사상] 유토피아(Utopia)는 왜 존재할 수 없었나 - 유토피...
[유토피아의 개념과 유토피아 관련 사상] 유토피아(Utopia)는 왜 존재할 수 없었나 - 유토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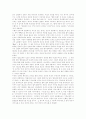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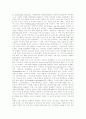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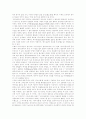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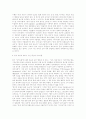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