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판결(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7.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 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판결(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7.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 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본문내용
같은 입장이나 私見으로는 丙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거 乙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결과,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부동산반환청구는 제213조 단서에 의거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만 이전 받지 못한 丙을 甲에 대비하여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應訴行爲와 時效의 中斷)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前訴訟에서의 應訴로 위 債權의 消滅時效가 中斷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제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1992.5.6.선고, 91가단3191판결)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의 시효중단항변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춘천지법 1992.9.25.선고, 92나2176판결)은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被告로서 應訴하여 그 訴訟에서 積極的으로 權利를 主張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해설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통상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안처럼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즉,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응소행위는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그 소송이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1.3.23.선고, 71다37판결; 대법원 1974.11.12.선고, 74다416,417판결; 1978.4.11.선고, 76다2476판결; 대법원 1979.6.12.선고, 79다573판결 등),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고 이후의 판결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應訴行爲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再審事由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7.11.11.선고, 96다28196판결). 應訴行爲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있으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이 판결에서 시효제도의 취지와 시효중단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당원 1979.7.10.선고 79다 569 판결참조)이다. 그리고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시효중단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이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학설도 대체로 같은 견해이다. 다만 응소를 통한 어느 정도의 권리주장에 대하여까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판결에서 분명하지 않다. 일부견해는 권리자가 應訴行爲로써 權利를 主張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송에서 權利者가 立證責任를 부담하는 要件事實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고가 응소하는 것이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소에 의한 권리주장에 경우에도 일단 판결로써 그 권리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실제로 소송물이나 구체적인 권리주장의 모습에 따라 명확한 규준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태도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적어도 本案에 대하여 應訴行爲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권에 관한 만족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집행문의 부여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의 제기와 동일한 경우를 명시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통설판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방법에 불과한 응소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應訴行爲와 時效의 中斷)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前訴訟에서의 應訴로 위 債權의 消滅時效가 中斷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제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1992.5.6.선고, 91가단3191판결)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의 시효중단항변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춘천지법 1992.9.25.선고, 92나2176판결)은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被告로서 應訴하여 그 訴訟에서 積極的으로 權利를 主張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해설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통상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안처럼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즉,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응소행위는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그 소송이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1.3.23.선고, 71다37판결; 대법원 1974.11.12.선고, 74다416,417판결; 1978.4.11.선고, 76다2476판결; 대법원 1979.6.12.선고, 79다573판결 등),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고 이후의 판결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應訴行爲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再審事由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7.11.11.선고, 96다28196판결). 應訴行爲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있으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이 판결에서 시효제도의 취지와 시효중단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당원 1979.7.10.선고 79다 569 판결참조)이다. 그리고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시효중단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이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학설도 대체로 같은 견해이다. 다만 응소를 통한 어느 정도의 권리주장에 대하여까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판결에서 분명하지 않다. 일부견해는 권리자가 應訴行爲로써 權利를 主張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송에서 權利者가 立證責任를 부담하는 要件事實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고가 응소하는 것이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소에 의한 권리주장에 경우에도 일단 판결로써 그 권리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실제로 소송물이나 구체적인 권리주장의 모습에 따라 명확한 규준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태도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적어도 本案에 대하여 應訴行爲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권에 관한 만족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집행문의 부여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의 제기와 동일한 경우를 명시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통설판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방법에 불과한 응소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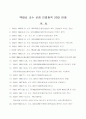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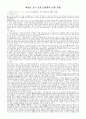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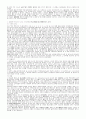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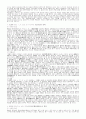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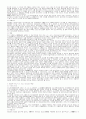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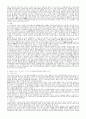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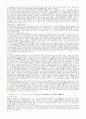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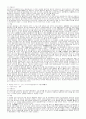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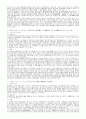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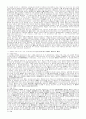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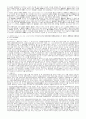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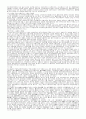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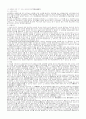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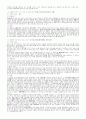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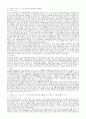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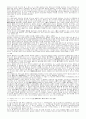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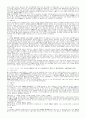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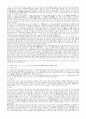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