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조선후기회화의동향
2진경산수화의등장
3.진경산수화란?
4.진경산수화와 인물
5. 진경산수화법
6.현대에서 바라보는 진경산수화
7.내가보는 진경산수화(결론)
2진경산수화의등장
3.진경산수화란?
4.진경산수화와 인물
5. 진경산수화법
6.현대에서 바라보는 진경산수화
7.내가보는 진경산수화(결론)
본문내용
은 기본적으로 겸재 (謙齋) 정선(鄭敾, 1676∼1759, 숙종2∼영조35)이라는 한 인물에 너무 초점을 맞춘 탓에 초래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풍수지리설을 도입 해 정선의 북악산 밑 청운동 탄생설 등을 신비화하고 논문 문체도 과거형이 아니라 소설처럼 현재형으로 써 학문적 엄격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최 실장의 오류라고 꼬집는다.
진경산수라는 용어는 1969년 고(故) 이동주 교수의 <겸재 일파의 진 경산수>(아세아)에서 나왔으나, 진경시대라는 용어는 최 실장이 1985 년 간송미술관에서 펴낸 학술지 〈간송문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간송학파라는 미술사학 연구집단으로부터 나온 진 경시대는 최근 들어 역사·국문학계, 언론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당 연한 용어처럼 쓰고 있다.
흔히 진경산수화는 중국풍의 그림을 답습하던 종래 화가들의 관념산 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천을 조선적·사실적으로 그린 조선의 산 수화를 뜻한다. 겸재가 창시해 1734년 <금강전도(金剛全圖)〉를 그려 완성했다. 이는 간송학파·안휘준·이태호·유홍준 교수를 비롯해 많 은 학자가 ‘진경산수는 중국베끼기에서 벗어난 조선 고유의 주체적 그림’임을 동의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영남대 미술사학과 유홍준 교수는 “진경산수의 사회적 배경은 조선 후기 숙종·영조 연간에 일어난 사회문화예술 전반의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며 “사상에서 실학의 대두, 문학에서 한글소설·판소리 등장과 사설시조의 유행, 그림에서 현실을 소재로 담은 속화(俗畵)의 탄생과 더불어 그 모두를 ‘리얼리즘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유 교수는 <화인열전>(2001년 3월 31 펴냄)에서 “진경 산수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되었다며 이 두 학 설은 모두 진경시대에 대한 적지 않은 과장과 오해를 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나는 최완수·유봉학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등을 비롯한 이른바 간송학파다. 또 하나는 진경산수는 명나라 때의 <황산도(黃山圖)〉 같은 사경산수(寫景山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홍선표, 한정희, 고연희 등 홍익대 출신 중견·신진 학자들 이다.
우선 유 교수는 간송학파가 겸재의 진경산수를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에서 완성된 조선성리학의 적통을 이어받은 우암(尤庵) 송시열을 영수로 한 노론(老論)의 정치적 이념이 구현된 산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화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다. 왜냐하면 우암 송시열 이래의 조선중화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 라,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하자 노론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율곡 학파가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효종과 더불어 북벌론을 주장한, 정확 히 말해서 숭명배청(崇明排淸)론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곡 이래 서인·노론의 문화적 계보가 진경산수를 낳았다는 간송학파의 입장은 너무 노론의 입장만 강조한 결과론적 추적이라는 것이 유 교 수의 입장이다.
또 유 교수는 “율곡의 조선성리학(이기일원론), 송강 정철의 한글가 사문학, 최립의 한국한문학, 석봉 한호의 조선고유서체 등 선조 시대 의 문화적 성숙기, 이른바 16세기 말 목릉성세(穆陵盛世)의 문화와 임진·병자 양란을 거쳐 100년 이상이 지난 영·정조 시대의 진경문 화를 하나의 단일한 문화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다” 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유 교수는 ‘진경시대는 없다’ ‘진경시대라는 용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라는 한국미술사학회 이성미 교수의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진경산수를 조선중화주의의 산물’로 바라보는 간송학 파의 견해와 확연히 갈라진다. 진경산수는 율곡학파가 추구한 조선 고유색의 결과라기보다 병자호란 이후 국제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생긴 새로운 문화적 자각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진경산수화 를 ‘조선의 자생미학’이라고 하고, 간송학파는 순도 백의 조선 것 이 아니라 명나라를 위시한 한족의 중국 것을 ‘새롭게 조선화’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홍익대 출신 학자들은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조선 성리학의 산 물이라는 견해에 강한 의문을 보내면서, 이와 반대로 겸재 역시 중국 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나 간송학파와 입장 을 달리하면서 진경시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성미 교수의 입장과 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하지만 유 교수는 “이러한 연구들은 겸재 의 진경산수를 동아시아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 하지만 우리는 왕왕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지 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한시대, 한 인간이 쏟은 예술적 노력과 성과 를 몰개성으로 몰아가는 과오를 범한다”며 홍익대 학파를 비판한다. 때문에 유 교수는 “진경산수는 이전의 명나라의 사경산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중국 남종화(南宗畵)의 예술적 성취를 받 아들임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족적 예술로 승화시킨 조선의 자생미 학’이라는 이동주·최순우·안휘준의 주장은 그대로 유효하다” 강 조한다.
작품분석·제작기법 연구에 치중한 국립박물관학파, 회화사를 문헌해 석으로 연구하는 최완수 실장의 간송학파, 민중정신과 리얼리즘을 중 시하는 유홍준 교수 등 민족예술총연합 산하 민족미술협의회학파, 홍 익대학파. 지금 미술계는 이들 중 한 학파만 불씨를 던지면 ‘진경시 대 오류논쟁’은 활화산처럼 타오를 분위기다. 물론 이성미·유홍준 교수의 비판에 대해 아직 간송박물관(한국민족미술연구소)측은 공개 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성의 맹아’라고 평가받는 진경시대를 둘러싼 논쟁은 21세기 한국의 최대논쟁 그 첫 번째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단지 누가 먼저 거푸집에서 칼을 뽑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7.내가보는 진경산수화(결론)
내 고장이 있습니다. 내 고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논쟁에서 말했듯이 진경산수화가 성리학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이번 리포트 조사결과 진경산수화에 화법이나 대상 그리고 인물들은 우리의 냄새가 배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경산수화가 우리 것 이 아니라면 우리 나라에 남은 우리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인왕산의 눈내린 모습 비온뒤의 모습을 실재로 본 나는 진경산수화만의 문화가 자랑할만한 우리문화라고 생각이듭니다.
진경산수라는 용어는 1969년 고(故) 이동주 교수의 <겸재 일파의 진 경산수>(아세아)에서 나왔으나, 진경시대라는 용어는 최 실장이 1985 년 간송미술관에서 펴낸 학술지 〈간송문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간송학파라는 미술사학 연구집단으로부터 나온 진 경시대는 최근 들어 역사·국문학계, 언론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당 연한 용어처럼 쓰고 있다.
흔히 진경산수화는 중국풍의 그림을 답습하던 종래 화가들의 관념산 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천을 조선적·사실적으로 그린 조선의 산 수화를 뜻한다. 겸재가 창시해 1734년 <금강전도(金剛全圖)〉를 그려 완성했다. 이는 간송학파·안휘준·이태호·유홍준 교수를 비롯해 많 은 학자가 ‘진경산수는 중국베끼기에서 벗어난 조선 고유의 주체적 그림’임을 동의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영남대 미술사학과 유홍준 교수는 “진경산수의 사회적 배경은 조선 후기 숙종·영조 연간에 일어난 사회문화예술 전반의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며 “사상에서 실학의 대두, 문학에서 한글소설·판소리 등장과 사설시조의 유행, 그림에서 현실을 소재로 담은 속화(俗畵)의 탄생과 더불어 그 모두를 ‘리얼리즘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유 교수는 <화인열전>(2001년 3월 31 펴냄)에서 “진경 산수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되었다며 이 두 학 설은 모두 진경시대에 대한 적지 않은 과장과 오해를 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나는 최완수·유봉학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등을 비롯한 이른바 간송학파다. 또 하나는 진경산수는 명나라 때의 <황산도(黃山圖)〉 같은 사경산수(寫景山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홍선표, 한정희, 고연희 등 홍익대 출신 중견·신진 학자들 이다.
우선 유 교수는 간송학파가 겸재의 진경산수를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에서 완성된 조선성리학의 적통을 이어받은 우암(尤庵) 송시열을 영수로 한 노론(老論)의 정치적 이념이 구현된 산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화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다. 왜냐하면 우암 송시열 이래의 조선중화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 라,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하자 노론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율곡 학파가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효종과 더불어 북벌론을 주장한, 정확 히 말해서 숭명배청(崇明排淸)론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곡 이래 서인·노론의 문화적 계보가 진경산수를 낳았다는 간송학파의 입장은 너무 노론의 입장만 강조한 결과론적 추적이라는 것이 유 교 수의 입장이다.
또 유 교수는 “율곡의 조선성리학(이기일원론), 송강 정철의 한글가 사문학, 최립의 한국한문학, 석봉 한호의 조선고유서체 등 선조 시대 의 문화적 성숙기, 이른바 16세기 말 목릉성세(穆陵盛世)의 문화와 임진·병자 양란을 거쳐 100년 이상이 지난 영·정조 시대의 진경문 화를 하나의 단일한 문화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다” 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유 교수는 ‘진경시대는 없다’ ‘진경시대라는 용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라는 한국미술사학회 이성미 교수의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진경산수를 조선중화주의의 산물’로 바라보는 간송학 파의 견해와 확연히 갈라진다. 진경산수는 율곡학파가 추구한 조선 고유색의 결과라기보다 병자호란 이후 국제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생긴 새로운 문화적 자각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진경산수화 를 ‘조선의 자생미학’이라고 하고, 간송학파는 순도 백의 조선 것 이 아니라 명나라를 위시한 한족의 중국 것을 ‘새롭게 조선화’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홍익대 출신 학자들은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조선 성리학의 산 물이라는 견해에 강한 의문을 보내면서, 이와 반대로 겸재 역시 중국 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나 간송학파와 입장 을 달리하면서 진경시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성미 교수의 입장과 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하지만 유 교수는 “이러한 연구들은 겸재 의 진경산수를 동아시아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 하지만 우리는 왕왕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지 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한시대, 한 인간이 쏟은 예술적 노력과 성과 를 몰개성으로 몰아가는 과오를 범한다”며 홍익대 학파를 비판한다. 때문에 유 교수는 “진경산수는 이전의 명나라의 사경산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중국 남종화(南宗畵)의 예술적 성취를 받 아들임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족적 예술로 승화시킨 조선의 자생미 학’이라는 이동주·최순우·안휘준의 주장은 그대로 유효하다” 강 조한다.
작품분석·제작기법 연구에 치중한 국립박물관학파, 회화사를 문헌해 석으로 연구하는 최완수 실장의 간송학파, 민중정신과 리얼리즘을 중 시하는 유홍준 교수 등 민족예술총연합 산하 민족미술협의회학파, 홍 익대학파. 지금 미술계는 이들 중 한 학파만 불씨를 던지면 ‘진경시 대 오류논쟁’은 활화산처럼 타오를 분위기다. 물론 이성미·유홍준 교수의 비판에 대해 아직 간송박물관(한국민족미술연구소)측은 공개 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성의 맹아’라고 평가받는 진경시대를 둘러싼 논쟁은 21세기 한국의 최대논쟁 그 첫 번째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단지 누가 먼저 거푸집에서 칼을 뽑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7.내가보는 진경산수화(결론)
내 고장이 있습니다. 내 고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논쟁에서 말했듯이 진경산수화가 성리학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이번 리포트 조사결과 진경산수화에 화법이나 대상 그리고 인물들은 우리의 냄새가 배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경산수화가 우리 것 이 아니라면 우리 나라에 남은 우리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인왕산의 눈내린 모습 비온뒤의 모습을 실재로 본 나는 진경산수화만의 문화가 자랑할만한 우리문화라고 생각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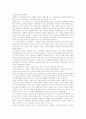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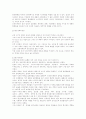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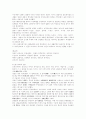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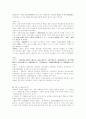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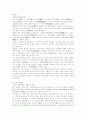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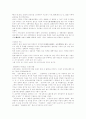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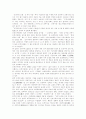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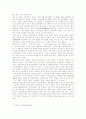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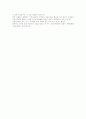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