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18세기의 조선회화.
1. 산수화(山水畵) - 정선(鄭歚) ․ 심사정(沈師正)
2. 풍속화(風俗畵) - 김홍도(김홍도) ․ 신윤복(申潤福)
3. 그 외의 화가들 - 강세황(姜世晃) ․ 김득신 ․ 김두량 ․ 이인문 등
Ⅲ. 감상 및 결론
Ⅱ. 18세기의 조선회화.
1. 산수화(山水畵) - 정선(鄭歚) ․ 심사정(沈師正)
2. 풍속화(風俗畵) - 김홍도(김홍도) ․ 신윤복(申潤福)
3. 그 외의 화가들 - 강세황(姜世晃) ․ 김득신 ․ 김두량 ․ 이인문 등
Ⅲ. 감상 및 결론
본문내용
던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당시의 화풍을 이해하고자 했다.
예술과 풍류를 즐기는 당시 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멋은 바로 시(詩) 서(書) 화(畵) 세 가지였다. 이 중에도 이 모두에 능한 사람을 시서화 삼절(三絶)이라고 하는데 강세황(姜世晃)은 그중에도 대표적인 삼절의 한 사람이다. 강세황은 격조 있는 남종화를 그려 후에 심홍도 심사정 김윤겸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만 남종화의 모방이 아닌 여백이 많고 여유로우며 깔끔한 그림을 그려 조선적인 남종화를 성립시키게 된다. 그는 나이가 들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사신일행에 동행하여 건륭제(乾隆帝)에게 그 솜씨를 인정받기도 했고 나이가 들면서 사군자(四君子)와 같은 작품들은 더욱 품격이 높아지기도 했다. 강세황 이후에 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남종화가 유행되었고 연구되었다.
김득신은 김홍도의 뒤를 이은 가장 뛰어난 풍속화가라는 평을 받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의 화가이다. 그는 김홍도와는 달리 그림과 배경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배경을 그림의 구성요소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서양의 근대 미술가들이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과 같이 배경과 인물을 완벽히 조화시켜 풍속화의 실체감을 증폭 시켰다. 김득신의 그림에서 배경과 인물은 처음부터 하나였고 그에게는 배경과 인물이 분리될 수 없는 요소였다.
이인문(李寅文)은 김홍도와 동갑인 화원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독창적인 면에서는 김홍도에 다소 떨어지지만 기량이나 격조 면에서는 쌍벽을 이루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원이다. 그는 당시의 주된 회화적 흐름이던 진경산수나 풍속화보다는 전통적인 소재, 그중에도 특히 송림(松林)을 즐겨 그려 이 방면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나무와 풍경의 묘사에 있어서 남종화와 북종화의 화법을 혼합하여 특유의 화풍을 이룩하였다.60세 이전의 그림들은 비교적 섬세한 필치로 단단하고 각이 진 모습의 선묘적 경향(線描的傾向)과 깔끔하고 청정한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묘사적이기보다는 강하고 대담한 발묵(潑墨) 발묵법(潑墨法) - 글씨나 그림에서 먹물이 번져 퍼지게 하는 것
위주의 표현적인 붓질로 한층 세련되고 격식을 초탈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김응환(金應煥)은 정선의 화풍을 이어받은 조선 후기 정선파의 대표적 화가 중의 한 사람으로 진경산수의 발전 및 남종산수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남종화법의 산수와 진경산수에 모두 능했는데 진경산수 작품은 대부분 금강산을 그린 것이다. 초기에는 정선의 영향으로 진경산수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이후 정선의 화풍을 토대로 하여 꽉 채운 구도라든가 갈필의 터치 그리고 부드러운 먹의 농담(濃淡) 변화와 담채(淡彩)의 효율적인 사용 등으로 독특한 화면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남종산수에서는 화보와 심사정(沈師正)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미법산수(米法山水) 계통의 발묵법을 애용하여 짙고 흐린 대비 효과와 미묘하게 변하는 먹빛의 변화를 살리는 화법을 구사한 화가였다.
김두량(金斗樑)은 화원시절 윤두서(尹斗緖)의 제자였으며, 도화서별제(圖畵署別提) 도화서별제(圖畵署別制) - 도화서를 관장하는 2인의 실직(實職)관리 명칭
를 지냈다. 전통적인 북종화법을 따르면서도 청으로부터 유입된 서양의 화풍을 수용하여 동물을 소제로 한 작품들 속에서 입체적인 음영법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한 개성적 화가였다. 특히 인상적인 개의 표정으로 유명한 김두량의 《맹견도》는 이러한 화법을 대표하는 그림인데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이번에는 전시되지 않아 볼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답사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풍속화가 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석화 산수화 등에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김홍도의 도석화(道釋畵)와 산수화를 추가로 다루었다. 김홍도는 강세황을 비롯한 문인들과 지속적으로 교유하며 문인의 교양과 취향을 두루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홍도는 화원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종화풍의 작품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진경산수를 구사하면서도 남종화풍의 영향이 드러나고, 도석화에서는 특유의 굵기 변화가 많고 생동감 넘치는 필선이 인상적인 작품을 구사하였다. 특히 붓이 시작되거나 꺾이는 부분에 힘을 주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Ⅲ. 감상 및 결론.
유교문화 속에서 18세기만큼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흐름이 생겨난 시기는 없을 것이다. 경제의 발달과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금강산과 같은 조선의 산천을 유람하는 분위기 등을 진경산수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명의 멸망 이후 소중화라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의 것이 아닌 조선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서민들의 의식 경제력 성장과 어우러져 일반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풍속화도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중앙 박물관의 회화들 중에서 18세기의 산수화 풍속화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 나타난 회화적인 특징을 잡아 내보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18세기 회화의 경향을 잡아내려면 보다 깊은 시대적 이해 뿐 만 아니라 18세기의 회화만이 아닌 조선 전체의 회화적 특징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중앙 박물관에는 자주 다녔지만 이렇게 한 시대의 특정 부분을 보려고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분기마다 전시하는 유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진경산수나 18세기의 영모화 산수화는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풍속화의 도첩들은 눈에 띌만한 작품들이 전시되지 않아 굉장히 아쉬웠다. 화첩들도 일부만 전시하거나 화첩 중 한 면만 전시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된다면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 자주 박물관을 찾는 의미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답사지 : 국립 중앙 박물관.
《참고문헌》
한용숙. 『한국미술사 이야기』 서울 : 예경, 1999.
박우찬. 『한국미술사 속에는 한국미술이 있다』 서울 : 재원, 2000.
김원용, 안휘준. 『新版韓國美術史』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2003.
예술과 풍류를 즐기는 당시 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멋은 바로 시(詩) 서(書) 화(畵) 세 가지였다. 이 중에도 이 모두에 능한 사람을 시서화 삼절(三絶)이라고 하는데 강세황(姜世晃)은 그중에도 대표적인 삼절의 한 사람이다. 강세황은 격조 있는 남종화를 그려 후에 심홍도 심사정 김윤겸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만 남종화의 모방이 아닌 여백이 많고 여유로우며 깔끔한 그림을 그려 조선적인 남종화를 성립시키게 된다. 그는 나이가 들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사신일행에 동행하여 건륭제(乾隆帝)에게 그 솜씨를 인정받기도 했고 나이가 들면서 사군자(四君子)와 같은 작품들은 더욱 품격이 높아지기도 했다. 강세황 이후에 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남종화가 유행되었고 연구되었다.
김득신은 김홍도의 뒤를 이은 가장 뛰어난 풍속화가라는 평을 받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의 화가이다. 그는 김홍도와는 달리 그림과 배경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배경을 그림의 구성요소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서양의 근대 미술가들이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과 같이 배경과 인물을 완벽히 조화시켜 풍속화의 실체감을 증폭 시켰다. 김득신의 그림에서 배경과 인물은 처음부터 하나였고 그에게는 배경과 인물이 분리될 수 없는 요소였다.
이인문(李寅文)은 김홍도와 동갑인 화원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독창적인 면에서는 김홍도에 다소 떨어지지만 기량이나 격조 면에서는 쌍벽을 이루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원이다. 그는 당시의 주된 회화적 흐름이던 진경산수나 풍속화보다는 전통적인 소재, 그중에도 특히 송림(松林)을 즐겨 그려 이 방면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나무와 풍경의 묘사에 있어서 남종화와 북종화의 화법을 혼합하여 특유의 화풍을 이룩하였다.60세 이전의 그림들은 비교적 섬세한 필치로 단단하고 각이 진 모습의 선묘적 경향(線描的傾向)과 깔끔하고 청정한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묘사적이기보다는 강하고 대담한 발묵(潑墨) 발묵법(潑墨法) - 글씨나 그림에서 먹물이 번져 퍼지게 하는 것
위주의 표현적인 붓질로 한층 세련되고 격식을 초탈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김응환(金應煥)은 정선의 화풍을 이어받은 조선 후기 정선파의 대표적 화가 중의 한 사람으로 진경산수의 발전 및 남종산수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남종화법의 산수와 진경산수에 모두 능했는데 진경산수 작품은 대부분 금강산을 그린 것이다. 초기에는 정선의 영향으로 진경산수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이후 정선의 화풍을 토대로 하여 꽉 채운 구도라든가 갈필의 터치 그리고 부드러운 먹의 농담(濃淡) 변화와 담채(淡彩)의 효율적인 사용 등으로 독특한 화면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남종산수에서는 화보와 심사정(沈師正)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미법산수(米法山水) 계통의 발묵법을 애용하여 짙고 흐린 대비 효과와 미묘하게 변하는 먹빛의 변화를 살리는 화법을 구사한 화가였다.
김두량(金斗樑)은 화원시절 윤두서(尹斗緖)의 제자였으며, 도화서별제(圖畵署別提) 도화서별제(圖畵署別制) - 도화서를 관장하는 2인의 실직(實職)관리 명칭
를 지냈다. 전통적인 북종화법을 따르면서도 청으로부터 유입된 서양의 화풍을 수용하여 동물을 소제로 한 작품들 속에서 입체적인 음영법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한 개성적 화가였다. 특히 인상적인 개의 표정으로 유명한 김두량의 《맹견도》는 이러한 화법을 대표하는 그림인데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이번에는 전시되지 않아 볼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답사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풍속화가 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석화 산수화 등에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김홍도의 도석화(道釋畵)와 산수화를 추가로 다루었다. 김홍도는 강세황을 비롯한 문인들과 지속적으로 교유하며 문인의 교양과 취향을 두루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홍도는 화원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종화풍의 작품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진경산수를 구사하면서도 남종화풍의 영향이 드러나고, 도석화에서는 특유의 굵기 변화가 많고 생동감 넘치는 필선이 인상적인 작품을 구사하였다. 특히 붓이 시작되거나 꺾이는 부분에 힘을 주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Ⅲ. 감상 및 결론.
유교문화 속에서 18세기만큼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흐름이 생겨난 시기는 없을 것이다. 경제의 발달과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금강산과 같은 조선의 산천을 유람하는 분위기 등을 진경산수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명의 멸망 이후 소중화라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의 것이 아닌 조선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서민들의 의식 경제력 성장과 어우러져 일반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풍속화도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중앙 박물관의 회화들 중에서 18세기의 산수화 풍속화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 나타난 회화적인 특징을 잡아 내보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18세기 회화의 경향을 잡아내려면 보다 깊은 시대적 이해 뿐 만 아니라 18세기의 회화만이 아닌 조선 전체의 회화적 특징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중앙 박물관에는 자주 다녔지만 이렇게 한 시대의 특정 부분을 보려고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분기마다 전시하는 유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진경산수나 18세기의 영모화 산수화는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풍속화의 도첩들은 눈에 띌만한 작품들이 전시되지 않아 굉장히 아쉬웠다. 화첩들도 일부만 전시하거나 화첩 중 한 면만 전시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된다면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 자주 박물관을 찾는 의미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답사지 : 국립 중앙 박물관.
《참고문헌》
한용숙. 『한국미술사 이야기』 서울 : 예경, 1999.
박우찬. 『한국미술사 속에는 한국미술이 있다』 서울 : 재원, 2000.
김원용, 안휘준. 『新版韓國美術史』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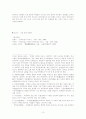









소개글